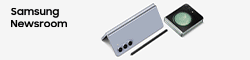하지만 은행들도 책임론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수년간 수천억 원대의 대출 사기를 당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출 심사 과정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
이번 사건은 KT의 자회사인 KT ENS의 김 모 부장이 협력업체들과 짜고 벌인 조직적인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다. KT ENS에 휴대폰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이 외상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수년간 돈을 빌렸다.
외상 매출채권은 어음의 일종이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더 빨리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01년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대기업이 어음 대신 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주면 중소기업이 이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대출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기업이 갚게 된다.
이번 대출 사기는 실제론 있지도 않은 매출채권을 위조해 대출을 받은 만큼 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금감원은 7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외상 매출채권 담보대출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 수천억대 대출사기 어떻게 가능했나
수천억 원대의 대형 대출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기업인 KT 자회사의 매출채권인데다,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갚아왔기 때문이다. 거래 당사자들이 공모해 인감도장 등을 도용하고, 서류를 위조하다 보니 은행들도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외상 매출채권을 쉽게 유동화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도 한몫했다. 납품업체 3~4곳이 공동으로 9개에 이르는 SPC를 만들어 대출을 받다 보니 은행들은 회사 규모나 매출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은행들은 SPC 앞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매출 서류만 증빙되면 바로 대출을 실행했다. 구체적인 확인 절차없이 서류만 보고 수천억 원의 대출이 이뤄진 셈이다.
KT ENS는 해당 매출채권을 발행한 적도,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는 만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부 직원이 납품업체들과 공모해 대출사기극을 벌인 만큼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인 인감 위조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은행 여신심사시스템에도 큰 구멍
은행 여신심사시스템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해당 은행들은 KT ENS가 대기업 자회사이고, 서류를 모두 구비했다는 사실만 보고 대출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KT ENS에 한 번이라도 직접 거래 여부를 확인했다면 사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상시감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현장 확인이 어렵고, 매출채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긴 어렵더라도 비정상 대출인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다면 수년간 수천억 원대의 대출사기극을 전혀 모르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KT ENS는 2012년부터 별정통신사업자에서 네트워크 구축회사로 변신했지만, 은행들은 아무런 의심없이 휴대폰 매출채권을 담보로 수천억 원씩 대출을 집행했다. KT ENS 협력업체들의 자산과 대출 규모만 비교했어도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기업을 맹신하고, 기본을 무시한 대출 관행이 이번 대출 사기의 중요한 원인이란 얘기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장은 “KT ENS와 협력업체들의 자산과 매출 규모 등을 볼 때 수천억 원대 대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이상대출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