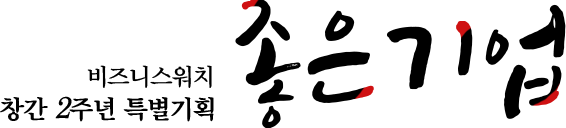비즈니스워치 창간2주년 특별기획
<좋은기업> [확 풀자!] 유통부문
"유통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어야"

동네 소점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0년대 대형마트 진입을 막았던 프랑스·영국·스페인·포르투갈 등 선진 유럽 국가들. 이들은 최근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돌아서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유통업계의 효율적인 자원 분배와 고용을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도심 진입을 막으면서 경제성장 둔화, 고용비용 증가 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현실적으로 대형유통업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국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진통을 겪으면서도 '대형마트의 확산'이라는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처방보다 자영소매점·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유럽 "과도한 규제 바꾼다"
대형마트 규제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유럽은 최근 달라지고 있다. 프랑스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최근 일요일 영업에 대한 규제 방침을 완화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는 1973년 대규모 점포의 발을 묶기 위해 르와이에 법(loi Royer)을 도입했다. 점포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매장면적이 1500㎡ 이상인 소매업점포를 세우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1996년엔 법을 한층 더 강화했다. 허가대상 면적을 300㎡이상으로 고친 라파린법(Raffarin Law)이다. 이로인해 이듬해인 1997년 대형마트 수는 8963개에서 전년에 비해 1683개 줄었다.
 | |
|
10년 후 프랑스는 대형마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프랑스 경제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를 지적하면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1000㎡ 이하 모든 점포는 허가 없이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일요일에도 매장 문을 여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놨다.
1996년 프랑스를 뒤따라 대형 소매업체의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한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스페인에서는 대형마트의 진입을 제한해 고용창출이 악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탈리아 에이나우디 경제금융연구소(Einaudi Institute for Economics and Finance)의 파비아노 쉬바르디(Fabiano Schivardi) 연구원은 "규제 이후 기존 소매점들이 마진을 높이는 바람에 상품가격이 올랐다"며 "반면 유통업계의 생산성, 정보기술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고용 비용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 |
|
◇하버드 "득보다 실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과 자영소매점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소상점과 대형유통업체 모두 득 보다는 실이 크다는 분석이다.
1996년 도심 대형마트에 규제를 도입한 영국이 대표적 사례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도심에 대형마트를 들이지 못하자 소규모 점포를 만들어 도심 구석구석으로 파고 들었다. 테스코는 도심 모퉁이에 평균면적 195㎡인 테스코 익스프레스(Tesco Express)를 세웠다.
라파엘라 새던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조교수는 "규제를 만든 정부 관료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어떻게든 규제를 뚫고 도심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치 못했다"며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지만 업체들은 결국 이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농협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등은 대형소매점의 출점을 규제하는 유통법의 허점을 피해 점포 수를 늘렸다.
대형유통업체의 성장은 이미 시대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형마트가 유통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재래식 소매업이 쇠퇴하는 현상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자영소매점의 시장 점유율이 축소하고 전통시장이 쇠퇴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분석이다.
◇"규제 대신 육성 필요"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식료품점인 '프레시 마켓'의 내부 모습. (출처: 프레시 마켓 홈페이지 캡쳐) |
이에 따라 실효성도 없는 규제로 유통업계 전체를 옭아매기 보다는 적극적인 육성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용상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는 "대형마트가 일요일에 영업하지 못하도록 해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려 가 물건을 사는 건 아니다"라며 "월 2회 마트에 휴무를 시키는 규제로 인해 유통시장의 전체 파이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소상인들의 생존권과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에서 쇼핑할 선택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대형마트로부터 자영소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이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식료품점인 '프레시 마켓'(The Fresh Market)은 소점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프레시 마켓은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등과 함께 유럽 전통시장의 풍경을 재현했다. 특히 조리식품 판매에 주력하며 손님들 앞에서 요리하기 등의 이벤트를 펼쳤다. 이로써 고객을 끌어 들여 점포 체인을 100여개로 늘릴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민해야할 대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기개발연구원 측은 "중소 상인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규제하기 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점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을 하는 만큼, 소상인들 역시 정부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