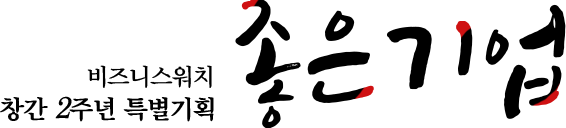비즈니스워치 창간2주년 특별기획
<좋은기업> [확 풀자!] 방송통신부문
표심·힘쌘사업자 따라 정책 오락가락
"정부가 ICT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 독려와 가계통신비 인하가 핵심인 듯 합니다"
정부 규제정책을 바라본 통신업계 한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와 국회가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는 투자 활성화와 통신비 절감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는 매출과 이익 감소요인이다. 매출과 이익이 줄면 중장기적으로 투자 동력이 떨어지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통신비를 낮추되,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까 궁리하게 된다. 결국 산업 경쟁이 약화되고, 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

| ▲ KT가 세계 최초로 4세대(4G) 와이브로 전국망 서비스에 나선 가운데 2011년 3월2일 모델들이 와이브로로 사용 가능한 갤럭시탭 와이브로와 스마트폰을 시연했다. KT는 기존 서울 및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이어 전국 82개 모든 시단위 지역과 경부·중부·호남·영동·서해안·남해·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등에 와이브로 4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했다. |
과거 와이브로(wibro) 투자정책이 대표적이다. 3G에서 4G로 이동통신 기술이 넘어설 무렵, 정부는 우리나라가 기술을 주도한 와이브로 사업을 적극 밀었다. 당시 사업자들은 탐탁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대세는 LTE 였기 때문이다. 글로벌 다수 사업자가 채용하는 기술을 따라가야 장비가격이 싸고 운영효율도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권유에 못이겨 KT와 SK텔레콤이 와이브로 투자에 들어갔다. 업계 일각에선 와이브로 투자비용은 일종의 '규제비용'이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정부 뜻에 어긋났다간 다른 분야에서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 차라리 와이브로에 투자하자는 뜻이다. 결국 와이브로 국내 가입자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LTE 보급이 확산되면서 감소세는 더욱 심해져, 국내 이통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했다.
업계 관계자는 "초반 국내용 와이브로와 해외용 와이브로는 같은 기술이었지만 사용주파수와 대역폭이 달라 로밍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정책실수가 있었다"면서 "와이브로 사업에 KT는 1조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적자를 냈고, SK텔레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표심 따르는 통신정책
가계통신비 인하는 선거철만 되면 빠지지 않는 공약사항이다. 지금까지는 규제기관이 기업들 `팔 비틀어` 조금씩 인하했던 게 현실이다. 그 와중에 나왔던 제4 이동통신사 논의는 또 하나의 사례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껏 6차례나 제4 이통사 신청을 받았다. 그때마다 내세웠던 논리가 가계통신비 인하 목표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도 허가하지 않았다. 신청사업자의 자격요건 미달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만약 제4 이통사 선정의 주요 정책목표에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가 우선 순위였다면 어땠을까. 거꾸로 이동통신 사업자 수를 3개가 아닌 4개로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산업측면의 정책철학이 확고했다면, 자격요건이 부족한 사업자만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경쟁활성화를 위해 제4 이통사에 대한 확고한 지원책을 냈을 것이고, 그러면 자금력 있는 경쟁사가 시장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란 설명이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었을 것이다.

| ▲ 제4이동통신사업 진출 희망자였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의 공종렬 대표가 지난해 2월 본심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MI는 제4이통사업자를 여섯번이나 신청했지만 매번 탈락했다. |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제4 이통사 정책을 보면, 정부는 책임지지 않을테니 한번 해볼 사람은 손들어봐란 식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조차 확고한 의지가 없는데 어느 사업자가 수 조원씩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제4 이통사 참여후보자로 관측된 A기업 관계자도 "우리는 절대 제4 이통사 1대주주로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서 "최소한 3조원 이상의 초기비용이 들고, 기존 이통3사와 경쟁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추가자금이 필요한데 확실한 사업전망 없이 뛰어드는 것은 바보 짓이다"고 밝혔다.
◇방송정책은 더 갈팡질팡
역대 정권을 살펴보면 매 시기마다 뉴 미디어가 탄생했다. 김영삼 정부는 케이블TV를, 김대중 정부는 위성방송을, 노무현 정부는 디지털미디어방송(DMB)을, 이명박 정부는 IPTV를 도입했다.
문제는 뉴 미디어 도입때 마다 새로운 미디어 대세론이 득세했고, 뉴 미디어 도입에 따른 신구 미디어간 법·제도가 균형있게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황금알을 낳을 것만 같았던 DMB는 누적적자가 심각해 사업을 접어야 할 판국이다. 또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 되면서 케이블TV·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간 생존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 와중에 케이블TV와 IPTV 규제가 제각각 이어서 업계간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다. 법제도가 산업발전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년전 부터는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지상파에게만 유리한 혜택을 주느니, 종편에게만 유리한 혜택을 주느니 하며 방송규제를 둘러싼 힘겨루기도 빈번해졌다. 방송정책에서는 시청자 권익보다 사업자 입장이 반영된 `정책 배려`를 우선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