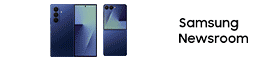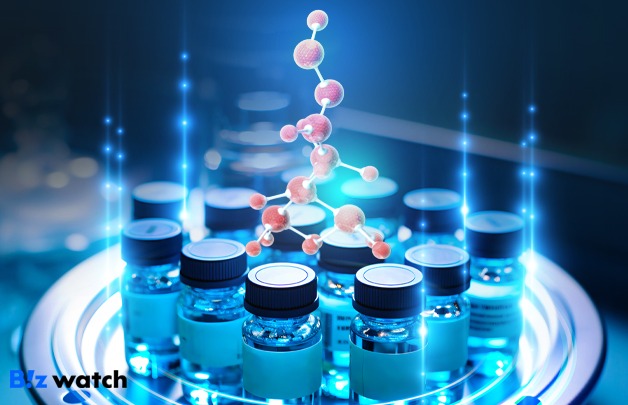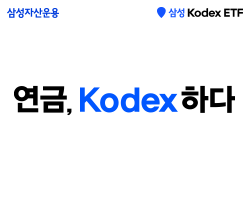중국에 기술이전한 후보물질이 내년 리가켐바이오의 첫 상업화 물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20개 프로젝트의 임상 진입을 목표로 공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술이전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
리가켐바이오 사이언스 김용주 대표이사가 1일 콘래드서울 호텔에서 '글로벌 R&D데이 2025'를 개최하고 신약 연구개발 현황과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력 등에 대해 소개하며 이같은 목표를 밝혔다. ADC는 암 세포를 찾는 항체와 암 세포를 공격하는 약물을 결합해 일명 '유도미사일'로 불리는 항암제 기술이다.
LCB14, 中서 2026년 최초 상업화 파이프라인 기대
이날 리가켐바이오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ADC 항암제 'LCB14(중국 FS-1502/ 영국 IKS014)'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LCB14는 HER2(인간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2)를 타깃으로 세포독성약물(MMAF)을 접합한 ADC로 개발 중이다.
HER2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단백질로 유방암·췌장암 등에서 생성되며 암세포 증식을 일으킨다. MMAF는 HER2 단백질이 과도하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인지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방식이다.
LCB14(포순 물질명: FS-1502)는 2023년 중국 '포순'사에 중국 권리에 한해 기술이전됐다. 포순사는 LCB14를 로슈의 기존 유방암 치료제인 캐싸일라와 비교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형암에 대한 임상2상도 진행 중이다.
또 LCB14(익수다 물질명: IKS014)는 영국의 ADC 전문기업 익수다테라퓨틱스에 2021년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권리를 기술이전했으며 현재 글로벌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익수다가 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LCB14의 글로벌 임상1상 시험계획 확대 승인을 받으면서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등 지역으로 임상 지역이 확장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LCB14는 2025년 중국 신약 승인 신청 후 2026년 상업화가 기대되는 첫번째 출시 가능성이 유력한 ADC 파이프라인"이라며 "초기 임상결과에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난소암, 담낭암, 식도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도 반응을 보여 개발 확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3자 기술이전 수익 및 추가 기술료 수령 등 기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인 LCB71은 에이비엘바이오의 ROR1 항체에 리가켐바이오의 ADC 기술력이 결합한 후보물질로 두 회사가 공동개발 중이다.
ROR1 항체는 고형암부터 혈액암까지 다양한 암종에서 과발현돼 다양한 암종을 타깃할 수 있는 표적 물질이다. 암종 개발 범위가 넓어 ROR1 항체를 표적으로 한 ADC 개발에 대한 대형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도 높다.
LCB71는 지난 2020년 중국 시스톤(CStone)에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기술이전해 1b상 연구가 진행 중이며 시스톤은 LCB71(시스톤 물질명: CS5001)의 제3자 기술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LCB84도 리가켐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 하나다. LCB84는 레고켐바이오의 ADC플랫폼 기술과 메디테라니아로부터 기술도입한 Trop2 항체를 타깃으로 한 ADC 후보물질이다. Trop2 항체는 상피조직 암에서 과발현돼 종양 증식과 전이를 유발한다.
LCB84은 지난 2023년 12월 존슨앤드존슨(J&J)에 약 2.2조원 규모로 기술이전됐다. 현재 리가켐바이오가 주도해 J&J와 글로벌 임상1/2상 공동개발을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LCB71의 경우 제3자 기술이전에 성공하면 시스톤과 수익을 공유해 리가켐바이오에도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라면서 "내년 초 LCB84의 임상1상 데이터 발표 결과에 따라 J&J가 단독 임상개발을 위한 옵션 행사시 추가적으로 기술료 약 2600억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기술이전 통해 신약 R&D 선순환 구조 만들 것"
리가켐바이오는 앞서 언급한 파이프라인 외에도 다수 후보물질의 글로벌 기술이전에 성공했다. 리가켐바이오의 전체 기술이전 규모는 공개된 계약 기준으로 약 9조6000억원에 달한다.

그동안 대부분 초기 연구단계에서 기술이전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ADC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통해 독자적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자체 개발과 글로벌 기술이전을 병행하는 구조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는 5건으로, 오는 2027년까지 추가로 15건의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격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기술이전 기회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자체 임상 임상 진행 보다는 글로벌 기술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향후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다.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고 있는 박세진 사장은 "기술이전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면 이는 R&D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규 기술이전을 통해 향후 자체 상업화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신약 R&D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