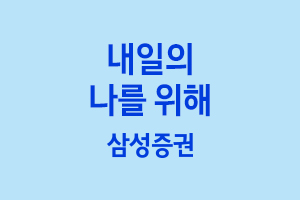리가켐바이오, 한미약품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주목받는 STING(인터페론 유전자 자극 단백질) 작용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STING 작용제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를 깨우는 STING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기존 면역항암제를 뛰어넘을 잠재력을 지녔지만 부작용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분야다. 여러 빅파마가 개발에 실패한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독자적인 전략으로 성과를 자신하고 있다.
STING에 꽂힌 제약사
리가켐바이오는 이달 25일 미국 시카고에서 개막한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에서 개발 중인 STING 작용제 'LCB39'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서 이 약물은 용량에 비례해 종양을 강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또 약물이 종양에 집중적으로 모이면서 경쟁약 대비 전신 독성위험을 낮춘 것을 확인했다.
한미약품은 같은 학회에서 개발 중인 mRNA(메신저리보핵산) 기반의 STING 치료제를 선보였다. 체내 STING 단백질을 직접 활성화하는 케미컬(저분자화합물) 약물인 리가켐바이오와 달리 한미약품의 치료제는 이미 활성화된 STING 단백질을 우리 몸속에 생성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이밖에 국내에서는 아주대학교 화학생물학 및 치료학 연구실, 국립암센터 등의 연구기관이 개발 중인 STING 작용제의 연구성과를 이번 학회에서 선보였다.
국내 제약사와 연구기관들이 STING 작용제 개발에 힘쓰는 이유는 STING 작용제가 기존 면역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STING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 암세포 등 비정상적인 DNA를 감지한다. STING 단백질은 이러한 비정상 신호를 인식하면 '인터페론' 분비를 촉진한다. 인터페론은 암세포 주변으로 T세포, NK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불러 모으는 일종의 사이렌(경고음) 역할을 한다.
STING은 기존 면역항암제와 비교해 선천 및 후천 면역세포를 모두 깨울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기존 항암제로 치료가 어려운 이른바 '차가운 종양(콜드튜머)'에서도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어 더욱 다양한 암종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제약사 차별점은
하지만 STING 작용제에 대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관심은 예전보다 줄어든 상태다. 여러 빅파마(거대 제약사)가 개발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하면서다. 가장 최근에는 화이자가 임상 1상 단계에서 개발 중인 STING 작용제 'PF-07820435'의 시험을 중단했다.
STING 작용제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STING 작용제가 종양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의 면역기능을 깨워 전신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종양에서 STING 단백질이 적게 발현돼 약효가 떨어지는 것이다.
리가켐바이오와 한미약품은 각각 암세포에 대한 약물의 표적성을 높이고, STING 단백질을 암세포 주변에 발현시키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리가켐바이오의 LCB39는 경쟁약물과 비교해 STING 단백질과의 결합력, 이로 인한 면역세포 활성도를 일부러 낮췄다. 대신 리가켐바이오는 종양세포 표적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이를 통해 LCB39는 전임상에서 강한 항암효과를 유지하면서 정상세포의 면역반응을 최소화해 전신 부작용을 완화한 결과를 보였다.
한미약품은 암세포 주변에 STING 단백질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STING이 저발현한 암종에 대응했다. 이러한 방법은 STING 발현이 적은 암종에 효과를 낼뿐만 아니라, 정상세포의 STING 단백질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아 전신 면역반응을 피해 갈 수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mRNA로 STING 단백질의 활성화한 형태를 체내 발현시켜 면역신호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전신면역반응을 피해가기 위해 효능을 유지하고 독성을 감소시킨 아날로그(물질)를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