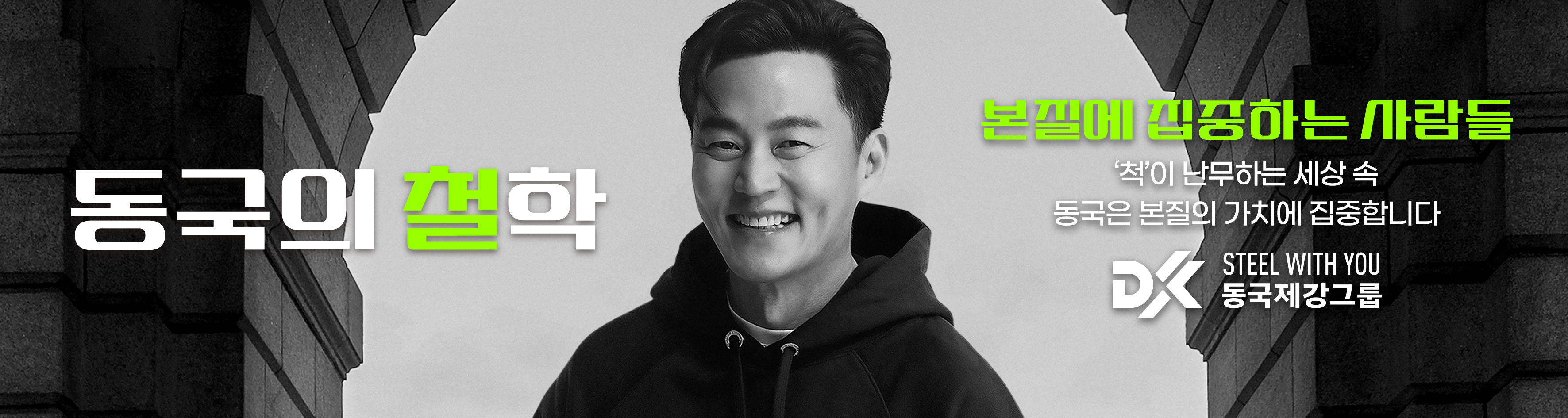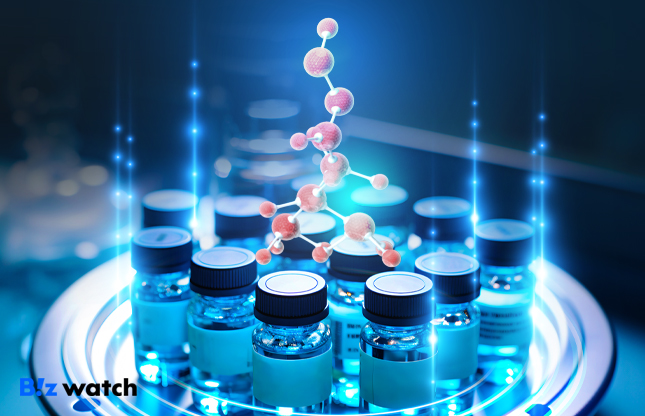
국내 항체약물접합체 개발기업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가 항체신약개발기업 와이바이오로직스와 손잡고 이른바 '면역관문억제 항체기반 약물접합체(PD-L1 ADC)' 개발에 나선다.
로슈의 티쎈트릭, 화이자의 바벤시오와 같은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성분인 PD-L1(programmed death-ligand 1) 항체를 활용한 ADC는 최근 화이자 등이 초기 임상연구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차세대 ADC 연구개발을 위해 와이바이오로직스의 PD-L1 항체를 도입하는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와이바이오로직스가 개발한 PD-L1 신규 항체의 글로벌 ADC 개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리가켐바이오가 확보하는 계약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리가켐바이오는 와이바이오로직스에 선급금과 단기 마일스톤, 개발 및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 그리고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두 회사는 전날(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으나 세부 계약 규모 및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PD-L1 항체, 면역항암·암세포 표적 기능 동시 수행
PD-L1 항체를 활용한 ADC는 면역항암 및 암세포 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차세대 ADC로 주목받는다.
PD-L1은 암세포 표면에 있는 단백질로, PD-L1과 면역세포(T세포)의 결합을 막아 우리 몸의 면역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항체는 면역관문억제제(면역항암제)로 허가받아 글로벌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특히 PD-L1은 다양한 암종에서 광범위하게 발현되지만 정상 조직에서는 발현율이 낮다는 점에서 PD-L1을 표적하는 항체는 ADC에 활용할 수 있다. 항체약물접합체(ADC)에서 항체는 암이나 특정 질환에서 비정상적으로 과발현하는 세포를 특이적으로 인식해 치료제가 효과적으로 표적세포로 이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다만 ADC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체가 표적 세포 안으로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를 의미하는 세포 내재화율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 PD-L1 항체는 암세포 내재화율이 현저히 낮아 약물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자체 보유한 인간 항체 발굴 플렛폼을 통해 PD-L1 신규 항체를 발굴했고 면역항암제로 이미 승인받은 PD-L1 항체보다 2배 이상 내재화율이 높음을 확인했다.
리가켐바이오-와이바이오, 면역항암 기능 차세대 ADC 개발
양사는 기술이전에 앞서 물질이전계약(MTA)을 맺고 와이바이오로직스가 발굴한 'PD-L1 신규 항체' 후보물질 중 리가켐바이오의 ADC 플랫폼 결합에 최적화된 항체를 발굴하는 상호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고형암에서 고발현되고, 면역체계 활성화에 직접 관여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한 PD-L1 신규 항체를 선택했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리가켐바이오는 PD-L1 항체를 활용한 신규 ADC 개발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특히 ADC의 다른 한축인 페이로드(항암물질)에는 차세대 면역항암제로 주목받는 STING(인터페론 유전자 자극 단백질) 작용제를 부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리가켐바이오는 지난달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한 미국암연구학회(AACR 2025)에서 개발 중인 STING 작용제 'LCB39'의 전임상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기술이전에 대해 박영우 와이바이오로직스 각자대표는 "'면역항암기전 신규 항체'를 글로벌 ADC 기업으로 도약한 리가켐바이오가 상용화 가능성을 평가하고, 기술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국내외 ADC 기업들과의 추가 기술이전 계약을 이어나가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PD-L1 항체 기반 ADC 개발은 현재 글로벌제약사인 화이자, 중국 헨리우스 바이오텍 등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화이자는 지난해 9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에서 PD-L1 ADC인 PF-0804605의 긍정적인 1상 중간결과를 공개해 주목받았다. PF-0804605는 두경부 편평세포암, 비소세포폐암, 식도암, 삼중음성유방암 등 진행성 고형암 환자 절반 이상의 종양 감소를 유도했으며, 용량을 높일수록 반응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신약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