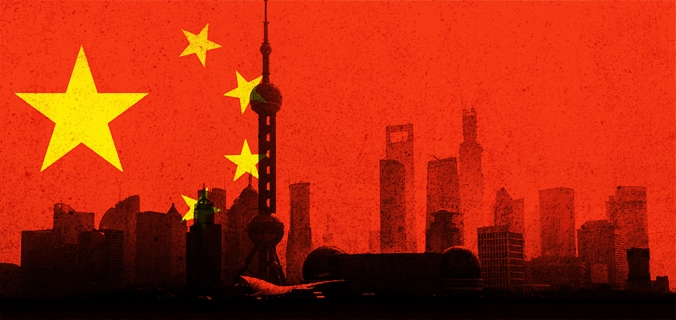
한국 경제는 과연 용(龍)의 등에 올라탄 것일까?
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하면서 국내 경제계에는 장밋빛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13억명 인구가 만들어내는 5000조원 내수시장의 빗장이 풀렸다는 게 기대감의 근거다. 최대 수출상대국인 중국과의 무역장벽이 단계적으로 사라지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의 발판을 추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 허브 국가로서의 메리트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일방에게만 유리한 자유무역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는 이유다. 우리도 중국에게 빗장을 풀어줘야 한다. 중국산 농산물과 저가 공산품이 쏟아져 들어와 시장을 장악하면 국내 관련산업은 설 자리가 없다. 제조업은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추격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중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한중 FTA에 숨은 중국의 노림수
FTA는 양날의 검이다. 잘못쓰면 베일 수 있다. 유의하고 경계할 대목은 또 있다. 중국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 정상들을 안방에 불러 모아놓고 한국과의 FTA 타결을 서둘러 선언한 것은 경제적 측면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13억 인구에 세계 2위 경제국, 한국은 인구 5천만에 경제규모는 세계 14위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GDP(1.3조 달러)는 중국(9.2조 달러)의 14%, 약 7분의 1에 불과하다. 중국이 5천만 한국시장에 농산물과 저가 공산품 팔아보겠다고 FTA를 서두른 게 아니라는 얘기다.
한중 FTA에는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노림수가 숨어있다. 아시아권 맹주로서 경제와 안보의 패권을 거머쥐고, 자기들의 질서를 구축해 '중화부흥(中華復興)'의 꿈을 이루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후진타오 시대 10년간 연평균 10.6%의 경이적 성장세를 기록한 중국은 프랑스,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을 차례로 제치고 G2의 반열에 올랐다.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황금의 10년'으로 불리는 후진타오 집권기간 동안 중국 경제규모는 1.4조 달러(2002년) 에서 7.3조 달러(2011년)로 커졌다. 앞에 놓인 건 이제 한 자리 뿐이다. 5세대 지도부 시진핑 정부의 과제이기도 하다. 중국은 미국과 대등한 경제동반자 입지를 구축함으로써 국제적 존재감을 높이려 한다. 덩치와 위상이 달라진 중국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접해 달라는 게 중국이 주장하는 '신형 대국관계' 론(論)이다. 이틀전 오바마-시진핑 비공식 회동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다.
중국이 미국과 함께 글로벌 패권을 양분하고, 더 나아가 G1의 지위까지 넘보려면 2차 대전후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국제 금융·통상 질서를 우선 바꿔놓아야 한다. 중국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진 틈을 노렸다. 미국을 선진국들이 금융위기로 휘청거리는 와중에 중국은 중심을 잡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금융과 자본시장에서는 '위안화 국제화'를 첨병으로 내세워 달러화 기축통화 체제에 도전장을 던졌다. 신흥경제국 브릭스(BRICS)와 연대하고, 아프리카 등 제3 세계를 끌어안으며 경제와 국제정치 영역 확장에도 적극 나서왔다.
이번 APEC 회의에서 중국이 한중 FTA 타결을 매듭짓고, FTAAP를 핵심의제로 테이블에 올린 것은 미국을 겨냥한 위력과시로 볼 수 있다. FTAAP는 아·태지역 전체를 묶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자는 것으로 중국이 적극 추진하는 초대형 경제블록이자 통상질서 재편 시도다.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더 큰 그림으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APEC에서 한국 껴안기를 과시하는 정치적 이벤트를 단행했다.
중국의 도발은 미국이 자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미국은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아시아 회귀, 이른바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전략을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중동 등지에 집중해 온 미국의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전략의 핵심은 일본과 한국 등 역내 동맹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된 그 이듬해에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손잡고 TPP 카드를 내놓으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해왔다.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연합전선으로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영토분쟁 쟁점화, 근린궁핍화 정책(아베노믹스) 같은 과감한 변화들을 시도했다. 미국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었다. 대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는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APEC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아베 일본총리를 대놓고 무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환대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정치적 제스쳐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들이 직접 처리한다'는 신안보 구상으로 맞서왔다. 미국은 아시아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중국의 태도는 '아시아판 먼로주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중국은 한편으로는 미국 동맹의 약한 고리를 파고 들었다. 한국은 외교·군사적으로는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더 가깝다. 뼛속까지 미국편인 일본과 달리 중국이 파고 들 여지가 있다. 경제 뿐 아니라 북핵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은 중국에 아쉬운 게 많은 나라다.
◇ 패권다툼 격랑..실물·금융, 中 영향권 속으로
중국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했다. 중국은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시 한국에 '위안화 금융허브'라는 선물보따리를 풀어놨다. 유럽 선진국들이 몇년간의 노력끝에 확보할 수 있었던 위안화 역외허브의 지위를 우리는 단숨에 꿰찼다. 대신 중국은 바라는 것이 있었다.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해 달라는 요구였다.
FTA는 당초 연내 타결이 힘들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이번 APEC 회의에서 '실질적 타결'이란 형태로 신속하게 매듭지었다. 실질적 타결이란 '미완의 타결'이란 얘기와 같다. 품목별로 개방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FTA'란 원성이 자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는 나름의 경제·외교적 필요에 따라 서둘러 일을 매듭지으려다 생긴 일이다.
중화권(대만, 홍콩, 싱가포르)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을 FTA로 묶어놓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맺어 미국의 견제를 무력화시킬 작정이다. 한국은 중국의 러브콜에 화답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APEC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FTAAP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 적극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미중간 패권다툼 과정에서 한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경도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중국의 또 다른 요구사항, AIIB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항마적 성격을 띤 기구다. 미국이 감독, 일본이 주연을 맡아 아시아에 구축해놓은 금융질서, 즉 ADB 체제를 AIIB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대박'을 외쳐온 박근혜 정부에게 AIIB는 활용도가 높은 카드다. AIIB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해 만든 기구로, 북중 관계를 감안하면 북한 인프라 투자를 유도해 낼 수 있다. 우리는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중국을 매개로 북한에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되는 셈이다. 중국의 한국 끌어안기 행보를 곱잖은 시선으로 보던 미국은 발끈했다. 정부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 정부에 "줄을 똑바로 서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고, 한국은 일단 AIIB 참여를 유보했다.
세계 경제·안보 질서의 주도권을 뺏고, 뺏기지 않으려는 미중간의 다툼은 점점 노골화되면서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한중 FTA와 위안화 금융허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물경제와 금융·자본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커지고, 한국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는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중국 리스크에 그만큼 취약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가 용의 등에 올라탔다면 용과 함께 비상할 수도 있지만 자칫 방심하면 내동댕이 쳐질 수도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