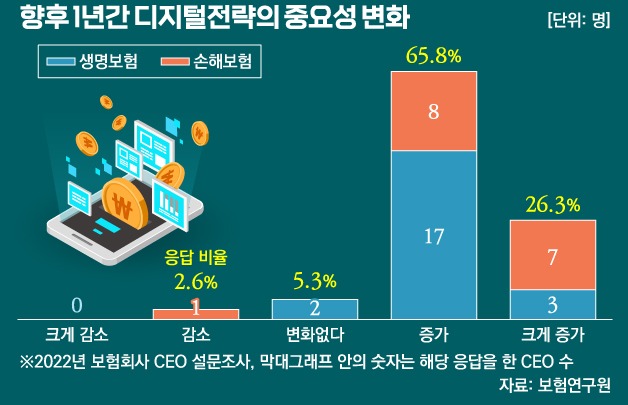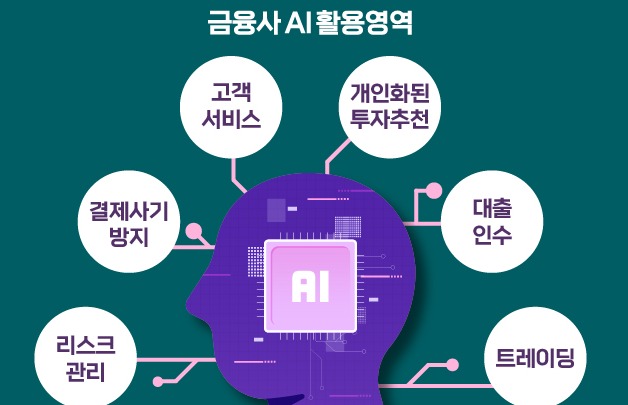디지털 전환은 금융기관들에게 오랜 숙제였다. 모바일 뱅킹이 이미 일상이 된 단계다. 그러나 공공성과 안정성이 더 앞서 전제돼야 할 가치로 지적되는 요즘 상황에서 디지털은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
혁신의 부작용에 여론과 당국의 공격좌표가 찍혔다. 빠른 디지털 전환과 여기에 집중되는 자원이 고령 이용자 등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금융 소외계층을 더 늘리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비대면 금융의 최대 강점인 빠른 입출금은 불안이 번질 때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을 삽시간에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화는 금융권에 절박한 숙제다. 편리함을 더해 이용자와 돈을 모으고, 업무 효율을 높여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중추로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답은 디지털뿐이라서다.
'플랫폼의 위력' 지점 줄어드는 진짜 이유

'휴대전화로 은행 일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지점 창구는 급속도로 줄어들었다.' 금융서비스의 소비자 접점인 대면 창구(프론트 오피스)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다. 서로 원인과 결과를 주고 받는 두 가지 통계가 지금까지 진행된 금융 디지털화의 밑바탕이다.
단순한 입출금·이체 거래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인터넷뱅킹 비중은 2018년 53.2%에서 작년 77.7%까지 늘었다. 반면 자동화기기(CD·ATM)까지 포함한 은행 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39%에서 19.7%까지 줄었다. 반면 은행 점포는 2012년 7673개에서 2017년 6789개, 작년 5800개로 감소했다. 10년 새 4곳 중 1곳이 줄어든 꼴(24.4% 감소)이다.
은행이 지점을 줄인 것이 수익성에만 치우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따져 보면 그만큼 창구 이용 수요가 줄어든 게 현실적 배경이다.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플랫폼 기반 인터넷전문은행은 아예 지점이 없지만 모바일 이용자수는 KB국민·신한은행 등 대형 금융지주들을 압도한다.
시중은행들에서 "이러다 플랫폼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금융지주들이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에 목을 매고 슈퍼앱 구축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지금은 기존 금융권보다 자산이나 이익 규모가 훨씬 작지만, 이들에게 플랫폼 경쟁에서 밀리고 디지털 혁신에 뒤처지다 보면 미래 주도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부풀어 있다.
뱅킹앱 경쟁 넘어 BaaS로
이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서도 금융권의 이런 현실인식이 그대로 보여졌다. 대형 금융지주들이 스스로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 모두 디지털이었다.
KB금융은 대표 플랫폼인 KB스타뱅킹을 필두로 △KB 인공지능(AI)금융비서 △KB 국민인증서 △KB부동산 데이터허브 △KB메타버스 브랜치 등의 체험 부스를 내놨다. 신한금융은 △시나몬(메타버스 플랫폼) △땡겨요(배달주문앱) △페이스 페이(Face Pay) 등 신한은행, 신한카드 등 계열사의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해외 참가자들에게 선보였다.
하나금융은 △트래블로그 △환전지갑 등 외환 측면에 강점을 둔 디지털 혁신 상품을 내보였고,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출시한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를 주제로 전시했다. NH농협금융도 △메타버스 △생체인증△인공지능(AI) △헬스케어 등 4가지 주제로 부스를 운영했다.
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경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변화도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지점 운영 등에서 새어 나가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미들 오피스), 데이터 관리부터 회계·감사·전산·결제 등 운영을 정교화(백 오피스)하는 후선에서 모두 디지털 혁신 압력이 커졌다.

더욱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디지털 생존전략은 기존 금융권의 강점인 자본과 신뢰를 활용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두 개념은 △BaaS(Banking as a Service)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이다. 비금융사에 구조화한 시스템이나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사업모델이다.
BaaS는 금융권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장해 노려볼 만한 분야로 꼽힌다. 해외에선 스웨덴 인터지로(Intergiro), 영국 뱅커블(Bankable) 등이 BaaS를 활용한 복수통화계좌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임베디드 금융도 최근 늘고 있는 후불결제 등에서 확대되고 있다. 애플 페이, 차량공유업체 리프트 등이 대표 사례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의 플랫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종합 금융역량의 제고를 통해 외부 플랫폼과 역할을 분담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BaaS나 협업 등을 통한 데이터 중심 서비스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정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세정보를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뢰·포용·거버넌스…'책임' 뒤따라야
하지만 변화에는 책임도 따른다. 금융이 사회적 파급력이 절대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그 책임은 더 크다. 자칫하다가는 자본과 신뢰라는 금융산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지점 줄이기에 신중을 더하라는 당국의 압력도 변화 속 사회적 신뢰 약화라는 부작용을 덜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읽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화로 대표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역시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비스의 혁신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며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고 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키는 게 기준이다. 최소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만큼의 제도 변화도 수반돼야 한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금융 디지털 성장방식으로△수익창출력 강화 △인수합병(M&A)와 파트너십 △글로벌 확장 등을 꼽는다. 그러면서도 나이·소득·장애·교육 등 격차에 따른 디지털 불평등이 금융 소외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디지털 전환의 속도뿐만 아니라 적절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도 금융권이 역량을 할애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기초로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지배구조 체계 변화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홍기 한국딜로이트그룹 금융산업부문 총괄리더는 "디지털 전환의 속도가 디지털 통제와 보고의 변화 속도를 앞지른다면 운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성장을 위해 필요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