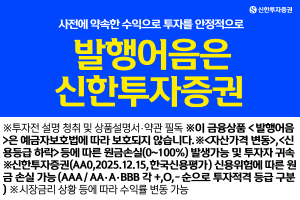교보생명과 함께 금감원의 징계에 반발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당장 기존 태도에 변함이 없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배임 문제 등으로 주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은 당장 이날 열리는 제재심에서 교보생명의 사례를 들며 두 보험사를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 교보생명, 미지급 '건' 모두 지급…일부 지연이자 제외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건 모두를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4시간 전 깜짝 발표했다. 교보생명이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은 미지급 건 모두에 해당하는 1859건, 672억원 규모다.
교보생명은 다만 2007년 9월 이후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과 지연 이자 모두 지급하되, 그 이전 건에 대해서는 원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07년 9월은 대법원이 "약관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도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시점이다. 보험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온전히 주기 어렵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금감원의 요구에 어느 정도 응하는 모양새다.
교보생명은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수차례 입장을 바꿔왔다. 애초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금감원이 중징계를 예고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자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만 '일부'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은 금감원이 약관 위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점이다.
교보생명은 이와 함께 '보험금'이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비판 여론을 인식해 다시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후 제재심 직전 다시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건' 지급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관련 기사 ☞ [기자수첩]고집과 꼼수...자살보험금 '법꾸라지' 논란
◇ 오너 리스크에 백기…삼성·한화, 커지는 부담
삼성·한화생명과 함께 금감원에 대응해왔던 교보생명이 입장을 갑작스럽게 바뀐 이유는 '오너 리스크'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3개 생보사에 일부 영업정지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임직원에 대해선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까지 징계 예정 수위를 통보했다. 금감원의 판단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오너인 신창재 회장이 경영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다.
교보생명은 이번 결정으로 중징계는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교보생명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아무래도 금감원과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며 "특히 오너 리스크가 있는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경영인이 최고경영자(CEO)인 삼성과 한화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교보생명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두 보험사는 일단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의 '입장 선회'로 삼성과 한화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세 보험사는 '소멸 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기대 배임 우려가 있다면 한목소리를 내왔는데, 아무래도 이런 주장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의 압박도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이날 제재심에서 교보생명의 사례 등을 들며 중징계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선 23일 열리는 제재심 분위기에 따라 두 보험사가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중징계로 급격히 기울 경우 '타협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