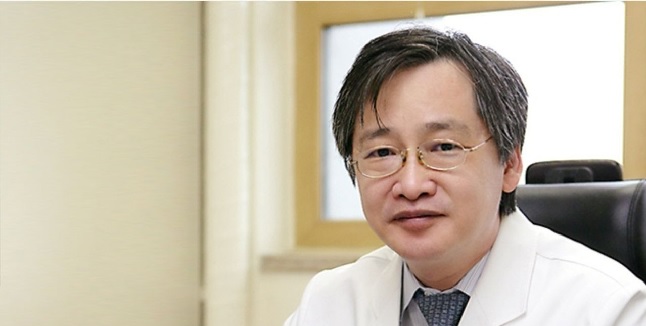
질병을 진단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CT) 등을 이용해 병리학적 변화를 찾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치매는 아직 확실한 진단법이 없다. 정확한 발병 기전이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다.
현재 치매 진단은 인지심리검사나 문진, 보호자 면담 등을 진행한 뒤 의료진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다만 이런 임상 진단 방식은 확증적이지 않다. 질병의 중증도가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초기 인지장애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능력은 떨어진 상태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해 병을 진단하기 쉽지 않다.
김경환 신촌세브란스병원 뇌신경센터 교수는 치매 치료를 위해선 '진단의 표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인지장애 진단 및 치료 연구에 앞장서고 있다. 연세대 의과대학을 나온 김 교수는 미국 UC샌프란시스코 의대 전임의, 스탠포드 의대 전임의 등을 거쳤다. 현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뇌혈관질환과 인지장애 등을 진료 중이다. 김 교수를 만나 치매 진단의 새 패러다임에 대해 들어봤다.
최근 전 세계 바이오업계를 뜨겁게 달군 치료제가 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다. 난공불락으로 꼽혔던 치매 치료제 영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에 이어 두 번째 치료제를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두 치료제 모두 효능과 부작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치매의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하면 중증 치매로 진행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김 교수는 "치매는 이미 뇌의 신경세포가 죽어 치료가 어렵지만 경도인지장애는 신경세포 연결망인 시냅스의 손상이 원인인 만큼 인지중재치료를 활용하면 약 25%의 환자군에서 치료 효과를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다. 현재 주로 쓰이는 진단법은 국내에서 개발된 인지기능검사(SNSB)다. 그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양전자 단층촬영(PET) 등을 통한 병리학적 진단법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환자의 병적 소견을 모아 진단을 내리는 추정 진단에 가깝다"면서 "이런 방식의 경우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다. 보통 SNSB 검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만원(건강보험 적용), 소요 시간은 90분가량이다.
김 교수는 임상 진단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ICT 기반의 인지장애 진단기기를 도입한 게 대표적이다. 의료기기 개발 바이오기업 알피오가 개발한 인지기능검사 시스템(TCFT)을 통해 진단 표준화에 나섰다. 그는 "ICT 기반의 진단 시스템을 이용하면 검사 시간과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궁극적으로 진단 시간을 줄여 환자의 부담을 덜면서도 ICT를 통해 정확도까지 높이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알피오의 검사 시스템은 기존 의료진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여러 기능검사를 컴퓨터가 대체한다. 지필 검사에선 평가하기 어려웠던 소리나 시각, 촉각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또 모니터에 한 문제씩 제시돼 모든 평가가 일관성 있게 진행된다. 기존 검사에선 의료진에 따라 평가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나아가 해당 시스템에서 쌓은 빅데이터로 인지장애 진단법을 표준화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향후 인지장애 진단 패러다임이 임상 진단에서 영상 진단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인지장애나 치매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병리학적 진단이 주로 활용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과거엔 치매의 원인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 때문으로 보는 가설이 우세했으나 요즘엔 과인산화 타우 단백질 축적 가설에 좀 더 힘이 실리는 추세"라며 "연구가 진행되면 이를 측정하기 위한 영상 진단이나 합성 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