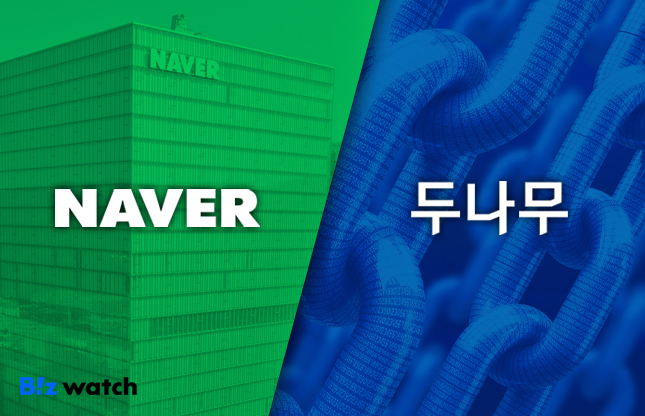
'공룡 빅테크' 네이버와 국내 최대 가상자산사업자 두나무의 빅딜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두 기업의 결합으로 IT·금융·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빅딜의 배경과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편집자주]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은둔의 승부사'로 불린다. 외부에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신사업을 키우기 위해서라면 대규모 출혈을 감수하면서 인수합병(M&A)을 타진했다. 수차례 인수합병을 통해 카카오, NHN, 크래프톤 등을 이끄는 거물들이 이 의장과 손을 잡았고 지금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한게임·서치솔루션·첫눈…네이버 반석 다졌다
대표적인 예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설립한 '한게임커뮤니케이션'의 인수다. 1999년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네이버(당시 네이버컴)의 매출액은 18억원에 불과했다. 이미 야후코리아와 다음(Daum)이 시장을 선점한 상황이었던 만큼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다.
네이버는 2000년 4월 국내 최초의 온라인 게임 포털이었던 한게임커뮤니케이션(이하 한게임), 인터넷 마케팅 솔루션 기업 '원큐', 검색엔진 기술 연구기업 '서치솔루션'과 합병했다. 당시 한게임의 기업가치는 약 625억원, 원큐는 192억원, 서치솔루션은 400억으로 산정됐다. 3개사를 모두 합치면 12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합병이었다.
합병은 한게임과 원큐의 주식 1주당 각각 네이버 보통주 2.59733주, 1.61333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서치솔루션 역시 네이버의 주식 15%를 주고 약 40%에 달하는 지분을 받아 관계기업으로 편입한 후 추가 매입을 통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다.
M&A 결과는 곧바로 실적으로 드러났다. 네이버는 한게임을 흡수합병한 후 엔에이치엔(NHN)으로 이름을 바꾸고, 2001년부터는 한게임의 콘텐츠를 유료화했다. 2000년까지 네이버의 매출은 88억원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만인 2002년 74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2002년 기준 프리미엄게임 매출은 337억원으로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네이버는 지금의 캐시카우가 된 검색산업을 공고히 할 때도 M&A 전략을 사용했다. 설립 초반 네이버의 매출을 책임지고 회원을 확보하는 데 한 몫을 한 사업은 게임이었지만,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2005년부터는 검색광고·배너광고를 비롯한 검색포털 사업 매출이 앞섰고, 2006년에는 검색포털 부문 매출액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글로벌 최고 검색엔진인 구글이 2006년 국내 검색시장에 진입하자 네이버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국내 최고 개발진들이 모여 검색시장의 '다크호스'로 평가받던 검색엔진 '첫눈'을 350억원에 인수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첫눈의 창업자는 네오위즈와 크래프톤을 만들어 낸 장병규 의장이다. 첫눈은 구글도 눈독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의장이 직접 장 의장을 만나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사하거나 흡수되거나…네이버 떠난 거물들
'대형 M&A'의 결과는 제각각이었다. 한게임을 비롯한 온라인게임의 매출비중은 점차 낮아졌고, 2012년 말 기준으로 네이버 매출에서 한게임을 비롯한 온라인게임의 비중은 25.5%로 줄었다. 네이버에 인수된 지 약 13년 만인 2013년 NHN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의 독립법인으로 분사했고, 한게임 지식재산권(IP)을 가져가면서 지금의 NHN이 됐다.
한게임의 창업 멤버들이 네이버와 함께한 기간은 더 짧았다. 대표적으로 한게임의 창업자였던 김범수 센터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네이버의 공동대표직을 맡았고, 네이버의 미국 법인이었던 NHN USA 설립을 총괄했으나 2007년에는 완전히 회사를 떠났다. 경영 방향을 두고 이해진 의장과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NHN USA는 2011년 아에리아게임즈에 현물 출자 형식으로 매각됐다. 한게임 '올드보이'인 문태식 카카오브이엑스 대표, 남궁훈 아이즈엔터테인먼트 대표 역시 김 센터장의 퇴사 후 자리를 옮겼다.
한게임 지식재산권(IP)을 이어받은 NHN을 가져간 사람은 '게임'보다는 '검색'과 더 가까웠던 이준호 현 NHN 회장이다. 이 회장은 2000년 주식교환 방식으로 네이버에 인수된 서치솔루션의 창업자이자 대표였다. 네이버는 2003년 서치솔루션의 잔여 지분을 모두 사들여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고, 이 회장은 네이버의 대주주로 최고기술책임자(CTO), 최고서비스책임자(CAO) 등 C레벨 임원을 맡았다.
NHN 분사 직전인 2012년 기준으로 이 회장이 보유한 네이버 주식은 180만주(3.74%)로, 이해진(4.64%) 다음으로 많았다. NHN이 기업분할된 후 이 회장은 본인이 보유한 네이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이 자금으로 네이버와 이 의장이 보유한 NHN 지분을 모두 매입해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고, 네이버와 연결고리도 끊었다.
NHN으로 네이버에서 독립한 한게임과 달리 첫눈과 서치솔루션은 모두 네이버의 일부가 됐다. 첫눈은 네이버에 인수된 후 검색 서비스를 중단했고, 첫눈 법인도 약 2년 만인 2008년 서치솔루션에 흡수합병됐다. 네이버 자회사로 2021년까지 법인을 유지했던 서치솔루션 역시 2021년 네이버에 흡수됐다.
첫눈이 네이버에 인수된 후 대부분의 개발진은 '첫눈'처럼 네이버에 녹아들었다. 그러나 창업자인 장병규 의장은 네이버에 몸을 담지 않고 완전히 별도의 길을 갔다. 네오위즈, 첫눈을 설립하고 매각하면서 마련한 자금으로 블루홀스튜디오를 차려 지금의 크래프톤이 됐다.
네이버가 카이스트(KAIST) 출신 인재들이 모였던 첫눈을 인수한 성과는 일본 사업인 '라인'에서 나타났다. 첫눈 출신 신중호 라인야후 최고제품책임자(CPO)가 일본에서 검색 서비스를 출시하고, 2010년 일본 포털 '라이브도어'를 인수해 합병하면서 현재의 라인이 탄생했다. 라인은 출시 반년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등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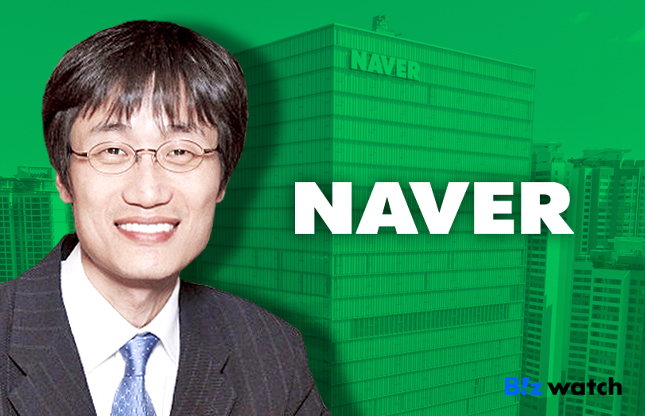
두나무 송치형, '넥스트 이해진'?
이해진 의장은 네이버가 위기에 몰릴 때마다 과감한 인수합병(M&A) 전략으로 위기를 타개했다. 이러한 전략은 네이버만의 일은 아니다. 경쟁사인 카카오 역시 비슷한 길을 걸은 바 있다. 카카오는 2014년 다음과 주식교환 방식으로 합병하며 덩치를 키웠다. 다음은 합병된 지 약 11년 만에 카카오로부터 별도 법인으로 독립하는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 의장과 한 배를 탔던 한게임, 서치솔루션, 첫눈의 대표이사들은 네이버의 요직을 맡기도 했지만 결국 자리를 떠났다. 1964년생인 이준호 회장부터 1966년생 김범수 센터장, 1973년생 장병규 의장까지 벤처 1세대였던 그들은 카카오, NHN, 크래프톤 등 곳곳에서 국내 IT산업을 이끌고 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다. 다음을 창업했던 이재웅 전 대표는 이후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 쏘카를 창업했으며, 현재는 쏘카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1979년생인 송치형 두나무 이사회 의장은 앞서 이해진 의장과 손을 잡았던 벤처 1세대와는 상황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 의장이 송 의장에게 네이버를 맡기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왔다. 이 의장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후배로 신뢰관계가 두터운 송치형 의장을 '넥스트 이해진'으로 점찍었다는 것이다. 송 의장과 이 의장은 오는 27일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합병 기자회견에서 함께 자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