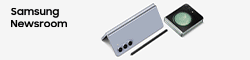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윤미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그냥…잠을 좀 못 자서요."
"그게 아닌데. 무지 속상한 얼굴인데? 무슨 일이야? 나한테 털어 놔. 후련하게."
"별일 없어요. 정말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아 참, 메일 보낼 게 있었지…"
메일을 핑계로 서둘러 탕비실을 빠져나오며 윤미씨는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한 동안 홀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게 되었다는 심란한 사실을 남과장이 먼저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눈치가 빠른 만큼 행동도, 입도 빠른 그가 알면 점심 시간이 되기도 전에 부서 전체에 말이 퍼질 테고, 가뜩이나 신제품 프로모션으로 눈 코 뜰 새 없는 요즘, 공연히 지원이나 야근에 빼달라고 부탁하려나 하는 주위의 불편한 이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윤미씨, 뭐야? 무슨 일이야? 얘기 해보라니까."
점심 시간에 식당에서 마주친 남과장이 다시 캐묻는다. 집요하다, 기분이 슬그머니 나빠지려고 한다. 윤미씨는 애써 언짢음을 감추고 얼른 돌아서 나왔다. `대체 뭐가 궁금한 걸까? 정말 내가 염려스러운 걸까? 대답 안 하면 그냥 모른 척 좀 해주지.`
프로모션 제품 수량과 배송지를 확인하느라 퇴근이 두 시간이나 늦어졌다. 혼자 병원에 계실 어머니 때문에 초조해진 윤미씨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리며 자꾸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았다. 종일 아무 말씀 없으셨던 부장님께서 슬쩍 곁으로 오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윤미씨, 수고 했어요, 얼른 가보세요." 주춤거리는 윤미씨의 어깨를 밀더니 전체를 향해 큰 소리로 이야기했다. "자, 모두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일 봅시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머니도 며칠 후면 퇴원 하신다. 부장님은 그 동안 두 번이나 외부 출장을 보내 윤미씨의 야근을 면해 주셨다. 따로 불러 이유를 물은 적도 없었다. 경황이 없어 부장님을 찾아 뵙지 못한 윤미씨는 오늘 그 간의 상황을 설명하고 감사 드렸다.
"그랬었구나, 힘들었겠어요. 어머님 빨리 쾌차하실 거예요, 윤미씨는 성실해서 하늘이 살펴 줄 겁니다." 윤미씨는 손을 꼭 잡아주는 부장님이 언제나 내 편 같은 가족처럼 느껴졌다.
"많이 힘드시죠? 앉아 계세요.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남의 일에 관심 많고 말 빠른 남과장이 기브스를 하고 출근한지 이틀 째다. 윤미씨가 가져다 준 커피 잔을 받아 든 남과장이 하소연 한다.
"사람들이 어쩜 그러니? 죄다 왜 다쳤냐는 거야. 어디서, 왜 그랬는지 만 묻지, 자진해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더라고. 대체 뭐가 궁금한 거냐고? 진심도 아니면서. 같은 말만 물어봐서 이제 답하기도 짜증난다니까."
윤미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과장의 기브스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때로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 할 수 없던 것을 몸으로 깨달을 때가 있다. 저 묵직한 기브스를 풀 때쯤 이면 남과장의 소통법도 바뀌어 있을까?
가끔은 캐묻지 않고, 모르는 척 조용히 넘어가주고, 남 모르게 필요한 걸 도와주는 게 바로 진심 어린 염려이고 배려하는 소통 아닐까? 마치 왜 다쳤는지, 어디서 다쳤는지 묻기보다는 자진해서 커피 한 잔 타다 주는 것이 진정한 관심이고 도움이라는 것을, 기브스를 풀고 가뿐히 걸을 때쯤 남과장도 깨달으면 좋으련만.
부장님께서는 결제를 위해 남과장 자리로 오신다. 윤미씨의 딱한 사정을 표 내지 않고 조용히 헤아려주었듯이, 이모저모 남과장을 살펴주신다. 그런 부장님을 보며 윤미씨는 리더십이 그리 먼 말이 아님을 깨닫는다.
먼저 헤아려주고, 믿고 격려해주는 것, 윤미씨는 어째서 부장님이 동기들보다 두 해 먼저 승진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