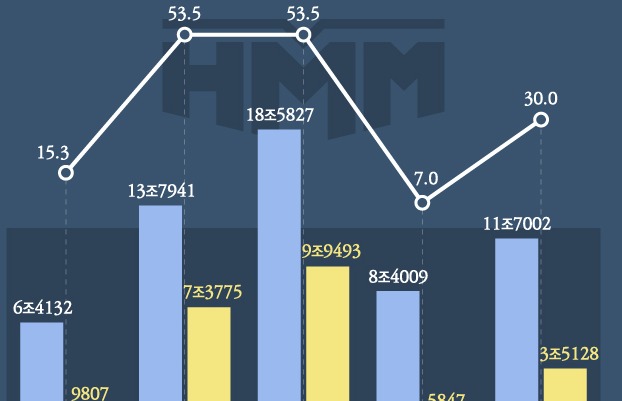"사람들은 정박한 배가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역, 보급, 점검, 선내 업무까지 동시에 돌아가야 해요. 한순간도 쉴 틈이 없죠."
335m 길이의 대형 컨테이너선인 'HMM 펄(Pearl)'호에 직접 올라 만난 이정진 선장의 미소는 누구보다 여유롭고 환했지만 그의 말에는 묵직한 책임감도 그대로 드러났다.
HMM 펄호는 지난해 7월 인도된 최신 컨테이너선이다. 1만3000TEU급으로, 미주 서안부터 중국·한국을 잇는 수출 주요 항로에 투입되는 선박이다. 유럽행 초대형선(2만4000TEU급)보다는 작지만 회전율과 효율성이 중요한 항로에선 오히려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펄호의 선장 이정진 씨(1986년생)는 2021년부터 선장직을 맡아 4년째 배를 지휘하고 있다. 올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항에서 승선해 인터뷰가 이뤄진 4월 말까지 4개월째 바다 위를 누비는 중이다.
부산신항에 정박한 펄호 위에서 기자가 "멀리서 보면 알록달록한 컨테이너들이 장난감처럼 보인다"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맞습니다. 위에서 보면 색색의 블록 같죠. 하지만 배 위에서 저걸 직접 실고 내릴 땐 단 하나도 쉽지 않아요. 정확하게, 빠르게, 또 안전하게 실어야 합니다."
그는 특히 배가 텅 비었을 때보다 만재(滿載)상태로 미국에서 돌아올 때 더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만선을 꿈꾸는 어부와 다름 없는 셈이다. "물건을 다 싣고 돌아오는 배를 보면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해냈다는 느낌이 들어요. 바다 위를 달리는 무역선이자 책임의 무게를 싣고 있는 거니까요."

초대형선의 항해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건 기상 변수다. 그는 "시스템이 많이 발달했어도 여전히 바다는 예측 불가한 곳"이라며 "비아샛(Viasat) 같은 위성 통신 시스템과 AIS(자동식별장치) 덕에 실시간 항로 정보는 확보되지만 기상이 급변하면 여전히 선장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자동화 시스템이 도와주는 순간도 많다. "예전엔 연료량, 속도, 엔진 상태 전부 수기로 기록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치화해줘요. 항해 중에도 곧바로 점검이 가능하니까 편리하죠. 그래도 사람이 모든 걸 최종 확인해야 하긴 해요."
선박의 현재 상태는 지상에 있는 '선박종합상황실'과도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연료 사용량, 엔진 이상 징후, 정시 도착 여부 등 다양한 데이터가 모이고 있다. "예전엔 선장이 책임지고 모든 걸 기록하고 했는데 지금은 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요. 문제 생기면 바로 회사 본사랑 통신하면서 의사결정하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발전한 셈이죠."
항해사를 거쳐 선장이 된 후 가장 달라진 점을 묻자 그는 "신경 써야 할 게 훨씬 많아졌다"고 했다. "운항 외에도 환경 규제, 연료, 안전관리까지 제가 책임져야 하거든요. 특히 새로운 장비가 계속 나오니까 선장도 늘 공부해야 해요. 예전보다 훨씬 복잡한 시대죠."
마지막으로 그는 가족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1월에 LA항에서 배를 탄 뒤 지금까지 가족을 못 봤어요. 특히 딸이 보고 싶네요. "5월 중순쯤 부산에 다시 입항하면 오랜만에 만날 수 있을 거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 덕분에 가족과의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짧은 재회라도 그게 다시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