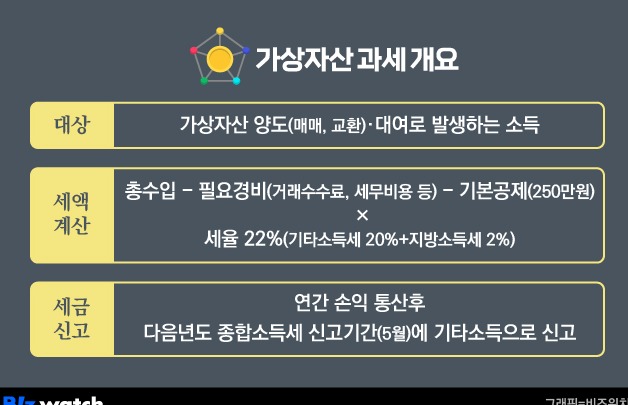세계 최대규모 가전·IT 전시회인 CES는 처음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지 않았다. 1967년 9월 뉴욕에서 첫 행사가, 이후 시카고와 번갈아 가면서 개최됐다.
그러나 노조문제가 발생하고 날씨가 너무 추워 관람이 힘들어지자 장소를 라스베이거스로 옮겼다.
특히 1998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자로 등장하면서 CES는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가전·IT 기업뿐 아니라 테크(tech)와 조금이라도 연관있는 기업이라면 CES에 참여하는 분위기라 전시규모는 더욱 확장됐다.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다보니 CES를 홍보의 장으로 여기려는 스타트업도 늘어났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을 제외하곤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들은 초기 개별적으로 참여했다가 지금은 국가브랜드를 내세워 국가관 형태로 참여하는 추세다. 이렇게 하면 관람객의 집중도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 첫 한국관 개설 후 지금까지 21회에 걸쳐 한국관 형태로 참여 중이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KOTRA,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창업진흥회,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 성남산업진흥원 등이 공동으로 모인 통합한국관 이외에도 서울시관, 서울대관, KAIST관 등이 별도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CES 전시참여를 다소 늦게 결정하면서 통합한국관 참여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브랜드를 알리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CES에서 서울시의 디지털 시민시장실과 서울시 혁신기업 20곳을 소개하게 돼 기쁘다"면서 서울시 세일즈에 열중했다.
'한국'브랜드가 먼저니 다른 브랜드를 알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능력이 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알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CES에선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SK 등 대기업군을 제외하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스위스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된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그렇다.
전세계 스타트업이 모인 CES 2020 전시관 유레카파크(EUREKA PARK)는 그야말로 격전지다. '우리 예산 있으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식 발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전략이 필요하다. 총성 없는 전쟁터인 만큼 기왕이면 한국이라는 역량을 한군데로 모았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