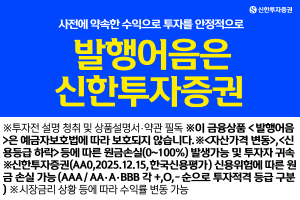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나금융이 내세운 실리와 외환 노조의 명분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금융권에선 조기 통합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다. 은행산업의 수익성이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 통합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외환은행 입장에선 하나금융의 그룹 문화와 내부 역학관계를 보더라도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하나금융은 인수•합병(M&A)으로 성장해온 터라 텃세 문화가 별로 없는데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경우 전략적인 이유에서라도 외환은행을 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하나•외환 통합 늦출 이유 없다”
통합에 따른 효율을 중요시하는 금융시장은 물론 금융권 전반에서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은행산업이 어려움에 부닥친 만큼 조기 통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두 은행이 합쳐지면 규모나 포트폴리오 면에서 신한•우리•국민 등 선두권 은행들과 제대로 붙어볼 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총여신은 200조 원에 달해 오히려 이들 은행을 훌쩍 뛰어넘는다. 외환은행의 차별화된 외환 경쟁력에도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외환은행 직원들에게도 나쁜 선택이 아니다. 이미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마당에 통합을 미룬다고 해서 득이 될 게 없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쟁력이 나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3년 후 통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진다.

◇ 하나금융, 텃세보다는 실력 중시
하나금융의 그룹 문화와 내부 역학관계만 봐도 외환은행 입장에선 지금이 가장 유리하다. 하나금융은 충청과 보람, 서울은행을 차례로 인수하면서 M&A로 성장해왔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텃세보다 능력과 실적을 중요시하는 그룹 풍토를 가지고 있다.
직원들의 출신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보다는 경쟁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금융은 특히 배보다 배꼽이 큰 M&A가 많았다. 덩치가 더 큰 조직을 인수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배타적인 문화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
현재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분포만 봐도 그렇다. 10여 명의 임원 가운데 서울은행 출신이 5명, 외환은행 출신이 3명이나 된다. 하나은행을 봐도 51명의 임원 가운데 하나은행 출신은 8명(15.7%)에 불과하다. 부•점장급 관리자 역시 하나은행의 비중은 15.3%에 지나지 않는다.
◇ 내부 역학관계도 외환에 유리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자신도 서울은행과 신한은행 등 다양한 조직을 거치면서 경쟁을 통해 톱의 자리에 올랐다. 배타적인 텃세 문화보다는 능력과 실력으로 인정받는 문화에 더 익숙하다는 뜻이다.
김 회장은 전략적으로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사이에서 중용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김 회장은 왕회장으로 불리면서 실질적으로 하나금융을 일으킨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뒤를 이어 2012년 회장직에 올랐다. 그러다 보니 김 회장에겐 왕회장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러려면 여전히 왕회장의 인맥이 탄탄한 하나은행보다는 새 식구인 외환은행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김 회장 입장에선 하나은행만 싸고돌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다.
◇ 외환 노조의 ‘이중성’ 비판도
외환 노조가 주장하는 5년간 독립경영의 가치가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립경영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만 할 뿐 그 후 대안이나 청사진이 없다는 얘기다. 론스타가 대주주였던 시절 겉으론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리에 발 빨랐던 외환 노조의 이중성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과거 론스타는 외환 노조가 대주주 자격 등을 문제 삼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비롯한 경제적 보상으로 반발을 무마했다. 외환 노조는 딱 거기에 만족했다. 그러면서 외환은행의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굳어졌고,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외환 노조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5년간 독립경영 약속이란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외환 노조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두 은행의 경영이 계속 나빠지면 하나금융이 꺼낼 수 있는 선택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신한•조흥은행 사례가 본보기
따라서 외환 노조가 5년간 독립경영이란 약속에 집착하지 말고, 판이 깔렸을 때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나금융 역시 외환은행의 자존심을 존중하면서,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장을 분명하게 약속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성공적인 통합으로 꼽히는 신한•조흥은행 사례는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 모두에게 좋은 본보기다. 100년 역사의 조흥은행 직원들은 자존심을 접고 신한금융을 새로운 파트너로 받아들였고, 신한금융은 통큰 양보로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냈다. 덕분에 신한은행은 지금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진 은행으로 탈바꿈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2~23일 그룹 이사진이 참여한 워크숍을 열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두 은행의 통합이사회를 일단 연기하면서 외환 노조에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불가피하게 조기 통합을 추진하긴 하지만 외환 노조와 함께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협상 과정에선 무엇보다 외환은행의 경쟁력 회복과 직원 개개인의 안녕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