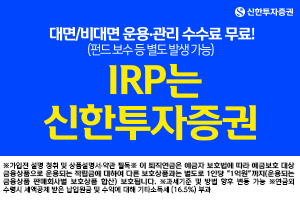| [재계를 바꾼 M&A] '잘못된 만남'..웅진과 LIG에서 이어집니다. |
'건설회사'를 M&A했다가 그룹해체라는 운명을 맞은 사례들이 있다. 금호아시아나(대우건설), 웅진(극동건설), LIG(건영) 등이 대표적이다. 건설회사 인수 실패가 행운이 된 경우도 있다. 극동건설 입찰에 참여했던 STX,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지만 현대차에 물 먹은 현대그룹을 예로 들 수 있다. STX가 극동건설을 인수했더라면 좀 더 일찍 붕괴했을 것이다. 현대그룹 역시 지금보다 더 혹독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했을 것이다.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 '역대급 M&A' 대우건설..둘 다 웃었다?
건설사 M&A가 그룹의 운명을 바꾼 사례중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될만한 것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였다.
2006년 11월15일 오후, 서울 남산 하얏트 호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김우석 사장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건설부문 신훈 부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대우건설 주식 72%를 금호아시아나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였다. 매각대금은 6조4255억원. 국내 일반기업 M&A 사상 최대규모 딜이었다.
비슷한 시각, 이들보다 속으로 더 크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캠코와 함께 이번 매각작업에 관여했던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간부들이었다. 지지부진한 공적자금 회수율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70%가 넘는 대량지분을 프리미엄을 얹어 처리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진짜 샴페인은 정부가 터뜨리고 있었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나는 대우건설을 산 게 아니라 대우건설 사람을 샀다"고 말했다. 그는 "대우건설에 다니고 있는 인재들이 탐이 났다"고 이런저런 자리에서 언급했다.
그럴만도 했다. 당시 대우건설은 종합시공능력 평가 1위 기업이었다. 업계에서는 '인재사관학교'로 평가받았다. 대우그룹 해체 등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위기관리 능력을 키운 임원들이 많았고, 석박사 및 기술사 건축사 자격증 보유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20% 이를 정도로 맨파워가 우수했다.
◇ 금호의 과식..내친 김에 대한통운까지
 |
박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아직도 배가 고프다. 언제든 1조5000억원 정도의 수표에 사인할 수 있다"며 자금력을 과시하듯 대한통운까지 인수했다. 그는 일약 '마이더스의 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마이너스의 손'으로 전락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무리한 인수방식 때문에 큰 탈이 났다. 대우건설 인수자금의 대부분은 외부차입으로 조달됐다. 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떠안기로 한 인수대금 2조9000억원의 대부분을 금융회사들로부터 빌렸다.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금액도 상당했다. 한마디로 모두가 빚이다.
나머지 3조5000여억원은 연기금과 투자회사(사모펀드) 등 이른바 재무적투자자(FI)들을 동원해 해결했다. 이들은 대우건설 주식을 인수한 뒤 의결권을 금호아시아나에 위임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신 3년 뒤 FI들이 보유한 주식을 주당 3만4000원의 가격으로 되사주기로 약속했다. 이른바 풋백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다.
금호아시아나와 FI들은 당시 1만5000원 정도에 시장에서 거래되던 대우건설 주식을 주당 2만6200원에 인수했다. 70%의 프리미엄이 붙은 셈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더 나아가 2009년 12월 FI 소유 주식에 대해 주당 3만4000원에 재매입하겠다는 옵션계약까지 했다. 인수 당시 시장가격 대비로는 2배가 넘는 가격이고, 최초 인수가격보다는 30%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었다.
대우건설 주가는 오르기는 커녕 하락일로였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면서 1만원까지 떨어졌다. 옵션보장 가격까지 회복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FI 주식 재매입에는 4조원 이상, 당시 주가와의 차액만 일단 지급한다 해도 2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 '승자의 저주'..타산지석의 교훈 남겨
 |
유동성 위기로 그룹의 전반적 재무상태는 더 악화돼 갔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뿐 아니라 대한통운까지 토해내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 이 와중에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간 경영책임을 둘러싼 분쟁까지 일어나 그룹이 쪼개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재계 사상 이 정도의 대형 기업들을 이렇게 단기간에 M&A 했다가, 2년여만에 다시 매물로 내놓는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이때부터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단어가 흔한 용어가 됐다.
대우건설 인수 뒤 건설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 맞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대우건설 인수 당시부터 금호아시아나의 현금흐름은 양호한 수준이 아니었고, 부채 또한 과다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전문가들은 예컨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2005년~2006년까지 각각 1조4000억원과 5200억원의 자금을 부채로 조달했는데, 이 두 해동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합계가 각각 770억원과 1000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M&A를 하면서 과다한 차입을 일으키거나 FI들을 동원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이 잘 분산된 기업의 경우 30% 정도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대우건설의 경우 40%~50%의 지분만 확보해도 될 것을 금호아시아나는 72%나 되는 정부 지분 전량을 떠안았다. 그러다보니 인수자금 마련에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었다. 금호아시아나가 입은 상처는, 무리한 M&A의 후유증이 얼마나 무서운 지를 한국 재계가 간접 체험토록 하는 '타산지석'이 됐다.
**[재계를 바꾼 M&A] 기획 시리즈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co-work)을 지향한다는 편집 방향에 맞춰 외부 기고를 통해 작성됐습니다. 본 기사는 김수헌 글로벌모니터 대표(fntom@naver.com)가 취재 및 작성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