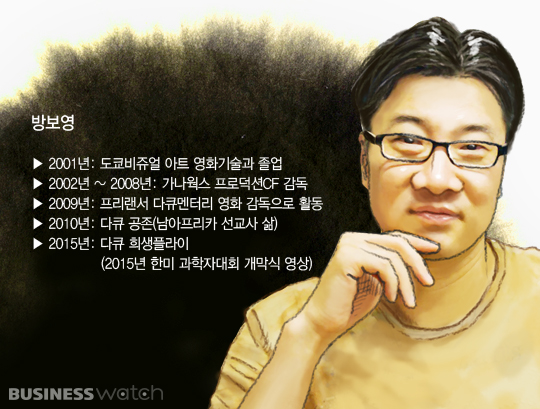지난해 연말 신은경 이화여대 교수가 만든 창작무용 작품인 헨델의 메시아가 무대에 올랐다. 2003년 초연 이후 벌써 12년째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다.

신 교수는 1992년 이화여대 무용과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이화발레앙상블을 창단했다. 이화발레앙상블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꾸준히 공연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이스라엘, 동티모르, 케냐, 인도 등에서 문화사절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신 교수가 헨델의 메시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바로 사랑이다. 그중에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더 편하고 더 풍족하지만 사랑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가치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고민을 던진다.

같은 작품을 12년째 매년 무대에 올리는 건 쉽지만은 않다. 그만큼 동기가 분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도 있어야 한다. 아마도 헨델의 메시아를 통해 전달되는 사랑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오는 건 아닐까? 때로는 갈등도 있고, 문제도 생기지만 그 과정을 통해 오히려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신 교수는 50년 넘게 무용을 했다. 신 교수에게 과연 무용이란 어떤 의미일까? 무용은 가장 입체적인 예술인 동시에 삶 그 자체다. 몸짓은 눈으로 보고, 음악은 귀로 듣는다. 무용은 하나하나의 몸짓과 음악을 한데 모아 생기를 불어넣는 작업이다.

대중은 대체로 무용을 어려워한다. 신 교수는 무용도 결국 나와 동떨어진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연결된 이야기라고 말한다. 발레를 감상할 때 중요한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는 일이다. 무용수와 나를 별개로 보지 말고, 좀더 편하게 다가선다면 몸으로 말하는 이야기에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술도, 사회도 그만큼 공감과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