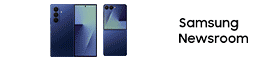“경주에 가면 성덕대왕신종과 에밀레종이 유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종을 먼저 보고 싶은가요?”
대부분은 ‘에밀레종’을 먼저 보고 싶다고 답한다. 사실 성덕대왕신종과 에밀레종은 같은 종이다. 홍사종의 책 『이야기가 세상을 바꾼다』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야기는 힘이 세다. 이제 그건 다 안다. 문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스토리 3요소에 충실하라? 진심을 담아라? 감성에 호소하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빠져드는 이야기, 먹히는 스토리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자기 이야기가 좋다.
그것이 가장 생생하다.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인생 책으로 만들면 몇 권을 쓰고도 남는’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면 어쩔 수 없다. 남의 이야기라도 빌려와라. 개그맨들이 토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모두 자기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 실제 이야기의 주인공보다 더 재미있게 얘기하면 된다.
영화 보고 나서 그 영화보다 더 재밌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다. 흘러간 노래 리메이크해서 더 맛깔나게 부르는 가수도 많다. 줄거리만 빌려 와서 더 보태고 빼면 그 이야기의 주인은 바로 당신이다. 물론 그것을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정직을 가장해야 할지도 모른다.
맵고 짜고 독해야 한다.
음식은 싱거운 게 건강에 좋지만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갈수록 좋다. 자극적이어야 한다. 충격적이면 더 좋다.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도 보는 것은 독하기 때문이다. 희로애락 모두가 그 대상이다. 그중에서도 실패하고 좌절한 이야기가 좋다. 성공담은 넘쳐난다. 사람들은 잘난 체하는 이야기가 싫다. 갈등도 좋은 소재이다. 누구나 싸움 구경을 즐긴다. 사랑하고 행복한 이야기보다는 미워하고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에 더 잘 빠져든다.
은밀할수록 좋다.
사람들은 무대 뒤를 궁금해 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렇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는 흥미 없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좋다. 남들은 모르는 이야기, 남들이 잘못알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운다. 기자들도 그렇다. 공식 브리핑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들어 달라 사정하면 마지못해 들어준다. 하지만 백그라운드 브리핑에 자기를 빼면 노발대발한다. 그 내용이 별 것 아닌 데도 과민 반응한다. 은밀한 이야기로 포장할 필요가 있다.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임을 표방해야 한다.
정석보다는 변칙이 통한다.
정석은 예상이 가능하다. 해피엔딩 재미없다. 권선징악은 상투적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이야기 말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스토리를 만들자. 기승전결, 서론-본론-결론의 뻔한 전개 말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이야기를 짜보자. 반전이 있는 스토리가 강하다. 융합도 방법이다. 웃기는 이야기와 슬픈 이야기를 결합해 ‘웃픈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티저 광고처럼, 추리소설같이 찔끔찔끔 보여주자.
내용이 좋아도 보여주는 방식이 잘못되면 실패한다. 화끈하게 보여주면 재미없다. 일일드라마 늘이듯이 감질나게 보여줘야 한다. 이야기가 힘 있는 건 호기심 때문이다. 보여 달라 채근하다가도 막상 보여주면 떠나는 게 구경꾼이다. 보여 줄듯 말듯 끈적끈적하게 끌고 가야 한다. 뒤에 나오는 얘기가 더 재밌을 것 같은 기대를 갖게 해야 한다. 스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 시간을 줘야 한다.
자, 이야기를 구성해보자. 그런데 스토리(Story), 플롯(Plot), 내러티브(Narrative)가 있다. 모두 이야기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한 것은 스토리, 이야기를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엮어놓은 게 플롯, 영화적 기법을 동원해 말만으로 기술이 불가능한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내러티브라고 한다. 복잡하다. 그냥 6하 원칙에 따라 빠진 것 없이 써보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