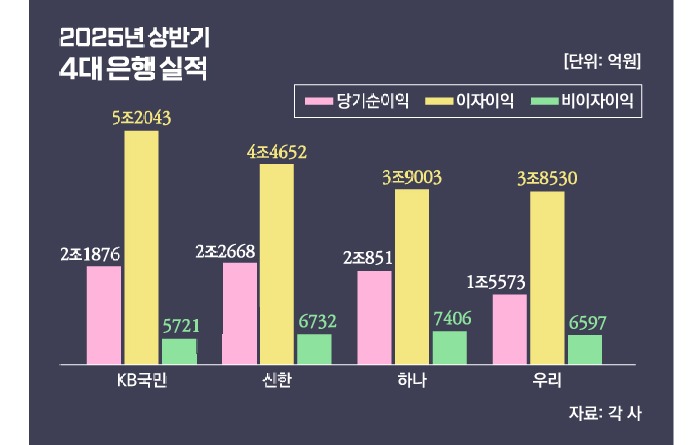애당초 정책적인 접근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 제로'를 표방한 페이류 등장으로 생존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카드사들은 크게 긴장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를 위협할 만한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에 일반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후불결제 기능을 넣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0만원 가량의 소액결제에만 후불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수료를 없애겠다는 제로페이는 후불기능과 궁합이 맞지 않는다. 지불이 묶여있는 돈은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비용을 들여 이자부담을 져야만 한다.
따라서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등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들 은행들과 협의해 당분간 수수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다. 언제까지 은행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시가 선보이겠다는 서울페이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아예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 신용카드사 참여는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돈을 벌 생각을하면 참여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다. '봉이 김선달'이 따로 없다.
강경하던 서울시도 후퇴한 것은 있다. 당초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 모두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던 방침은 폐기했다. 연매출 5억~8억원 가맹점은 0.5%, 6억원 이상 가맹점은 2.3% 미만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제로페이와 서울페이 등 정부주도의 페이류들은 수수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근거로 중국과 케냐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외국의 페이류를 살펴보면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그림이다. 실제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나, 수수료를 안받는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주도가 있었다.
2013년 여름 케냐 나이로비에서 일주일을 보낸 일이 있다. 최근 제로페이와 서울페이의 모델중 하나로 언급되는 음페사(M-PESA)가 바로 케냐에서 사용되는 '전자지갑'이다. 음페사는 영국계 이동통신회사 보다폰의 케냐 자회사인 사파리콤이 2007년 내놓은 서비스다. 5년전임에도 케냐 슬럼가에서조차 음페사 충전소를 볼 수 있었다. 현재 케냐 국민의 70% 이상이 음페사를 사용 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국에는 간편결제시장이 전무했던 상황이어서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음페사는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일 필요도 없었다. 일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송금이 가능했다. 케냐라고 하면 우리보다 금융과 기술이 크게 뒤떨어진 곳으로 생각했는데 현금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광경을 보니 상당히 신선했다.
하지만 탄성은 곧 탄식으로 바뀌었다. 음페사의 수수료율을 알고 나서다. 음페사를 이용한 송금금액이 100케냐실링(KSHs·약 1100원) 이하라면 수수료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이상이라면 송금액의 0.15~20%의 수수료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한국 기준 담배 한갑 가격인 400케냐실링을 음페사를 통해 송금하려면 45케냐실링(약 496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수수료율이 11.25%다. 만약 한국에서 담배 한갑을 사고 500원 가까이 수수료로 내야 한다면 서비스가 가능할까. 제로페이와 서울페이가 롤모델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숫자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2004년 내놓은 알리페이는 실제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알리페이는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결제정보를 통해 구축된 빅데이터를 알리바바가 활용해 각종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수수료 대신 정보를 받는 것이다.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은 알리바바가 사기업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는 중소기업 전문 쇼핑몰 '타오바오'와 '티몰', B2B전문 쇼핑몰 '알리바바닷컴', B2C전문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영화사와 포털사이트, 브라우저사업, 음악유통, 위치정보사업, 스포츠마케팅 전문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나 서울시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수료를 상계할만한 사업을 하기 힘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의 결제시스템을 연구해오던 카드업계로서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페이가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외국의 예를들며 페이서비스가 안착할 것으로 설명하지만 실제 장담하는 수준의 서비스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과정에서 비용과 수수료 등에 대해 금융회사 등 사기업에 떠넘기면 해결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