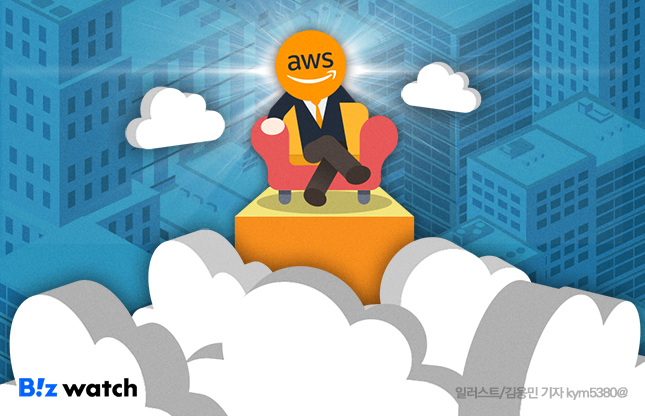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외산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월별 변동환율을 적용해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는 입장이라 급등한 환율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AWS도 구글도…매월 달라지는 고지서 폭탄
16일 업계에 따르면 AWS는 매월 고객사로부터 달러 기준으로 책정한 사용요금을 받는다. 이 때 적용하는 환율은 하나은행이 매월 말일에 최초 고시하는 전신환 매도율(송금보낼 때 적용하는 환율)이다. 고객사 입장에선 클라우드 사용량이 매월 똑같아도 전신환 매도율에 따라 비용이 들쭉날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은 1484원이었다. 한달 전(1408.3원)과 비교하면 5.4% 오른 셈이다.
다른 외산 클라우드 기업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구글 클라우드는 매월 초 금융기관 고시환율을 적용하고, 마이크로소프트(MS)는 매년 2회(2월, 9월)에 걸쳐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를 산정한다. 다음달까지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도 불편을 겪게 된다.
공공 부문은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를 비롯한 국내 CSP(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 시장은 이러한 외산 클라우드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민간 기업 중 60.2%(중복응답 가능)가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MS 애저(24.0%), 네이버클라우드(20.5%), 구글클라우드플랫폼(19.9%)등이 그 뒤를 잇는다.
탈AWS 움직임? 대형 고객은 글쎄
그나마 비교적 가볍게 서버를 움직일 수 있는 일부 스타트업은 비용부담이 커지자 '탈(脫) AWS'에 나서기도 한다. 데이터 크롤링 기업 해시스크래퍼는 지난해 비용 절감을 위해 AWS를 떠나 자체 서버를 구축했다.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것 뿐 아니라 보안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게 김경호 해시스크래퍼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경우 AWS 인프라를 적어도 10가지 이상 쓰고, 대기업은 더 많이 사용할 텐데 한꺼번에 옮기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우리는 B2B(기업간거래)인 만큼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도 서버를 이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B2C(기업 대 소비자) 라이브 서비스를 진행 중이거나, 데이터의 양이 방대한 기업들은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로 옮겨가기가 어렵다. 기존에 구축한 서비스를 옮겨 안착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다른 클라우드로 옮겼을 때 전환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 이전 시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호환되지 않는 등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멀티클라우드도 비용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다. 멀티클라우드는 여러 클라우드를 혼용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단일 클라우드에 문제가 생겨도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클라우드업계 한 관계자는 "멀티클라우드는 구축 방식에 따라 가격은 다르더라도, 혼용을 위한 추가 관리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다"며 "가격 절감과는 거리가 있고, 되레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염흥렬 순천향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2~3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기술력이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제는 상당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했다. 이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호환성, 안정성, 비용 추계 등 장단점을 비교해서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