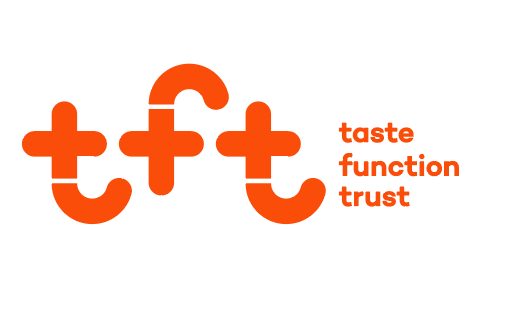증권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분주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다만 증권업종을 포함한 일부 특례업종은 1년간 유예기간을 줘 올해 7월부터 적용한다.
일부 금융지주 계열 증권회사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미리 도입했고, 대부분 증권회사가 시행을 앞두고 전 직원 근무 현황 조사와 구체적인 도입 가이드라인을 정하느라 한창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성과에 따라 연봉을 가져가는 전문 계약직종에 대한 적용 문제다. 증권회사에선 7월부터 법적으로 주 52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직원 개개인으로선 더 많은 인센티브와 몸값 띄우기를 위해 스스로 초과 근무를 자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서 차장급이면서 사장보다 더 많은 22억원의 연봉을 가져간 김연추 씨의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김연추 씨는 올해 초 미래에셋대우 에쿼티파생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미래에셋대우가 파격적인 연봉 조건을 내세워 적극적으로 영입에 나선 결과라는 후문이다.
김 본부장은 워커홀릭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냈고, 그 성과가 연봉과 자신의 몸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과연 김 본부장은 성과를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 있을까.
증권사 직원 입장에선 거액의 연봉을 받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가져가기 위해 그만큼 뛰어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단순히 성과가 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과거 100시간을 일해서 10억원어치의 성과를 낸 사람이 50시간으로 업무 시간을 줄이면 5억원어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억원어치 아래로 더 줄어들게 될 것이란 얘기다.
특히 트레이딩, 리서치, 상품개발 등에선 성과를 내기 위해 시장을 서치하고 분석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을 스스로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직원도 있다. 퇴근 후 자신의 연봉을 지키기 위해 이어나가는 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장소만 바뀔 뿐 근무 시간을 유지할 것이란 얘기다.
회사 입장에서도 무려 연봉 20억원을 지급하는 직원과 1억원 미만을 지급하는 직원이 동일한 시간을 근무한다면 손해가 막심하다. 물론 급여 체계나 능력치를 뒤로하고 단순 양적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52시간 근무로 회사가 기대한 성과를 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획일화된 규제를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업무 특성과 연봉체계 등을 고려한 특례 적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여전한 이유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등은 주 40시간 근로시간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직무특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획일화된 근로규제가 적합하지 않은 직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와 노동체계가 유사한 일본은 금융 관련 딜러,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등은 탈시간급제를 적용해 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만 연동되도록 했다. 탈시간급제를 선택한 근로자는 스스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탈시간급제는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고, 근무자의 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하지만 연봉 1075만엔(한화 1억900만원) 이상의 고액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한정했다.
한국도 증권업에서도 획일화된 근로규제가 어려운 직무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김연추 본부장과 같은 증권사 고액연봉자는 본인이 원한다면 탈시간급제 등으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예외를 인정하되 대부분 근로자에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아줌으로써 정부의 본 취지대로 국민 행복을 증진한다면 모두가 원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무조건 안 된다'는 잣대보다는 해외의 사례처럼 업종 특례에서 좁혀 직무 특례, 혹은 연봉 한도 도입 등으로 다양한 특례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는 유연함이 더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