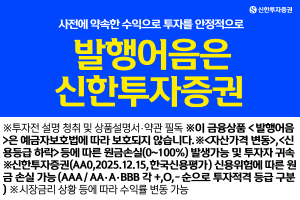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그 사람이 유력하다던데 맞는 거야?"
다시 금융감독원 '복도통신'이 숨 가쁘게 오간다. 유임이 전망됐던 정은보 금감원장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한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내부 인사 개편도 불가피해진다. 직원들은 술렁일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최근 1년여 만에 3명의 새로운 원장을 맞이하게 됐다. 모처럼 임기를 만료한 윤석헌 전 원장에 이어 시한부 우려가 현실이 된 정은보 원장, 그리고 후임이 될 누군가다.
관가의 설(說)처럼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부임하면 내부에는 다시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금감원장에 임명권이 있는 부원장보 라인은 줄줄이 검찰 출신으로 갈아치워질 수도 있다. 금감원 관행이 그랬다. 앞서 정 원장도 작년 8월 취임과 동시에 임원 전원에 일괄 사표를 요구하고 결국 임원 10인과 부서장 90%를 교체한 바 있다. 반년도 채 안 된 일이다.

백번 양보해 여기까지가 내부 기강에 해당된다고 치자. 더 큰 문제는 새 원장 아래 변화가 불가피할 금감원의 감독 기조다. 금감원 업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회사 검사제도가 정 원장 체제 아래 종합검사에서 정기·수시검사로 바뀐 지 불과 석달밖에 되지 않았다. 이제 막 검사에 들어가거나 검사를 앞둔 금융회사들은 또 새로운 스탠스에 장단을 맞춰야 할 판이다.
분명한 것은 이 와중에도 금융권 횡령과 암호화폐 폭락 등 시장의 폭탄은 계속 터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아직 직을 유지 중인 정 원장은 평소처럼 본원에 출근해 업무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내일'하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는 현재진행형이다.
"차기 후보가 거론되는 마당에 현직 원장의 말 한마디는 그것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시장에 큰 일이 터져도 대외 활동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금감원 관계자조차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라도 금감원이 무자본 특수법인인 이유를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9년 금감원이 정부 부처가 아닌 법인으로 출범한 이유, 정치에 휘둘리는 관치금융이나 각종 외풍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중립성에 입각한 금융감독을 하기 위함이다. 정권에 따라 수장이 바뀌고 조직 장악력을 위시한 임원 교체가 이어지고 금융감독 기조까지 뒤엎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