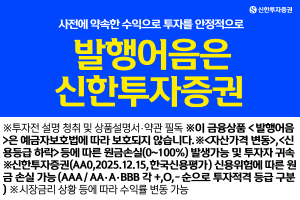연매출 1조5000억원을 올리며 국내 유통업의 한 축으로 성장한 소셜커머스는 6년전 발칙한 20대 청년들의 모험으로 시작됐다. 쿠팡·위메프·티몬 중 가장 먼저 출발을 알린 곳이 티몬이다. 티몬은 오늘(10일) 창립 6주년을 맞았다.
또래친구 4명과 함께 스물여섯 나이에 티몬을 창업한 신현성(사진) 대표는 2010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무실에서 온라인과 모바일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사업을 꿈꿨다. 첫 상품은 체코식 맥주전문점 캐슬프라하의 프리마토 맥주 4병과 수제 소시지. 창업멤버 5명이 석달간 발품을 팔아 따낸 첫 딜이다. 티몬은 원래 가격의 절반인 2만5000원에 캐슬프라하 쿠폰을 팔았다. 당시 판매한 쿠폰은 총 113장.
그 뒤 하루 한가지 상품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티몬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티몬은 창업 반년만인 그해 11월 누적 거래액이 100억원을 넘었고, 1년 뒤에는 월간 200억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지는 대표적인 소셜커머스로 성장했다. 특히 데이트 비용이 빠듯한 젊은층으로부터 인기가 많았다.
현재 티몬의 총 회원수는 1700만명이다. 우리 국민 3명중 1명 꼴로 티몬에 가입해있는 셈이다. 월평균 구매자수는 250만명으로 이들은 한달에 평균 10만원씩을 티몬에서 소비한다. 창립 이듬해(2011년)와 비교하면 구매자수는 5배 이상, 구매액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객이 모여들면서 매출도 껑충 뛰었다. 첫해 30억원대에 불과하던 매출은 지난해 2000억원을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매출구성도 초기엔 할인쿠폰 판매가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생필품(35%), 패션뷰티(18%), 여행(15%), 가전디지털(9%), 육아용품(8%) 등으로 다양해졌다.
특히 슈퍼마트가 티몬의 주력사업으로 급부상했다. 슈퍼마트는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생수나 화장지, 세제 등 생필품을 최저가에 공급하겠다며 티몬이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단순 중개에 그치지 않고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직접 상품을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못팔면 재고를 떠안게 되지만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티몬은 슈퍼마트를 통해 6개월만에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3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신현성 대표는 "티몬은 저연령층의 반값 할인채널을 넘어 이제는 삶과 밀접한 대부분의 상품을 빠르게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진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소셜커머스는 아직 내실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티몬만 하더라도 창업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슈퍼마트 사업 역시 아직은 수익성에 도움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티몬의 누적 손실액은 4000억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까먹는 구조로 몇년을 버텼다. 그사이 티몬의 주인은 미국의 소셜커머스 회사인 리빙소셜에서 그루폰으로, 다시 사모펀드인 KKR-앵커에퀴티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바뀌었다.
현재 티몬은 총 3억달러를 목표로 자금조달을 추진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NHN엔터테인먼트로부터 400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여섯살 생일을 맞은 티몬 앞에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입증할 숙제가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