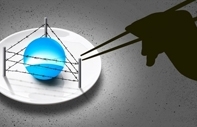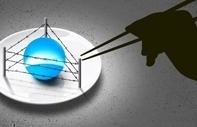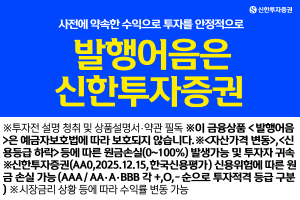우리은행 민영화의 다섯 번째 도전은 과연 성공할까. 연내에 뭔가 해보려는 정부의 의지도 확인됐고, 우리은행의 몸만들기도 순조롭다. 하지만 뭔가 산만한 분위기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매각 추진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어쩌면 헐값 매각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르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민영화 추진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봤다. [편집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분위기가 좋다고요? 19일 회의에서 논의해봐야 압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9일이요? 아닙니다. 이번 달에 일정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분위기가 좋다고요? 19일 회의에서 논의해봐야 압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9일이요? 아닙니다. 이번 달에 일정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다섯 번째 매각 공고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조속한 민영화를 위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은행이 '뛸(?)수록' 더 꽁꽁 싸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우리은행은 더욱 속이 타는 모습이다. 악순환이다.
심지어 매각 주최 측 내에서도 금융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말이 엇갈리기도 한다. 각 이해관계자가 제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자칫 매각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 이어지는 해명…드러나는 이해관계
우리은행 민영화는 이번 정부에서 지난 2014년 9월 첫 매각 공고를 냈다가 실패했다. 이후 1년 뒤인 지난해 7월 정부가 새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다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매각 일정과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내달 매각 공고가 날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정해진 게 없다"며 이를 공식 부인했다.
우리은행과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3주간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 여섯 번의 보도 해명 자료를 냈다. 짧은 기간에 여러 기관에서 같은 이슈로 해명 자료를 내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이목이 쏠리는 이슈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세 기관의 해명에는 모두 일각의 섣부른 '전망'을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뉘앙스는 조금씩 다르다. 조속한 민영화를 바라는 우리은행의 경우 "성공적인 민영화 추진을 저해하는 기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문구를 실었다. 금융위는 "세부 방안은 물론 잠정적인 방안도 정해진 게 없다"는 견해를 지속해 내놓고 있다.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매각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식 자료에서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부정되곤 한다. 지난 15일 한 공자위 관계자는 매각 방안과 논의를 위한 회의가 19일로 예정돼 있다고 했는데, 이후 정부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공자위 관계자는 매각 수요가 충분하다는 우리은행의 입장에 대해 '아직 모른다'며 입을 닫기도 했다.
◇ 조급한 우리은행…조심스러운 정부
이런 견해차는 각 기관이 처한 현실을 잘 드러낸다. 우리은행의 경우 민영화가 벌써 네 번이나 실패한 탓에 은행 경쟁력이 점차 악화하고 있다며 답답해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임기가 만료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경우 연임 이슈가 있어 민영화에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뤄야 하는 면도 있다. 이 행장이 직접 해외를 돌며 기업설명회(IR)를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로 해석된다.
반면 금융당국과 공자위의 경우 "매각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을 계속 내놓으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네 번의 실패에 이어 또다시 매각에 실패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또 정부 입장에선 공적자금 회수라는 원칙에서 자유롭기도 어려우므로 무작정 조기 민영화를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제삼자의 입장은 또 다르다. 금융 전문가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민영화를 주장하고 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등은 지난 15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국내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와 금융회사 민영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공적자금 회수에 얽매여 오히려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견해다.
◇ 매각 여건 바라보는 시선 제각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만큼이나 매각 성사 여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적절한 매각 시기와 매물에 대한 평가, 매각 수요 예측이 제각각이다.
일단 매각 시기에 대해선 올해가 이번 정권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임기를 마무리하기 1년 전쯤 마지막 공고를 낸 바 있다. 이후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영화 과제는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일각에선 매각 수요가 충분치 않은데 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가격을 낮춰서 팔지는 않으리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매물(우리은행)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우리은행 주가는 18일 현재 1만200원으로, 최근 들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실적도 좋은 편이다. 매각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여전히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목표주가(1만2980원)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매각 수요의 경우 우리은행 측에선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위나 공자위의 경우 '검토 중'이라는 견해만 내놓고 있다.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이에 대해 "얼마나 괜찮은 수요자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보통 이런 매각이 성공하는 사례를 보면,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협상이 진행된 뒤 '깜짝'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일련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 사이 어디엔가 꼬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서로 의견을 모아야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