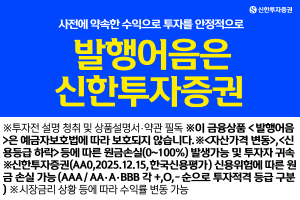케이뱅크의 NPL비율이 상승하면서 자산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NPL비율은 은행의 총여신 중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인데 지난해에 비해 크게 높아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단순 수치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NPL 비율이 높아진 것은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은행과 달리 부실채권 매각을 하지 않고 신규대출은 늘리지 못하면서 비율이 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 NPL비율 1년새 0.67%P 높아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케이뱅크의 지난 1분기말 NPL비율은 0.80%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0.12%보다 0.6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전분기보다도 0.13%포인트 올랐다.
케이뱅크 NPL비율 상승세는 국내 19개 은행 중에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1.01%포인트 상승)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13개 은행은 같은 기간 NPL 비율이 낮아졌고 씨티은행(0.15%P), 대구은행(0.08%P), 카카오뱅크(0.14%P) 등 일부은행은 높아졌지만 케이뱅크와 차이가 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케이뱅크가 부실채권 관리를 하지 못해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NPL비율 상승을 케이뱅크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연결해서는 안된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 "부실채권 규모 적고 매각안해 쌓였을 뿐"
우선 케이뱅크가 아직 부실채권 매각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부실채권이 쌓이면 건전성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이를 2금융권이나 추심업체 등에 매각한다. 만약 매각이 어렵다면 회계상 손실로 반영하고 장부에서 지워 건전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아직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하지 않았다. 부실채권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큰 위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18조5000억원이다. 케이뱅크의 부실채권 규모는 120억원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3월 10억원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하긴 했지만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올해 1분기에만 6182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을 진행했다. 은행 별로는 ▲NH농협 1942억원 ▲KB국민은행 1337억원 ▲KEB하나은행 1065억원 ▲우리은행 1012억원 ▲신한은행 826억원 순이다.
◇ 여신규모 정체도 원인.."증자 못해 대출 못하는게 더 문제"
케이뱅크 신규 여신이 늘어나지 못한 것도 NPL비율이 높아진 이유중 하나다.
총여신이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면서 NPL비율이 낮아질 수 있지만 현재 케이뱅크는 대주주적격성 이슈로 증자를 하지 못해 대출상품을 판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쟁사인 카카오뱅크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카카오뱅크 부실채권 규모는 174억원 규모로 케이뱅크보다 많지만, 1분기 NPL비율은 0.18%로 케이뱅크에 비해 크게 낮다.
이유는 전체 여신규모가 케이뱅크보다 많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케이뱅크 총 여신규모는 1조5000억원인데, 카카오뱅크는 9조7000억원으로 케이뱅크의 6배가 넘는다. 카카오뱅크도 부실채권 매각을 하지 않았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은행에서는 NPL비율이 중요한 건전성 지표겠지만 케이뱅크는 NPL 비율로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건전성보다는 증자가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