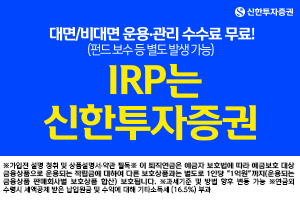'수조원대 기술이전 계약'이라는 기사 헤드라인보다 중요한 건, 그 내용 속에 담긴 실질입니다. 쏟아지는 '세계 최초'와 '혁신'의 홍수 속에서 포장을 걷어내고 바이오 산업의 민낯을 냉정하게 독해하려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바이오 문해력을 키워드리겠습니다.[편집자주]
"총 1조원 규모 기술이전(기술수출) 계약 체결"
보통 이러한 바이오 제약 기업의 대형 기술이전(License Out) 공시가 뜨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에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총 계약 규모가 곧 기업의 확정된 가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시된 숫자 뒤에 숨겨진 세부 조건, 즉 '계약의 질'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착시 효과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숫자에 속지 않는 법
통상적인 기술이전 계약은 '선급금(Upfront)'과 개발 단계별 성공 시 수령하는 '마일스톤(Milestone)', 상업화 이후 매출에 따라 받는 '경상 기술료(Royalty)'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기술 반환 시 선급금의 반환 의무 여부, 마일스톤 및 경상 기술료의 수령 조건 등 실제 계약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특히 천문학적인 '총계약 규모'는 유심히 뜯어봐야 합니다.
흔한 착시 중 하나는 총 계약 규모에 상업화 이후 매출에 따라 받는 '경상 기술료'의 미래 추정치를 합산하는 경우입니다. 아직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약물의 미래 매출을 가정하고, 이를 현재의 계약 규모에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공시상 규모는 커지지만, 실제 계약 금액 전체를 수령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집니다.
적응증(질환)을 늘리는 방식으로 규모가 부풀려지기도 합니다. 임상 1상을 진행 중인 비소세포폐암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이전 규모는 5000억원인데, 이를 유방암, 대장암, 위암으로 적응증을 확장할 경우까지 가정해 전체 계약 규모를 2조원으로 포장하는 식입니다.
공동개발 후 성과가 도출돼야 본계약이 발효되는 '옵션 딜(Option Deal)'은 특히 주의깊에 봐야 합니다. 지난해 6월 1조8000억원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공시한 에이비온이 이러한 예입니다. 계약 체결 후 7개월이 됐지만 선급금 수령 소식이 없습니다. 총 계약 규모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이론적 최대치에 불과합니다.
알테오젠 경상기술료 '2%'의 교훈
최근 알테오젠이 겪은 '경상기술료 2%' 논란은 계약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머크(MSD)의 키트루다SC 상업화 성공은 유한양행 렉라자에 이어 국산 신약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 안착한 쾌거입니다.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 실제 상업화 단계까지 도달해 경상 기술료를 수령하게 사례가 극히 드물었기에, 이번처럼 구체적인 요율이 쟁점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였습니다. 증권가는 경쟁사인 미국 할로자임과 유사한 4~5% 수준의 로열티를 예측했으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2% 수준임이 밝혀지며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의 잘못된 분석이 기업 가치에 과도하게 선반영되었던 셈입니다.
할로자임 수준의 경상 기술료 예측이 과도하다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할로자임은 파트너사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대신 높은 로열티를 챙기지만, 알테오젠은 '비독점' 계약을 통해 다수의 빅파마와 손을 잡는 플랫폼 확장 전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략이 다르기에 로열티 요율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시장은 이를 간과했습니다.
현금 유입·계약의 질 '검증'교훈은 명확합니다. '조 단위'라는 총액의 환상과 증권가의 장밋빛 추정 보다는 냉정한 '숫자'와 계약의 '실질'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팩트는 '현금 유입'입니다. 특히 선급금 규모는 기술이전 기대치가 반영돼 있기에 어느 수준인지 주목해야 합니다. 전체 총액 대비 선급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거나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선급금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급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다음 분기보고서의 현금흐름표를 통해 실제 계약금이 입금되었는지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실체 확인은 필수입니다. 자금력도, 연구 능력도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기술을 넘기고, 선급금 한 푼 없이 총계약 규모만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술수출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싼 '주가 부양용 꼼수'이자 투자자를 기만하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설령 파트너사가 실체가 있다 해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당장이라도 상업화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자금 부족이나 전략 부재를 이유로 수년째 임상 진척 없이 장부상에만 방치된 '식물 파이프라인'도 부지기수입니다. 기술이전이 곧 신약 개발의 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물론 국내 바이오텍은 물론 대형 제약사조차 글로벌 임상 3상과 상업화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따라서 글로벌 빅파마에의 기술이전은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자 성장의 발판인 것은 분명합니다. 존슨앤드존슨과 협력해 블록버스터 신약 '렉라자'를 개발한 유한양행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술이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총 계약 규모라는 헤드라인보다 중요한 것은 선급금의 규모, 로열티의 조건, 그리고 파트너사가 끝까지 임상을 완주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실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