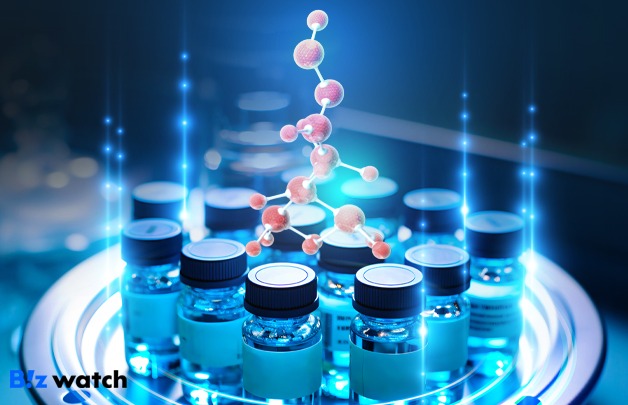코스닥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서 한때 시장을 호령했던 1세대 바이오테크 기업의 증시 퇴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진입 장벽은 낮추고 퇴출은 신속하게 한다는 금융당국의 '다산다사(多産多死)' 정책기조에 맞물려 이러한 흐름은 올해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다만 이는 국내 바이오산업이 성숙하기 위한 필연적인 체질 개선이라는 업계의 시각이다. 경쟁력 없는 기업의 퇴출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분석이다.
혁신 기술의 몰락…파멥신·인트로메딕
항체신약개발기업 파멥신은 지난 16일부터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26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을 거친 후 27일 코스닥에서 퇴출된다.
2008년 설립돼 2018년 국내 코스닥에 상장한 파멥신은 국내에서 차세대 신약인 항체 치료제 개발을 주도하며 주목받았다. 특히 대표적 난치병인 교모세포종 신약의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며 한때 시총이 6000억원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가 지지부진한데다 상장 이후 실적 가시화가 늦어지면서 매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후 경영권 분쟁과 자본조달 실패 등이 겹치면서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인트로메딕 역시 지난 15일부터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했다. 7일간의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파멥신보다 하루 먼저 코스닥에서 퇴출된다.
2004년 설립된 인트로메딕은 알약 형태의 '캡슐형 내시경'을 상용화하며 의료기기 분야의 혁신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2013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꿨으나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과 자금난으로 인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신뢰에 타격을 입은 끝에 증시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두 회사 모두 거래정지 직전 시총이 2000억원을 상회했으나 지난 1월 19일 종가 기준 파멥신은 171억원, 인트로메딕은 27억원까지 내려앉았다.
가처분 신청으로 '배수의 진' 쳤지만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진행중인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 기업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고 있으나, 강경한 정책기조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과거보다 신속하게 내려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이노스메드는 1월 초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와 정리매매가 결정됐으나 회사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에이즈 치료제를 중국에 기술수출하고 신약허가와 상용화까지 이끌어냈으며 국내 기술로 난치성 질환인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에 도전했던 기업이다.
하지만 주력 파이프라인인 파킨슨병 치료제 임상 중단과, 자본잠식과 법차손 누적에 따른 재무 안정성 훼손, 매출 요건 미달로 인한 주된 영업 지속성 부족이 겹치면서 거래소는 퇴출을 결정했다.
피씨엘, 이원다이애그노믹스, 엔케이맥스, 올리패스도 상황은 비슷하다. 진단과 신약개발 분야에서 각기 기술력을 자랑했으나, 그 성과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거래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현재 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버티고 있다.
이 외에도 셀레스트라, 이오플로우 등도 현재 거래 정지 상태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묻는 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이오플로우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으로 대형 M&A까지 추진됐으나 경쟁기업과의 특허침해 소송 패소에 따른 결과로 상장폐지까지 내몰리게 됐다.
'바이오 생태계 재편' 가속화 전망
이러한 무더기 퇴출 위기는 정부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에 따라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거래소는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특례로 상장했던 기업들의 '재무 요건 유예기간(5년)'이 대거 만료되는 시점과 겹치면서 다수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코스닥 상장 유지의 핵심 안전판인 시가총액 기준이 종전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강화됐으며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 역시 올해까지는 30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50억원, 75억원, 100억원으로 매년 상향 조정된다.
이제 '기술 스토리'만으로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다만 R&D 업종 특성상 단기 매출 기준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임상 기대감만으로도 상장 유지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매출과 투명한 경영 구조가 담보돼야 한다"며 "현재의 진통은 K-바이오 생태계가 기술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옥석 가리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