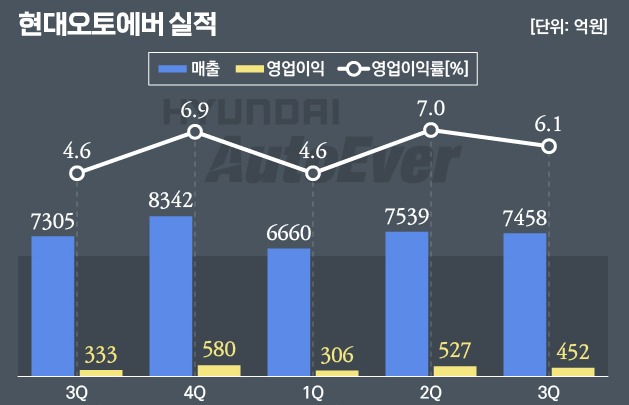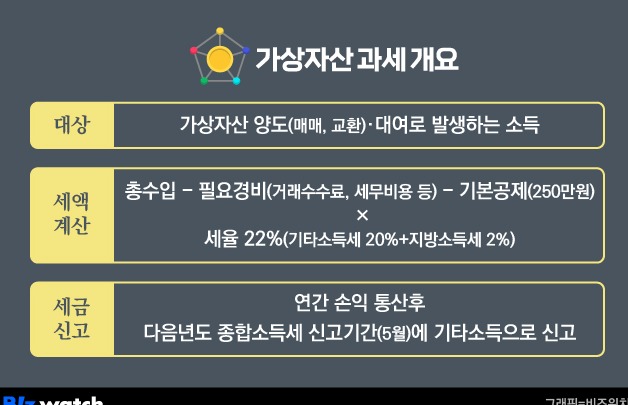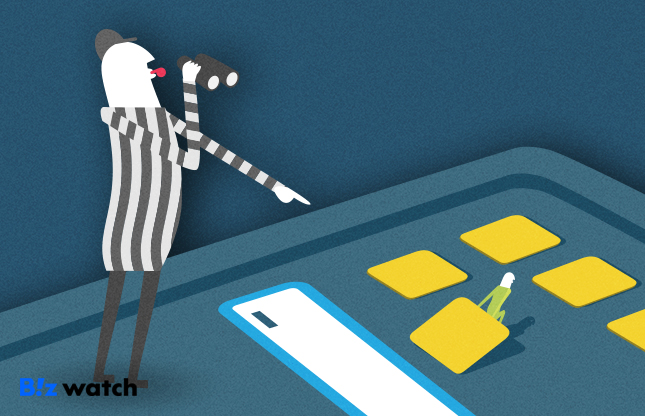
최근 정부의 잇따른 전산망 오류를 계기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아울러 전산망을 통합관리하는 전문가의 부재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난 6월 과기정통부 입장보다 더 나아간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정부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과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제한했다. 국방, 외교, 전력 등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 가운데 대기업이 참여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일례로 현재 교육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4세대 NEIS 개발 당시 교육부는 대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NEIS는 중견기업인 쌍용정보통신이 컨소시엄을 꾸려 개발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원래 취지와 다르게 쪼개기 발주부터 사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SW 운영 부실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규모 서버나 전산망 운영 경험, 망 유지 비용 투입, 인력 운용 등에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IT업계 관계자는 "하나의 업체가 리드하면서 책임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대기업 참여 제한으로 인해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건들이 많아졌다"며 "전산망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처 내 전문가가 없는 구조도 문제다"고 말했다.
정부는 52개 부처, 1400개에 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역할인 최고정보기술책임자(CIO, Chie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등의 전문가가 없다. 이번 사태와 같이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정부 시스템 구축과 운영,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의 사실상 전 과정을 민간에 맡기고 있다는 점도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거론된다. 각 부처는 시스템이 잘 운영되는지 정도만 모니터링을 한다.
개인정보전문가협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이런 사고는 얼마나 문제를 빨리 찾고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되지 않아 대표적인 디지털 재난으로 볼 수 있다"며 "컨트롤 타워를 세우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꼭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무조건 막으면서 시작하는 건 옳지 않다"며 "초대형 사업의 경우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참여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배우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협력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