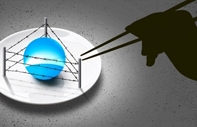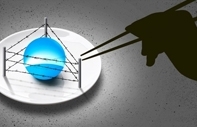"지분의 과반이 외국에 있으면 토종은행이 아니다. 우리은행에 수수료를 내면 88%가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다른 은행에 내면 외국인 지분만큼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
꼭 1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황영기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현 금융투자협회장)이 꺼내든 '토종은행론'입니다. 왜 갑자기 10년 전 얘기를 하느냐고요?
'우리나라 우리은행'때문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4년여 동안 썼던 이 CI를 최근 바꿨습니다. 우리은행 본관 입구의 간판에 오랫동안 익숙했던 '우리나라'라는 글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대신 우리은행 옆에는 그 외로움을 달래주려는 듯 영문명인 'WOORI BANK'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더군요.

| ▲ 사진 위쪽부터 우리은행 본관의 새로운 간판 모습과 지난해 11월 기존 CI를 적용한 '우리나라 우리은행' 간판 모습(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관을 시작으로 간판 교체 작업 진행 중. |
◇ 10년전 외쳤던 토종은행론 이은 우리나라 대표은행
작은 변화이지만, 우리은행이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를 뜻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은 사실 토종은행론의 연장선에 있기도 합니다.
황 전 행장이 당시 토종은행론을 꺼내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에 넘겨서는 안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영업인데요. 증권 출신의 공격적인 영업성향을 지닌 황 전 행장은 곰곰히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3위 정도의 시장점유율에 머물러 있는 우리은행의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을요. 그렇게 탄생한 게 토종은행론입니다.
당시 우리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11.5%로 경쟁사인 국민은행 86%, 신한지주 60% 하나금융 72%. 다른 국내은행은 엄밀히 따지면 국내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이든 기업이든 결국 다른 은행과 거래하면 그로 인한 이득이 배당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만, 우리은행만은 국내에서 돈이 선순환된다는 논리입니다. 우리은행을 이용해야 우리은행도 살고, 나라도 산다?. 명분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은행' 역시 토종은행의 세련된 버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토종은행은 실제로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은행들의 반발은 물론이겠지요. 어쨋든 결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애국심 마케팅의 실패사례는 흔치 않으니까요.
◇ 새로운 패러타임 '글로벌'
지난 2011년부터 썼던 우리나라 우리은행은 우리나라 대표은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애국심 마케팅을 좀 더 활용하면서도 거부감없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로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렸을까요.
그 답은 '글로벌'에 있습니다. 어차피 국내시장이 포화된 것은 다 아는 바. 지금의 화두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은행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겠죠.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 국내은행 처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200호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3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강조하는 것이 더이상 무의해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수도 있을 겁니다. 이 행장은 지금 해외 기업설명회(IR)중인데요. 장장 11일간 30여 곳의 투자자를 만납니다.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죠. 벌써부터 우리은행은 이 행장 출국과 함께 외국인지분율이 21.28%(15일)에서 21.75%(25일)로 올랐다고 야단입니다.
이 행장은 취임 이후 줄곧 민영화에 집중했습니다. 정부가 지분 일부를 중동 국부펀드에 팔려고도 했지만 지금은 수포로 돌아간 모양새고요. 주가가 8000원 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민영화의 '민'자도 꺼내기 힘듭니다. 주가를 높이고 민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절실해졌습니다. 10년 전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네요.
'우리나라' 대신에 'WOORI BANK'를 선택한 이유엔 이런 절심함도 묻어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