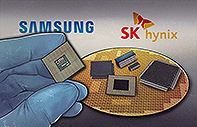낸드플래시 기업인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디지털 간 합병 추진은 양국 반도체 산업간 협력의 공고함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부활’ 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한국입장에선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과 일본,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나
업계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부활의 키는 사실상 미국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여년 전까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주도해온 일본이 쇠퇴한 배경이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을 견제한 미국이 일본 메모리 내수 시장의 20%를 외국 기업에 할당하도록 했고, 이를 틈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업은 일본이 차세대 반도체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5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반도체 협력 기본원칙’에 합의한 후 일본은 외교력을 총동원해 동맹 저변을 넓히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엔 유럽연합(EU)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와 반도체 분야 협력각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전도 펼쳤습니다. 10년 이상 자국서 반도체를 생산하면 국적과 관계없이 기업 설비 투자의 최대 3분의 1을 지원한다는 정책이 매력적이었죠. 그 결과 미국 마이크론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일본에 공장을 짓거나 지을 예정입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외교적·경제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는 배경은 지난 2021년 6월 발표한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이 근간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2조엔(약 18조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관련 매출을 당시로부터 3배인 15조엔(약 135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에 3조4000억엔(약 30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집니다.
3배 큰 비메모리 시장…중장기 계획 세워야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들의 전략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점하면서도 장기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메모리 시장에 국한된 비즈니스 모델로는 위기에 취약할 수 있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대비 3배 가까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 분야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이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향한 중국의 물량 공세와 일본의 공격적 투자에 맞물려 더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선 1나노 혹은 2나노 등 극한의 기술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총 6000억달러(약 780조원) 가량입니다. 이중 메모리 비중이 23.88%, 비메모리 비중은 76.12% 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메모리의 약 3배 수준입니다.
국가별로 살폈을 때, 한국의 비메모리 점유율은 3.3%로 시장 내 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인데요. 메모리 분야인 D램과 낸드 시장 점유율이 각각 70%, 50%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비메모리 시장 진출을 위해선 국가적 차원의 전략 수립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비메모리 시장은 메모리 시장과 특성이 판이합니다. 때문에 목표 대상을 설정하고 해당 분야의 실력을 키운 후 네트워크 형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 중론입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시스템반도체 담당)은 “비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성이 높은 메모리와 달리 투입되는 수요산업과 제품별로 각 소자의 용도·특성·구성요소가 완전히 다르다”며 “속도나 수율 등 메모리 반도체를 다뤄온 정형화된 접근 방식만으로는 시장 공략에 한계가 분명할 것이기에 국가적 전략 수립 및 해당 전략에 기반한 중장기 관점의 자원 배분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시리즈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