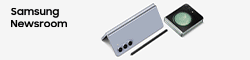내년 3월을 5G 상용화 시점으로 잡은 정부가 조만간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를 계기로 통신사들의 본격적인 투자 집행이 시작, 5G 서비스를 향한 발걸음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5G 주파수 경매와 관련, 사전에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을 짚어보고 경매 특징과 장비 시장 이슈 등을 점검해봤다. [편집자]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식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초연결·초고속·초저지연이 특징인 5G 인프라를 활용하면 자율주행차·증강현실(AR) 등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어 적정한 주파수를 선점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하는 주파수를 선점해도 지나친 경매 대가를 내게 된다면 비용 부담으로 인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어 이통사들의 고민이 깊다.
정부도 속내가 복잡하다. 주파수 경매 낙찰가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를 만회하려는 이통사들의 투자 위축이나 통신비 인상 움직임에 직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너무 낮으면 헐값에 넘겼다는 지적에 시달리게 된다.
◇ '승자의 저주'를 피하라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3.5기가헤르츠(㎓), 28㎓ 등 5G 주파수 경매 관련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5월 공고에 나선 뒤 오늘 6월 실제 경매에 돌입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4월11~12일 사이 초안이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2011년, 2013년, 2016년 국내에서 진행된 주파수 경매는 동시오름과 밀봉입찰이 쓰였는데, 무기명 블록 경매 방식은 사용된 바 없다. 동시오름은 여러 라운드를 거쳐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고, 밀봉 입찰은 말 그대로 비공개로 금액을 써내고 최고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들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방안들도 모색된다. 2011년 첫 경매 낙찰가는 모두 1조6615억원, 2013년은 2조4289억원이었으며, 2016년의 경우 2조1056억원에 달했다. 과거 사례에 비춰 올해 낙찰가는 최대 10조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경매 방식의 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무기명 블록경매' 도입될까
이에 따라 업계에선 '무기명(generic) 블록(block) 경매 방식'의 도입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기명 블록 경매는 정부가 경매 대역과 블록 수만 정하고, 이통사들이 필요한 양과 위치를 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통사의 선택권이 일정 부분 보장되지만,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매에 나올 주파수를 보면 3.5㎓의 경우 넓은 커버리지를 가지므로 전국망 구축을 위해 접전이 예상되며, 속도를 올리는 역할을 할 28㎓도 초고속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사업자라면 놓쳐선 안 되는 영역이다.
이런 까닭에 업계에선 블록을 나누는 정도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주파수 대역폭을 잘게 나눠 경쟁해야 한다는 쪽이 있는가 하면, 크게 나눠 동등하게 나누자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방식은 전혀 없는데 이통사들이 자사에 유리한 방안을 흘리는 것"이라고 일축하면서도 "무기명 블록경매 방식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경매 방식을 결정하기 전까지 이통사들은 저마다 주판알을 굴려 자사에 유리한 방안을 물밑에서 제기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