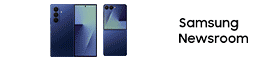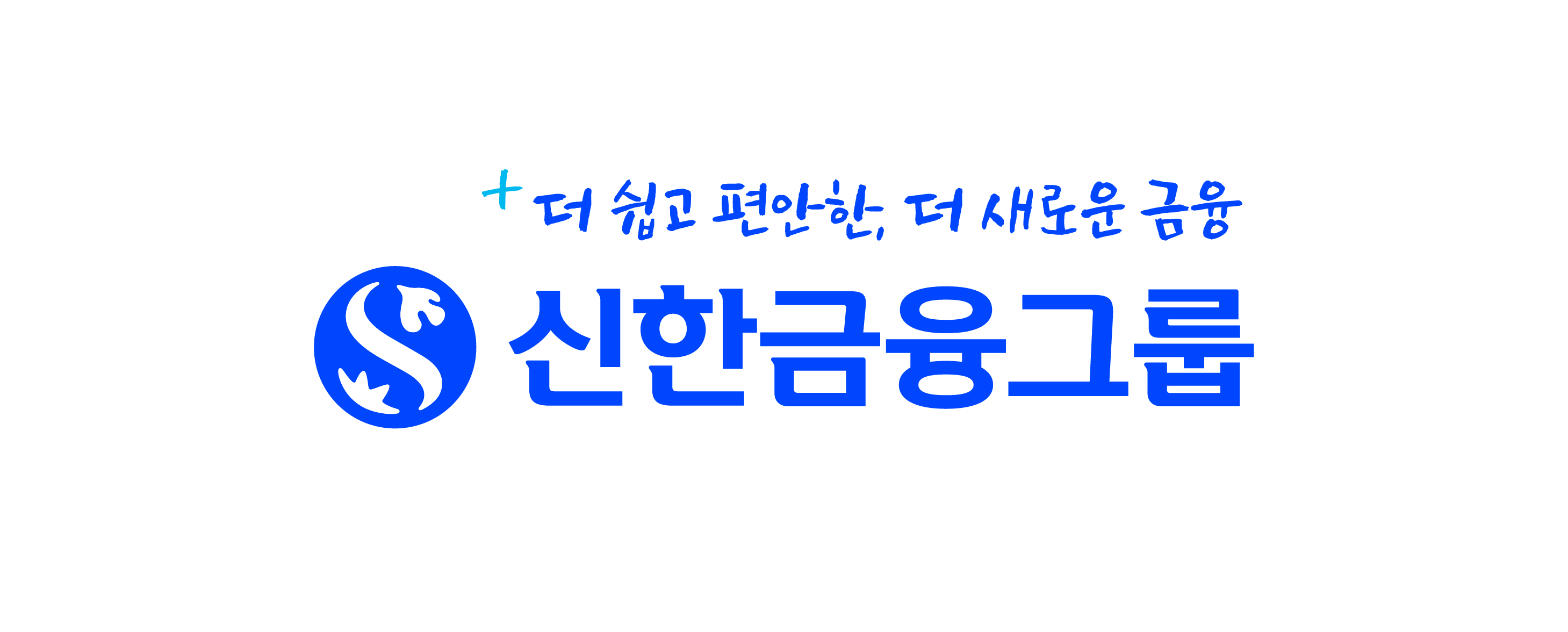[생활의 발견]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들을 다룹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곁에 늘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그 뒷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생활의 발견]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인싸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편집자]
얼마 전 호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에서 쇼핑을 빠뜨릴 수 없죠. 한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들렀습니다. 그중 한 브랜드 매장에서 기존에 찾아둔 상품이 매장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판매직원이 없는 겁니다. 잠시 자리를 비웠나 싶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옆 매장에도 직원이 없어서 소비자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직원이 없나' 생각하며 매장에서 나가려는 순간, 한 직원이 매장으로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덕분에 다행히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 직원은 건너편에 있는 A매장에 가서 손님을 응대하고, B매장으로 넘어갔습니다. 해외에서 이런 광경을 본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 년 전 미국 내 백화점에서도 직원 한 명이 여러 매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미국, 유럽 등 해외 백화점에는 한 브랜드 매장에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여러 브랜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객을 응대하곤 합니다. 브랜드 매장마다 판매직원이 상주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우리나라 백화점의 모습과 사뭇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된 걸까요. 이번 [생활의 발견]에서는 국내와 해외 백화점들의 운영방식 차이와 그 배경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
직매입의 자유
백화점은 여러 종류의 상품을 부문별로 진열해 판매하는 대규모의 소매점을 말합니다. 이처럼 백화점은 '많은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라는 의미에서 한자 '일백 백(百)을 씁니다. 고객을 불러모으기 위해선 공간에 상품을 채워야겠죠.
백화점이 상품을 들여놓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백화점이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는 직매입 방식과 브랜드사에서 입점수수료를 받고 매장을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직매입은 백화점이 어음이나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재고 관리, 가격 결정까지 하는 거래형태입니다. 백화점이 직매입을 할 경우, 매장 직원도 백화점이 직접 고용해야겠죠. 직원을 많이 배치할수록 백화점 입장에선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매장별 고정 인력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고객이 원할 때만 직원이 다가가도록 하는 서비스 방식을 반영하게 된 배경입니다.

해외 백화점은 주로 패션, 뷰티, 가전, 홈 리빙 등의 카테고리는 직매입하고 명품 브랜드를 임대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상품을 직매입 하더라도 일부 고급 브랜드나 특정 패션·화장품 브랜드는 임대 형태로 입점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임대 매장 비중이 큽니다. 대략 거래형태의 70~80%가 특정 매입이고, 직매입은 20~30%가량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브랜드 매장에는 각자 고용한 매장 직원이 근무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이 상주하며 고객에게 보다 밀착해 응대할 수 있습니다.
뭐가 더 좋을까
해외 백화점에선 고객이 직접 쇼핑하는 셀프 서비스 문화가 강합니다. 특히 패션, 화장품 등의 매장에서는 고객이 직접 제품을 보고 고른 후, 필요하면 직원에게 문의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직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응대하면 오히려 부담을 느끼는 고객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에서는 판매 직원 수를 줄이는 대신 전자 태그, QR 코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 매장에는 브랜드 직원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VIP 서비스와 보안 문제 때문에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해서죠. 반면 국내 백화점의 임대방식은 브랜드가 직접 개별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고, 고객에게 보다 친밀한 응대가 가능합니다. 고객 입장에선 빠른 응대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같은 백화점의 운영방식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처럼 판매직원을 드문드문 배치하다면 컴플레인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는 게 백화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직매입 방식은 유통채널이 대대적인 세일을 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만들었습니다. 백화점은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재고를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할인 폭을 키워 어떻게든 '판매'하는 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할인율이 90%인 상품을 볼 수 있는 배경입니다.
반면 국내 백화점에 입점한 브랜드사들은 입점수수료를 내고 인건비까지 들인 만큼, 마진을 남기려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할인폭을 직매입 상품보다 제한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매입 안 하는 이유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 백화점들은 상품을 직매입하지 않을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매입 방식은 백화점이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는 구조라서 재고 관리 및 소진에 대한 리스크가 큽니다. 임대 방식은 브랜드가 직접 재고를 관리하고 판매를 책임지므로, 백화점은 매출 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특히 패션·뷰티 업계처럼 유행 변화가 빠른 제품들은 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직매입을 기피하기도 하고요.
국내 백화점 업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격 결정권을 갖길 희망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서 백화점의 직매입보다 입점을 통한 직접 판매·관리를 선호한다는 겁니다. 브랜드사가 백화점 매장 외에도 가두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백화점 판매가격이 가두점보다 저렴할 경우 가두점과 본사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월 상품 대전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백화점이 한 패션 브랜드의 상품을 직매입해서 70% 이상 할인해 판매하면 해당 패션브랜드의 가두점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백화점들도 직매입 방식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이 있긴 합니다. 각 백화점들마다 보유한 편집숍들이 대표적인데요. 롯데백화점은 '엘리든', 신세계백화점은 '분더샵', 현대백화점은 '피어' 등을 각각 운영 중입니다. 이외에 식품 코너 역시 직매입 상품을 취급해서 점포 종료시간이 다가오면 마감세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팬데믹 당시 백화점 업태에 대한 국내외 상황은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일부 백화점은 파산 위기에 처하기도 했고요. 반면 우리나라 백화점들의 일부 점포들은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이 오프라인의 묘미가 아닐까요. 개인의 취향이 세밀해지는 '나노사회'에서 매장직원의 빠른 응대가 백화점들의 상황의 차이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