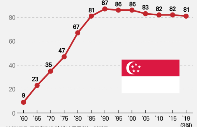[뮌헨·암스테르담=원정희 노명현 배민주 기자] #1. 달라도 너무 달랐다.
"주거정책은 그 나라의 역사·문화·경제 등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남의집살이가 힘겨운 한국.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한 해외 임대주택 취재. 아이템을 확정하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다.
열흘 간 독일 뮌헨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임차제도와 임대주택을 취재한 결과도 실제 그랬다. 특히 이들 유럽국가들은 산업화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주거정책 역시 그러했고 그 속엔 그들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산업화 과정 등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그들은 2년마다 이사를 다니거나 혹은 이사를 가야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우리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사회주택이 좌파 노동운동을 통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모습 등도 이질감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기억 남는다.
마음이 무거웠다. 취재는 잘 끝났지만 이를 어떻게 기사로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때문이다.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생각보다 컸다.
#2. 사람 사는 세상 크게 다르지 않더라.
취재팀은 인터뷰 이후 해가 지지 않는 밤(저녁 9~10시 일몰)을 탓하며 맥주를 마셨다. 인터뷰를 여러번 곱씹어봤다. 괴리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사택과 대학의 기숙사도 사회주택"이라고 언급한 것이나 "당신들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는 강력한 공공임대 공급 툴이 있지 않느냐"는 그들의 얘기는 '실마리' 혹은 작게나마 그들과 우리간에 '연결고리'가 돼 주었다.
출발선과 깊이는 한참 차이났지만 소셜믹스에 대한 그들의 고민, 대부분의 대도시가 그러하듯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과 그로인한 집값 및 임대료 상승이란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으론 사람 사는 세상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의미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글을 시작했다.

#3. 집은 사는 것(Living)이다.
취재팀이 가장 주목한 것은 '집'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다.
인터뷰 당시 "집을 뜯어 먹고(eating) 살 것도 아니고, (집을 보유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임대가 훨씬 자유롭다"고 얘기한 암스테르담 사회주택 거주자 알렉산더 채플린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집을 뜯어먹고 살고 있는 듯 하다.
그들과 우리가 출발이 다르다는 데는 이런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네덜란드 역시 암스테르담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시장의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 모기지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비용과 크게 차이나지 않자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짙어진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의집살이가 너무 힘겨워 어떡하든 내집을 마련하려 하고, 이것이 일생일대의 숙제가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는 차이가 난다. 네덜란드는 여전히 열집 중 세집 혹은 네집은 사회주택에 거주한다.
자가보다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많은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본인 소유의 집이 없어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것이 집을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보는 데서 출발한 것인지 혹은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4. "주거안정은 권리"라고 당당히 외치는 그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내가 가진 하나의 권리다."(사회주택 거주자 알렉산더 채플린)
"만약 한국의 상황처럼 독일에서도 2년마다 가격(임대료)을 올리면 임차인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독일 정부의 임차인 보호 노력이 실제로 작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통해 거주공간(사회주택)을 제공한다."(프랑크푸르트 민간임대 거주자 커스틴)
각각 네덜란드 사회주택과 독일의 민간임대에 거주하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다.
그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는 것을 하나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도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보장받고 있는 듯 했다.
신혼부부나 20~30대 청년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학생이나 취준생(취업준비생)들이 고시원이나 원룸을 전전하며 힘겹게 사는 우리나라의 모습과는 대조된다.
암스테르담에서 통역을 해준 김규희 통역사(35) 역시 사회주택에 거주한다. 암스테르담에 거주한지 4년이 됐고 대학에서 난민주거를 연구하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하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다.

#5.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 가장 어려운 숙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이라는 가치를 늘 강조한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이렇게 외친들 시장에선 이미 '집은 사는(buy) 것(혹은 투자대상)'이 돼 버렸다.
어떡하든 사지 않으면 그야말로 '헬 조선'에 빠져든다. 재산증식에서도 철저히 소외된다.
이러니 '왜 집을 사느냐(투자)'고 꾸짖을게 아니라 정책입안자로서 내 집이 아니라 남의 집에 살더라도 마음편히 살 수 있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만족스러운 '남의집살이'를 만들어주는게 먼저다.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말로 되는 게 결코 아니다. 암스테르담 사회주택협회인 '아이겐 하르드'의 빔 더 바르 커뮤니케이션 대표는 협회가 110년간 이어온 비결에 대해 "장기계획을 세우고 20~30년 미래를 바라본다. 그러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주택의 질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5년 마다 혹은 그보다 더 빨리 바뀌는 우리의 정책으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시작은 여기서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