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질긴 인연이다. 1997년 외환위기가 맺어준 20년에 걸친 오랜 인연에 마침표를 찍은 줄로만 알았던 둘이 한 달 만에 재회했다. 겉으로만 헤어진 것처럼 보였을 뿐 속으로는 짜고 친 것인지, 아니면 찢어지자니 미련이 남았던 것인지 정확한 이유를 알 도리는 없다. 코오롱과 하나금융 얘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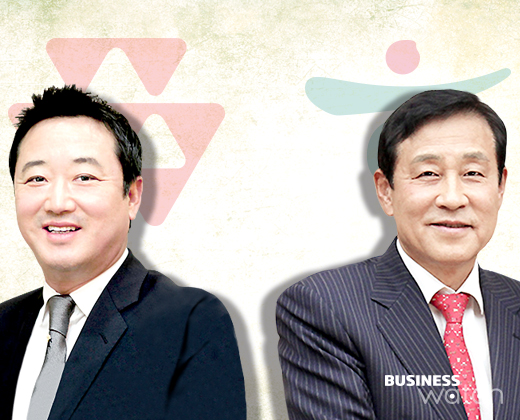
| ▲ 이웅열 코오롱 회장(왼쪽).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
◇ ‘자금줄’ 단자사 차린 코오롱
1973년 6월, 코오롱은 두산과 합작으로 ‘한양투자금융’이란 단자회사(短資會社)를 차렸다. 단기어음 발행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특성상 단자회사가 재벌들에게 매력적인 자금줄로 주목받던 시기다.
단자회사는 1982년 7월 정부의 설립 자유화 조치 이후로는 춘추전국시대를 맞았다. 서울 13개사(1982년 말) 등 전국적으로 30개에 가까이 영업 중일 정도였다. 재벌들의 진출도 더욱 가속화됐다. 1982년 10월에는 LG도 뛰어들었는데, 당시 만들어진 게 ‘금성투자금융’이다.
이렇듯 단자시장의 난립을 지켜보던 정부가 손을 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 1990년 금융시장 개방 추세에 맞춰 국내 금융산업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단자회사 정리에 나섰다. 1991년 들어 서울소재 16개 단자사들을 대상으로 업종전환을 추진 한 게 시작이다.
이 무렵인 1991년 9월 보람은행이 출범했다. 바로 한양투자금융과 금성투자금융이 합병을 통해 전환한 은행이다. 당시 이동찬 코오롱 회장, 구자경 LG 회장, 박용곤 전 두산 회장이 창립 주역이다.
보람은행은 초창기 3개 그룹이 각각 8~9%의 비슷한 지분을 소유했다. 또한 행장은 전문경영인에 맡겼지만 이사회 회장 자리는 3개 그룹 회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맡을 정도로 재벌그룹 은행의 성격이 강했다.
◇ 20년 전, 외환위기서 비롯된 인연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난(國難)’이었다. 아무리 ‘대마불사(大馬不死)’로 통했다고는 하지만 재벌들이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대우, 새한, 쌍용, 진로, 해태, 동아, 한일, 극동, 갑을, 삼미 등 영구불변할 것만 같던 그룹들이 줄줄이 쓰러졌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대혼돈 앞에서 대기업들이 힘없이 나가떨어지자 자금을 댔던 은행들이 무사할리 없었다. ‘조한제상서’(조흥·한일·제일·상업·서울) 5대 시중은행 중 제일과 서울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지정됐고, 정부 주도로 시중은행들에 대한 매각 및 통폐합 작업이 이뤄졌다.
코오롱과 하나금융과의 인연의 시작은 이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업·한일은행(합병 ‘한빛은행’)에 이어 하나·보람은행 합병으로 통합 ‘하나은행’이 출범한 게 1999년 1월의 일이다.
코오롱의 하나은행에 대한 애착은 변함이 없었다. 통합 뒤에도 하나은행의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다. 2002년 11월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변함없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있다.
하지만 코오롱은 2004년 12월 하나은행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코오롱을 비롯한 5개 계열사들이 소유한 하나은행 지분 2.8%(536만주)를 1340억원에 전량 매각한 것. 이는 금융 계열사 코오롱캐피탈(현 하나캐피탈)과도 맞닿아있다.
코오롱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나섰지만 2004년 들어 상황이 썩 좋지 않았다. 파업과 화섬경기 침체로 영업악화에 시달렸다. 2004년 8월 부실 할부금융업체인 코오롱캐피탈의 지분 15%를 하나은행에 넘기고 위탁경영을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 시기 코오롱캐피탈에 단일 금융회사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이 위탁경영에 들어간 뒤 자산실사 과정에서 임원의 473억원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파업과 업황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와중에 코오롱캐피탈의 대형 횡령사고로 인해 이른 보전해 줄 수 밖에 없었던 코오롱으로서는 하나은행 지분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던 것이다.

◇ ‘캐피탈’ 매각자금 대부분 하나금융으로
2005년 8월 코오롱캐피탈의 경영권은 지분 50.1% 확보한 하나금융지주에 넘어갔다. 그렇다고 코오롱이 완전히 손을 턴 것은 아니었다. 엄연히 지분 49.9%를 가진 2대주주로 남았다. 비록 하나은행 지분은 정리했지만 하나캐피탈을 매개로 하나금융과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됐던 셈이다.
하나금융과의 20년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던 것은 지난달 초. 코오롱이 코오롱캐피탈 지분 49.9%(보통주 722만주·우선주 99만7000주)를 3150억원(주당 3만8320원)을 주고 하나금융지주에 넘긴 것이다.
2005년 8월 하나금융에 경영권을 넘긴 뒤 갖고 있던 것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지분 42.06%·매각금액 2660억원), 코오롱글로텍(4.22%·266억원), 코오롱글로벌(1.36%·86억원) 3개 계열주주사 외에도 이웅열 회장의 지분 2.22%(보통주 23만7266주·우선주 12만9419주·141억원)도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알고보니 코오롱인더스리가 하나캐피탈 지분을 매각한 자금은 대부분 하나금융으로 다시 흘러가게 돼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6일 하나금융지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18년 3월8일 2000억원(주당 4만7187원)을 출자키로 했다.
코오롱이 출자를 완료하면 하나금융지주 지분 1.41%(429만주)를 확보한다. 금융협력 등 하나금융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게 위한 것이라는 게 코오롱의 설명이다. 길게는 선대(先代)에서 시작한 금융업을 기반으로 외환위기가 맺어준 코오롱과 하나금융의 인연이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