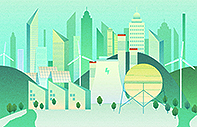영풍의 환경개선 충당부채가 연간 목표액의 절반에 못미치며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실제 집행해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영풍이 환경개선 충당부채로 쌓은 금액은 390억원이었다. 2023년 853억원과 견줘보면 1년새 54.2% 줄었다.

구체적으로 오염물질 반출을 염두에 두고 늘린 충당부채는 349억원을, 토지정화 충당부채 증가분은 4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주변하천 복구 목적 충당부채 적립액은 9076만원이었다. 특히 지하수정화 충당부채 증가액은 전무했다. 과거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적발돼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추가로 쌓아두지 않은 것이다.
영풍이 외부에 공표하는 환경개선 투자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재무제표상 '충당부채' 항목이 유일하다. 충당부채는 지출하는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출 자체는 확실한 비용을 미리 추산해 쌓아놓은 부채를 뜻한다. 이를 적립하는 만큼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환경개선에 얼마나 지출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영풍은 17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당시 영풍은 적자 발생 원인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지목하며 "2021년부터 약 700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 혁신 계획을 수립해 매년 1000억원 이상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부터 토지 정화, 주변하천 복구, 오염물질 반출, 지하수 정화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부채로 쌓기 시작했는데 △2020년 609억원 △2021년 806억원 △2022년 1036억원 △2023년 853억원 △2024년 390억원으로 합산하면 총 3694억원이다. 연평균 환산액은 739억원으로 해마다 1000억원 넘게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설명과 다르다.
환경개선 충당부채 논란은 지난해 하반기 9월 말까지 설정한 충당부채가 1억원에 그치면서 한차례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매년 충당금으로 설정한 비용 외에도 투자 및 비용, 운영비 등을 통해 약 1000억원을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기존에 구축한 설비인 무방류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비용도 투자금으로 분류한 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논란도 여전하다. 일반적으로 정화, 복구 등에 자금을 투입한 경우 재무제표상 충당부채 사용(환입)으로 인식하는데 영풍은 첫 환경개선 충당부채 설정 이듬해인 2021년부터 사용에 나섰다.
지난해의 경우 토지정화 충당부채 249억원, 반출 충당부채 123억원, 지하수 정화 충당부채 14억원 등 386억원을 사용했다. 최근 4년간 누적으로 쓴 금액이 1148억원으로 연평균 287억원에 그치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소극적으로 집행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영풍의 환경분야 투자가 부실한 탓에 일각에서는 당국이 석포제련소를 겨냥해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영풍은 오는 6월 말까지 토양정화명령을 이행해야 하지만 이행률이 미흡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은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왜 적게 쌓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환경개선 설비를 운영하는 비용까지 투자금으로 본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충당부채는 실제 사용한 비용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추정해 회계상 반영하는 항목일 뿐"이라며 "이를 환경개선 투자 규모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했다.
회계상 인식한 충당부채 외에도 투자, 비용, 운영비 등을 포함해 매년 약 1000억원을 환경개선에 실제 사용하고 있다며 투자는 재무상태표, 비용 및 운영비는 포괄손익계산서에 각각 반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