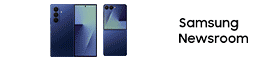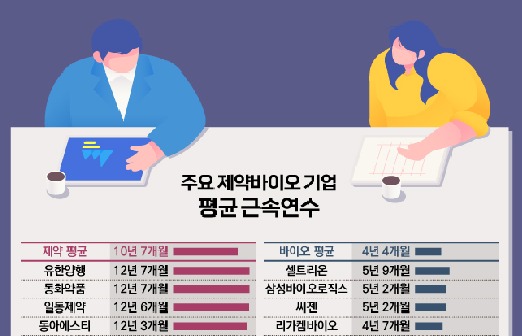올해 글로벌 디지털 치료제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약 14조5000억원)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8일 강성지 웰트 대표이사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하는 산업보고서 'KPBMA 포커스'에 '디지털 제약회사가 만드는 디지털 신약'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리포트를 게재했다.
신약 대비 개발비용·개발기간 대폭 단축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 관리 및 치료하는 신개념 치료 기법이다.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존 화학생물학적 치료제와 달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공지능(AI),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해 환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기존 약물 치료제와 비교해 비용 절감과 환자 접근성 향상, 약물 부작용 위험이 낮은 장점들이 있다. 특히 기존 신약 대비 개발 비용이 30~50% 적고 임상시험 진행 속도도 빠르다. 기존 신약이 개발 부터 승인까지 평균 10~15년이 소요되면 반면 디지털 치료제는 3~5년 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다.

제약사와 IT 기업 간 협업이 증가하며 AI 빅데이터 기술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웰트 역시 한독과 손 잡고 의약품과 디지털치료제(DTx)를 조합한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개발 중이다. 기존 제약사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술 기업도 헬스케어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국내외서 다수 디지털치료제 품목허가 승인
각 국가에서 허가받은 처방형 디지털 치료제(PDT)는 지난해 10월 기준 미국에서 37개(외래 환자 투약 애플리케이션 포함 46개), 독일 56개, 영국 20개 등이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월 기준 5개의 디지털 치료제가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에임메드의 불면증 인지개선 치료제 '솜즈(Somzz)', 웰트의 불면증 인지개선 치료제 '슬립큐(SleepQ)', 뉴냅스의 뇌졸중 환자 시야장애 개선 치료제 '비비드브레인(VIVID Brain)', 쉐어앤서비스의 호흡 재활 운동 치료제 '이지브리드(EasyBreath)', 뉴라이브의 이명 치료용 디지털 치료제 '소리클리어(SoriCLEAR)' 등이다. 작년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AI 기반 디지털 치료제 중 일부를 '혁신 의료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하는 등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규제기관들의 규제 변화로 디지털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IT 융합으로 가파른 성장 전망"
강 대표는 디지털 치료제가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과 융합해 차세대 정밀의료 기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해 기존 치료제가 효과적이지 않았던 난치성 질환 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강 대표는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디지털 치료제를 정식 의료 솔루션으로 인정함에 따라 처방형 디지털 치료제의 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또 제약과 IT 분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협업과 라이선스 인·아웃, M&A 등이 일어나면서 디지털 제약산업은 파괴적 혁신과 가파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