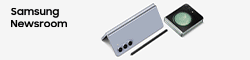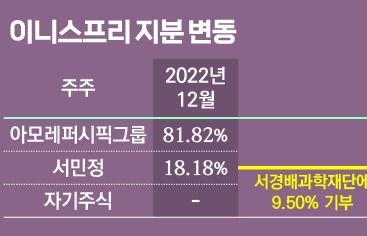'이니스프리'가 전면 리브랜딩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브랜드 로고부터 패키지, 브랜드 이미지까지 모두 교체했지만 오히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다. 다분히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디자인 변경과 이니스프리의 정체성인 제주도·자연주의 콘셉트가 약화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호황' 못 즐긴 이니스프리
지난해 이니스프리는 '고난의 한 해'를 보냈다. 매출은 전년 대비 8.7% 줄어든 2738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103억원으로 68.2% 줄었다. 매출은 오프라인 매장을 점차 줄이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지만 2021년 10억원 적자에서 간신히 회복시킨 영업이익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건 타격이 크다.
이니스프리의 실적이 더 아쉬운 건 비슷한 위치의 다른 브랜드들이 일제히 호실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1세대 로드숍으로 이니스프리와 경쟁해 왔던 미샤의 에이블씨엔씨는 지난해 매출 10.4%, 영업이익이 14.2% 늘어나며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

2022년 적자를 기록했던 토니모리도 지난해엔 96억원의 흑자를 내는 동시에 매출도 20% 가까이 끌어올렸다. 토니모리의 흑자 달성은 한한령 이슈로 로드숍이 몰락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잇츠한불과 에뛰드 역시 5~6%대 매출 성장과 60~200%대 영업이익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에서 대박 행진을 벌이고 있는 클리오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두자릿수 성장세다.
다만 이는 이니스프리의 매출 구조 영향이 크다. 이니스프리의 해외 매출은 이니스프리가 아닌 아모레퍼시픽 해외사업에 귀속된다. 해외에서 호실적을 냈어도 이니스프리의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는 이니스프리의 실적 부진 요인이 오롯이 국내 부문에 있다는 의미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지난해 이니스프리 해외사업의 경우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일본에서 매출이 소폭 성장했고 10% 초반대인 미국에서는 30%대 고성장을 이어갔다. 중국 시장에선 매출이 줄었지만 매출 비중이 10% 중반대로 높지 않은 편이다. 해외에서는 적어도 '본전치기'는 했다는 의미다.
국내는 왜
이니스프리의 국내 실적이 고꾸라진 데는 지난해 진행한 리브랜딩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니스프리는 지난해 'THE NEW ISLE' 리브랜딩 캠페인을 진행하며 브랜드 로고와 키 컬러, 제품 디자인까지 전면 교체에 들어갔다. 이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등 투자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문제는 영업이익 훼손을 감내하면서 진행한 리브랜딩이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 중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건 이니스프리 뿐이다. 에뛰드와 에스쁘아, 아모스프로페셔널, 오설록 등은 모두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업계에서는 20년 넘게 '제주도'와 '자연주의' 콘셉트를 지키며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해 왔던 이니스프리가 지나친 리브랜딩 때문에 충성고객을 잃은 것으로 평가한다. 사실상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명만 남겨 놓고 모든 것을 바꾼 콘셉트에 소비자들이 적응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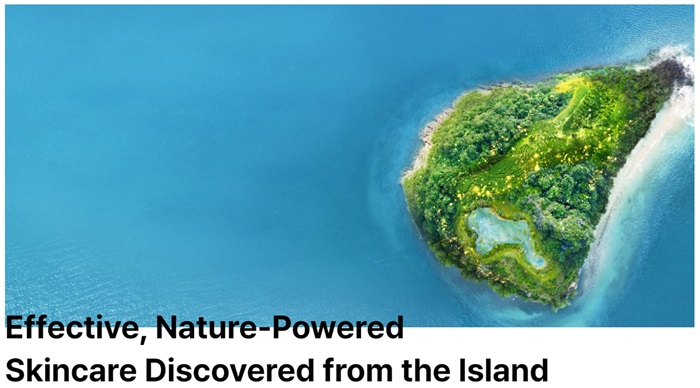
이니스프리는 리브랜딩을 통해 제주에서 벗어나 가상의 섬 'THE NEW ISLE'로 무대를 옮겼다. 제주도라는 공간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청정·감귤·녹차·화산 등이 명확하게 연상되는 제주도와 달리 특별한 포인트가 없는 가상 공간에 매력을 느낀 소비자는 많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가맹사업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제기한다. 아리따움과 에뛰드, 이니스프리 등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들의 매장이 크게 감소한 데다, 가맹점주들과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LG생활건강은 지난해 가맹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리브랜딩을 선택한 결정 자체를 잘못됐다고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결국은 결과로 말해야 하는데, 실적이 따라오지 못했으니 잘 된 리브랜딩이라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