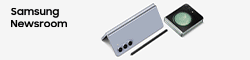내년이면 쏘나타가 출시된 지 30년이 된다. 그동안 쏘나타는 7차례 변신했다. 쏘나타를 만든 현대차는 간난신고 끝에 글로벌 5위의 자동차 회사로 우뚝섰다. 쏘나타를 혁신하면서 갈고닦은 기술력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쏘나타는 우리 사회 중산층을 말해주는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중산층들은 쏘나타를 원했고, 드디어 소유했고, 이제는 딛고 올라섰다. 쏘나타 7.0 출시를 계기로 쏘나타의 이모저모를 들여다본다.[편집자]
80년대와 90년대 한국 사회는 일대 격변기를 맞는다.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의 폭이 두터워졌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는 중산층'이라는 자의식을 가졌다.
자연스럽게 중산층이라면 갖춰야 할 제품들이 등장했다. 특히 중형 자동차는 중산층의 가늠자였다. 쏘나타가 인기를 끈 이유다 . 쏘나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나는 중산층이라는 의미였다.
◇ 쏘나타, '소나타'로 출발
사실 쏘나타는 현대차의 꼼수였다. 80년대 중반 국내 중형차 시장의 지존은 대우차의 로열 시리즈였다. 마땅한 중형차 라인업을 갖추지 못했던 현대차는 중형차 시장 공략에 고심하고 있었다.
당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기술로는 신차를 만든다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생각해 낸 묘안이 기존의 모델을 개조하는 것이었다. 1세대 '소나타'는 그렇게 탄생했다. 현대차는 85년 1.5엔진을 장착했던 '스텔라'를 개조해 중형차 '소나타'를 내놨다.

| ▲ 1세대 '소나타'. 현대차는 당시 중형차 시장 공략을 위해 대우차 로열 시리즈의 대항마로 스텔라를 개조한 '소나타'를 출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
지금은 '쏘나타'로 쓰고 부르지만 1세대 쏘나타의 이름은 '소나타'였다. 하지만 '소나타'의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출시 2년만에 2만6000대 판매라는 초라한 성적표만 남기고 퇴출됐다. '소나 타는 차'라는 오명도 더불어 얻었다.
절치부심한 현대차는 88년 2세대 쏘나타를 선보였다. 디자인도 1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곡선형으로 바꿨다. 현대차 '포니'를 디자인했던 이탈리아의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가 디자인했다. 이름도 '소나타'에서 '쏘나타'로 바꿨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 ▲ 2세대 쏘나타는 현대차의 포니를 디자인했던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 주지아로의 손을 거치면서 획기적인 모습을 탈바꿈했다. 국산 중형차 최초로 전륜구동 방식을 적용했고 서스펜션에도 변화를 줘 '중형차=안락함'이라는 공식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다. |
국산 중형차로는 처음으로 앞바퀴 굴림(FF)을 썼다. 이를 통해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했다. 미국식의 부드러운 서스펜션도 적용했다. 이때부터 '중형차=부드러운 승차감' 공식이 소비자들에게 각인됐다.
◇ 쏘나타Ⅱ, 수험생에게 인기
2세대 쏘나타는 출시 한 달여 만에 1만여 대의 계약고를 올렸다. 마침 서울올림픽이 열렸다. 한국 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중산층'이 대세였다. '중산층이라면 쏘나타 정도는 타야한다'는 분위기였다. 그 덕에 쏘나타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2세대 쏘나타는 이후 5년간 60만여대가 판매됐다. 자신감을 얻은 현대차는 93년 마침내 3세대 쏘나타를 내놓는다. 3세대 쏘나타는 기존의 디자인과는 사뭇 달랐다. 흔히 '쏘나타Ⅱ'와 '쏘나타Ⅲ'로 불리는 모델들이다.

| ▲ 3세대 쏘나타인 '쏘나타Ⅱ'부터 현대차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고급화를 앞세워 전세대 모델과 차별화 한 전략이 먹혔다. |
3세대 쏘나타의 특징은 한마디로 '고급화'다. 내외관 모두 고급화에 심혈을 기울였다. 2세대 쏘나타의 히트로 현대차는 크게 고무됐다. 광고 카피만 봐도 과거와 달랐다. 1세대에는 'VIP'를 강조했다. 하지만 3세대에는 '명품'을 내세웠다.
90년대 쏘나타를 둘러싼 또 하나의 사회 현상이 있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쏘나타의 엠블럼 중 'S'를 가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쏘나타의 엠블럼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서울대는 벤츠 S클래스 엠블럼의 'S'가 필요했다.

| ▲ '쏘나타Ⅱ'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쏘나타Ⅲ'는 현대차가 품질 측면에서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내수 판매도 100만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
그만큼 쏘나타는 국민차가 돼있었다. 특히 96년 출시된 '쏘나타Ⅲ'의 인기는 대단했다. '쏘나타Ⅲ'는 내수 시장에서 판매 100만대를 넘어섰다. 품질도 뛰어났다. 지금도 거리에서 간간히 '쏘나타Ⅱ'와 '쏘나타Ⅲ'를 볼 수 있다.
'쏘나타Ⅱ'와 '쏘나타Ⅲ'는 '국민 중형차'가 됐다. 과거 중산층이 타는 차에서 국민차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대기업에서는 월급 이외에 성과급 등을 두둑히 챙겨줬다. 취업도 쉬웠다. 대학생들도 과외 등을 통해 쉽게 돈을 벌었다.
◇ 4세대, 독자기술 적용
1세대~3세대까지 쏘나타의 개발코드는 'Y'였다. 1세대 쏘나타가 'Y1', 2세대가 'Y2' 이런 식이었다. 하지만 4세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코드명이 바뀌었다. 98년 첫선을 보인 4세대 쏘나타의 개발코드명은 'EF'였다. 이유가 있었다.
현대차는 4세대 쏘나타부터 독자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독자 개발한 고성능 델타 V6엔진을 장착했다. 3세대까지는 미쓰비시의 엔진을 사용했다. 신개념을 적용한 HIVEC 변속기와 자체 설계한 서스펜션도 인상적이었다.

| ▲ 4세대 쏘나타인 'EF쏘나타'는 현대차가 '독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EF쏘나타'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
4세대 'EF 쏘나타'는 IMF 외환위기를 온 몸으로 통과했다. 그래서 '비운의 차'로도 불렸다. 거품이 꺼진 후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텅 비었다. 4세대 쏘나타는 이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차가 됐다. 더 이상 국민차가 아니었다.
하지만 'EF 쏘나타'는 '현대차=깡통차' 이미지만 가득했던 북미 시장의 시선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현대차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현대차는 당시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을 'EF 쏘나타' 광고모델로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였다.
해외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 받은 것은 'EF 쏘나타'의 부분변경 모델인 '뉴 EF 쏘나타'였다. 2001년 출시된 '뉴 EF 쏘나타'는 외형부터 크게 변신했다. 마치 벤츠 E클래스를 연상시키는 외관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 ▲ '뉴 EF쏘나타'는 현대차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 미국 J.D.파워 등에서 인정을 받았다. 마침 외환위기가 끝나고 경기회복기에 접어들던 시기였다. '뉴 EF쏘나타'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
'뉴 EF 쏘나타'는 미국 J.D. 파워의 소비자 고객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등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당시의 '뉴 EF 쏘나타' 광고 카피는 온통 '1위' 'No1' '정상' '세계' 일색이다. 독일, 일본차와 경쟁해 앞서가는 광고를 선보이기도 했다.
97년 외환 위기 이후 위축됐던 소비자들은 2000년대 들어서며 벤처 붐과 경기 회복 분위기에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주머니가 다시 채워졌다. 이는 곧 '뉴 EF 쏘나타' 구매로 이어졌다. 당시 삼성차의 SM5에게 내줬던 중형차 시장을 단숨에 찾아왔다. 쏘나타는 다시 '국민 중형차' 자리를 되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