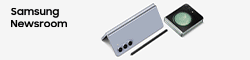한국 기업들은 일본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현장에 산업화의 씨앗을 뿌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기적을 일궜다. 하지만 100년을 견딘 '거목(巨木)'과 같은 기업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100억원을 넘는 1만9000여개 기업 중 설립된 지 100년 이상된 기업은 두산·동화약품·몽고식품·광장시장 등 6곳에 불과하다.
일본은 아스카 시대(552~645년)에 세워진 사찰건축 전문회사인 곤고구미(金剛組)를 비롯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 2만~5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만개의 장수기업이 포진한 나라와 단 6개의 기업만 '100년 기업'의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한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글로벌 장수기업들의 성공과 실패 요인, 한국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 ▲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을 추구한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곳은 많지 않다. 비즈니스워치는 100년 기업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살펴본다. |
2009년 6월1일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제터럴모터스(GM)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931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77년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지켜온 미국의 자존심이 쓰러진 순간이다.
GM은 쉐보레·캐딜락·GMC·뷰익 등 수익성이 좋은 브랜드를 남겨 '뉴 GM'으로 새출발했다. 금융위기 때 받은 구제금융을 지난해 모두 상환하며 빠르게 재기했지만 최근 점화장치 결함 은폐와 늑장 리콜로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 GM, 성공에 취했다
GM 몰락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삼성경제연구소는 역설적이게도 '성공'에서 찾았다. '1등 GM'의 환상에 빠져 닥쳐올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GM 경영진은 시장 변화를 읽지 못하고 중대형차 판매에 매달렸고, 노조는 과도한 복리후생 등 단기적인 이익배분에 골몰했다.
특히 GM 경영진은 본업인 자동차부문의 경쟁력 강화는 뒤로 한 채 부업인 금융사업(GMAC)의 성공에 도취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는 돈을 버는 여러 수단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고가 싹텄다. 실제 GM의 자동차부문은 2000년대 초반 적자로 돌아섰는데도 할부금융사업의 흑자로 전체 실적은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GM은 돈이 된다는 이유로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도 손을 댔고 결국 금융위기와 함께 침몰했다. 밥 루츠 GM 전 부회장은 '빈 카운터스'라는 책에서 "이윤극대화와 비용절감을 앞세운 숫자놀음꾼(bean counter)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GM은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 돈만 벌면 된다는 착각
비슷한 사례는 대한전선에서도 찾을 수 있다. 1955년 설립된 대한전선은 1960~1970년대만 해도 국내 10대 그룹에 속하던 기업이었다. 설립 이후 50년 넘게 흑자를 냈으나 지금은 채권금융기관의 관리 하에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대한전선도 본업보다는 부업에 열을 올린 게 화근이었다. 2000년대 초반 전선업 호황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진로 채권투자, 남부터미널 부지 등을 활용해 수천억원의 돈을 번 대한전선은 의류·레저·통신·태양광·건설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한 기업에 지분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회사를 인수하는 모습을 보여 '기업사냥꾼'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함께 거품이 꺼지면서 이 회사는 2009년 적자로 돌아섰고, 지난해는 창업주 일가가 경영권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김범열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 무너지는 이유'라는 보고서에서 "선도기업이 빠지기 쉬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수익을 탐하다 경영의 본질을 잃는 것"이라며 "기업이 생존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수익 창출 자체가 기업의 존재목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전문경영vs오너경영, 승자는? |
| 경영학에서 빠지지 않는 게 주인과 대리인 이론이다. 주인(주주)이 대리인(전문경영인)에게 일을 맡겼을 때 대리인이 권력과 정보를 틀어쥐고 제 잇속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학계에서 주인-대리인 문제의 사례로 거론하는 게 대한전선이다.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은 뒤 회사의 경영성과는 일시적으로 좋아졌으나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엔 회사를 부실로 몰고갔다. 대한전선은 LS전선과 곧잘 비교된다. 전선사업의 양대축을 이룬 두 기업은 공교롭게도 2004년을 기점으로 경영진을 교체했다. 대한전선은 설원량 회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무 출신 전문경영인인 L씨가 경영을 맡았고, LS전선은 LG그룹에서 분리되면서 오너인 구씨 일가가 회사를 이끌었다. 전문경영인과 오너경영인간 대결구도가 펼쳐진 것이다. 초기엔 대한전선의 성과가 더 나았다. L씨는 "기업이 한우물만 파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공격적인 사업다각화를 꾀했고, 취임 2년만에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으며 LS전선을 앞섰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무분별한 사업확장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대한전선의 기업가치는 LS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대한전선이 수익성만 바라보고 기존 사업과 동떨어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한 것과 달리 LS전선은 전선과 제조업 중심의 수직적 사업다각화를 추진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서도 LS전선은 1%로 대한전선(0.6%)을 앞섰다. 현재 LS전선은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프랑스 넥상스에 이어 세계 전선업계 3위를 기록 중이다. 안세연 서울대 장수기업연구센터 연구교수는 지난해 두 기업의 성과를 비교한 논문에서 "전문경영진에 의한 단기적 수익창출보다 소유경영자에 의한 장기적 전략이 기업의 장기생존에 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