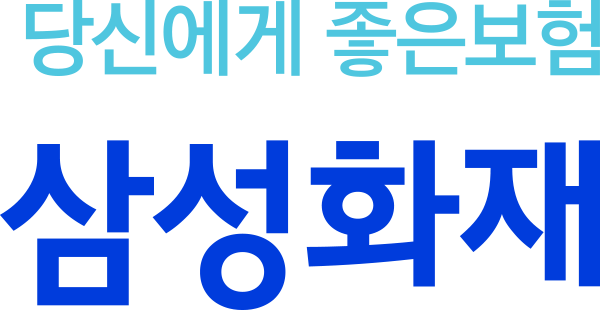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미국 군함 수주 기대에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선 "한국 조선업의 승리가 아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겸비한 한국 조선사를 단기적으로 활용한 뒤 조선업 재건에 나설 수 있어서다.

"동맹국 조선 활용은 단기적 필요"
13일(현지시각 12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더 케피탈 케이블(The Capital Cable)'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주제는 '트럼프 2.0과 한반도'. 비즈워치는 CS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 회의를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마크 리퍼트 CSIS 선임 고문은 "이 법안들은 한국 조선업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조선업 재건의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한 수주 확대가 아닌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마크 리퍼트 선임 고문이 말한 법안은 지난 5일 마이크 리·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 의원이 공동발의 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Naval Readiness Act)'과 '해안경비대 준비태세 보장법(Ensuring Coast Guard Readiness Act)'을 말한다.
이 법안은 "미 해군이 355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91척으로는 부족하며, 신속한 함정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국내(미국) 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비용 문제를 고려할 때, 동맹국 조선소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이 국내에 알려지자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업 주가가 급등하며 기대가 부풀고 있지만 정작 미국에선 자국의 실익을 챙기겠다는 냉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마크 리퍼트 선임 고문은 "미국이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하는 것은 단기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결국 핵심 기술과 조선 역량을 미국 내에서 다시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석했다.
이날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조선업이 미국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자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이클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참모(현 Beacon Global Strategies 대표)는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NATO 국가들의 국방비 지출을 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반드시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한 비용
리·커더스 상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을 건조할 경우, 반드시 미국 조선소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해 발간된 미 의회조사국(CRS)의 해군 전력 구조 및 조선 계획 보고서를 보면, 자국 조선소에서 구축함(DDG)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약 30억 달러(약 4조4000억원)가 소요되지만, 한국 등 동맹국에서는 약 20억 달러(약 3조원)로 절감된다고 분석했다. 한 척당 1조4000억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군함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단순히 배를 건조하는 것에 머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속적인 기술 이전이나 협력 없이 단순한 하청 형태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장기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한국은 단순한 계약 수주가 아니라, 기술 협력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두 법안이)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본처럼 미사일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미국과 공유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함정 건조 수주만으로는 한국 조선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조선업이 정상화되면 해외 조선소를 다시 배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