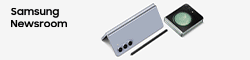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2016년부터 이사회를 지킨 터줏대감인 김동중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그가 부정회계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으며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김 부사장은 같은 문제로 2018년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를 받았지만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해임되진 않았다. 그는 지난해 연말부터 협력사를 관리하는 상생협력센터장을 맡고 있다.
임기를 다 채운 허근녕 사외이사도 이번에 이사회를 떠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의 후임으로 이승호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 관료 출신 사외이사다. 자칫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리스크, 결국 현실로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은 올해 3월을 끝으로 2016년 선임된 이후 9년만에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다. 지난해 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 관련 재판에서 김 부사장이 유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부사장은 2018년 검찰의 부정회계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숨기도록 임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무죄를 받은 2심 재판과 별도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형사 14-1부)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9년과 2022년 사법리스크를 우려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에도 김 부사장의 재선임을 밀어붙인 바 있다.
김 부사장은 이사회를 내려왔지만 해임되진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8년 분식회계 당시 책임자로 김 부사장의 해임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승소하며 이 처분이 취소됐다. 현재 금융위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부사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협력사를 관리하는 협력상생센터장을 맡고 있다. 신임 경영지원센터장으로는 유승호 부사장이 선임됐다. 유 부사장은 이번 정기주총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3번째 관료출신 사외이사
이번 주총을 마지막으로 2019년 선임된 허근녕 사외이사도 이사회를 떠난다. 상법상 사외이사의 최대 임기인 6년을 모두 채워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허 이사의 후임으로 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 전 실장은 기재부 1차관을 지낸 2018년~2019년을 제외하고 모두 문재인 정부 임기(2017년~2022년) 동안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이 전 정책실장이 선임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관료 출신의 사외이사를 선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가 된다. 전체 사외이사 중에서 관료 출신은 절반(4명 중 2명)을 차지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재부 2차관을 퇴임한 지 5개월 된 안도걸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한 적 있다. 안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2024년 중도 사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의 후임으로 국토부 장관 출신의 서승환 이사를 지난해 3월 선임했다.
관료출신 사외이사는 정부기관의 조사, 규제 등의 외풍을 막는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경영진을 견제하거나 주주가치를 보호하는 업무를 소홀히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사외이사로 추천한 경영진에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6년부터 6년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외이사를 지낸 정석우 고려대 교수는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한 코스피 상장 기업가치를 분석한 2015년 논문에서 "관료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지 않으며 경영진 및 기업의 유사시 방패막이 혹은 고액보험의 역할 등 기업가치 증대 이외의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영도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사외이사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관료출신에게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외이사가 자신을 추천한 경영진과 친소관계를 고려해 무비판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