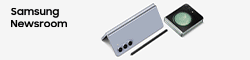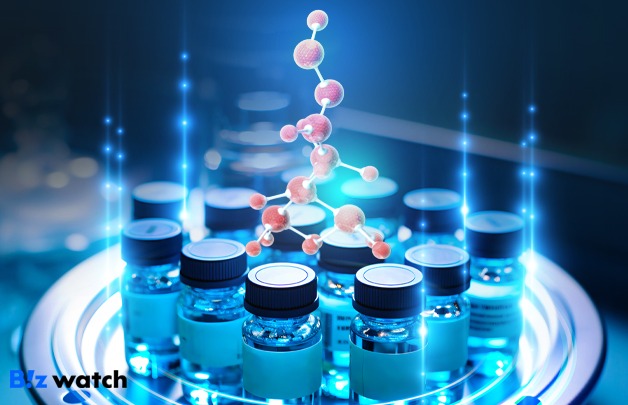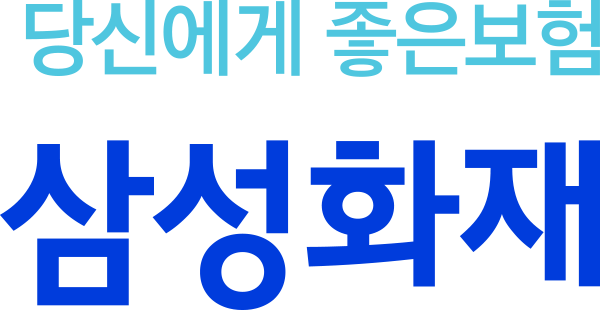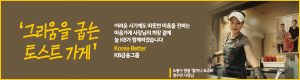제약 기업과 바이오 기업간의 개발비 비용 손상 규모가 엇갈려 눈길을 끈다. 제약보다 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자산 손상금액이 훨씬 컸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업종 특성상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시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자산으로 잡아놨던 개발비를 비용으로 털어낸다.
4일 비즈워치가 주요 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무형자산 개발비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곳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보령, 한미약품, 종근당 등 6곳이었다.
이 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비용이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탓에 손상차손 규모가 가장 컸다.
삼성바이오, 황반변성 치료제 사업성 변화로 610억원 손상 전환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무형자산 개발비 손상차손액은 610억원이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생산하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이 연결 실적으로 반영되면서다. 회사는 황반변성 치료제의 시장환경에 따른 사업성 변화 때문이라고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이 개발한 황반변성치료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아필리부'를 지난해 5월 국내 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지속돼 온 리제네론과의 소송 이슈 등으로 자산화했던 황반변성 치료제 개발비용을 손상 처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통 제약사들은 무형자산 개발비의 손상차손액이 100억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손상차손액이 유독 높은 이유는 글로벌 임상에 많은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또 바이오의약품은 합성의약품 대비 긴 개발기간과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바이오의약품 허가에 들어가는 비용도 더 많다.
대웅제약·동아에스티, 신약 임상 변경·중단
전통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비를 자산화했던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의 손상차손이 100억원 전후에 달했고 제네릭 개발비를 자산화한 한미약품, 종근당, 보령은 손상차손 규모가 30억원 미만으로 적은 수준이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다수 품목들의 개발이 중단되면서 155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했다. 국산 신약으로 허가 받은 펙수클루의 적응증(사용 범위) 확대를 위해 진행한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유지요법 임상3상의 임상계획 및 개발일정 변경으로 무형자산 개발비 124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또 중추성 사춘기조발증 치료제와 항류마티스제제 임상 중단으로 각각 15억원, 항응고제의 개발 중단으로 1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대웅제약은 중추성 사춘기조발증 치료제의 경우 임상 내용을 변경해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동아에스티는 과민성 방광치료제 'DA-8010'의 임상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 개발을 중단하고 개발비 94억원을 전액 손상 처리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고혈압 치료제인 아모잘탄플러스정의 저용량 복합제 개발을 중단하면서 자산화했던 24억원을, 종근당은 지난해 녹내장 복합제로 개발 중이던 CKD-351의 임상3상 결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자산화했던 개발비 9억원을 손상 인식했다.
이밖에 보령은 아이엠디팜과 공동개발 계약을 맺고 임상3상을 진행 중인 오메가3의 비용 회수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판단, 자산화 했던 개발비 2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전환했다. 회사에 따르면 오메가3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회계 관리 적정성 차원에서 손상 인식했다는 입장이다.
손상 인식 적은 이유…성공률 높은 제네릭 중심 R&D
신약의 경우 임상3상부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1상, 제네릭(복제의약품)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단계부터 투자한 개발비의 경제적 효익을 인정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에 실패할 경우 자산화한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해야 한다.
자산화한 개발비가 손상으로 전환될 경우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성공률이 높은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국내 무형자산 개발비의 손상차손 규모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화이자의 경우 지난해 29억 달러(약 4조 2000억원) 규모의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한 바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신약 개발에 주력하는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하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무형자산 개발비의 손상차손 규모는 미미한 수준으로 그만큼 손상차손 발생 위험이 높은 신약 개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약은 실패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신약 개발에 대한 도전이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