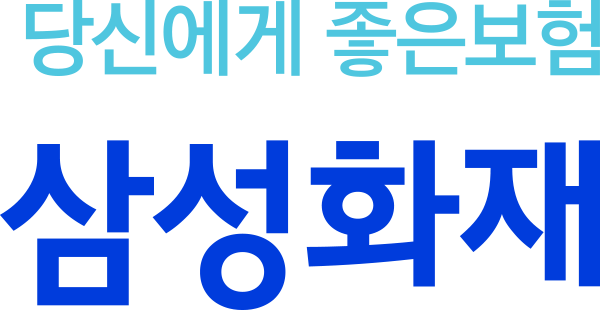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잘 만든 신약 하나만으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 하나의 질환에서 월등한 치료효과를 보이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개발 초기에 시장에서 주목받았지만 생각지 못한 부작용으로 사장된 약들의 뒷이야기를 다뤄본다. [편집자주]
희귀질환은 원인과 증상이 복잡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다발성경화증 역시 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 중 하나다.
다발성경화증은 뇌, 척수, 시신경으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에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환자의 면역체계가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면역 세포가 중추신경계에 침범한 부위에 따라 시력 저하, 복시, 감각 이상, 운동장애, 어지럼증, 인지기능장애, 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다발성경화증 치료에는 질병 형태에 따라 스테로이드, 자가주사(환자가 스스로 투여), 면역글로불린, 항체치료제 등 다양한 주사제들이 사용되는데 격일, 일주일에 3회, 일주일에 1회 등 주사하는 방식이다.
월 1회 자가투여 '진브리타'…투약 편의성 개선 '주목'
그러다 미국 바이오젠과 애브비가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진브리타'를 허가, 출시하며 업계에서 주목받았다.
진브리타는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선천적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NK세포(자연살해 세포) 수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신경계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T-세포의 활성을 차단한다. T세포 활성도를 떨어뜨려 다발성경화증 증상의 재발과 장애진행을 억제하는 기전이다.
특히 면역글로불린이나 항체치료제 같은 주사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투여시간도 1~2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진브리타는 월 1회 환자가 집에서 직접 투여하는 방식으로, 투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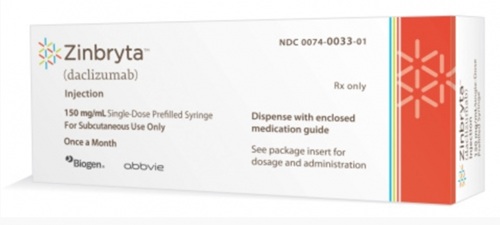
다발성경화증은 재발과 완화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진브리타는 임상에서도 재발률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상 결과에 따르면 1841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브리타와 1996년 개발된 아보넥스를 144주간 투여한 결과 진브리타를 투여하는 환자들은 아보넥스를 투여하는 환자들보다 임상적인 재발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도 4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52주 동안 진브리타와 위약을 투여한 결과 진브리타를 투여한 환자들은 위약을 받은 환자들보다 재발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단위 시장서 부작용 문제, 2년만에 자진철수
진브리타는 출시 1년만인 2017년 매출액 1억700만 달러(한화 1560억원)를 기록했지만 제대로 꽃을 피우기도 전에 시장에서 자진 철수했다.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296억5000만 달러(43조3000억원)로, 경쟁 약물들의 매출은 대부분 조단위다.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1위인 로슈의 '오크레부스'는 2022년 글로벌 매출이 60억3600만 스위스프랑(10조 3000억원)에 달했다.
바이오젠과 애브비는 출시 2년만인 2018년 진브리타의 자진회수를 결정하고 그 이유로 "대상 환자수가 제한적이어서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안전성 문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가장 먼저 유럽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임상시험에서 혈중 간세포 효소(transaminase) 수치증가, 피부반응 등의 이상반응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며 간손상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허가 이후 전격성 간염에 의해 1명이 사망했고 4건의 중증 간손상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간손상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에 사용이 금지되는 등 투여 대상범위가 제한됐고 미국에서도 간기능 저하 환자에 사용을 제한하도록 제품에 경고문을 삽입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진브리타의 부작용 사례는 또 나타났다. 진브리타를 투여받은 환자 중 12명에게서 뇌염 및 뇌수막염이 발생했고 이 중 3건은 치명적인 것으로 보고됐다.
진브리타는 투약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며 업계 기대를 모았지만 심각한 부작용으로 쓸쓸하게 시장에서 물러난 비운의 치료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