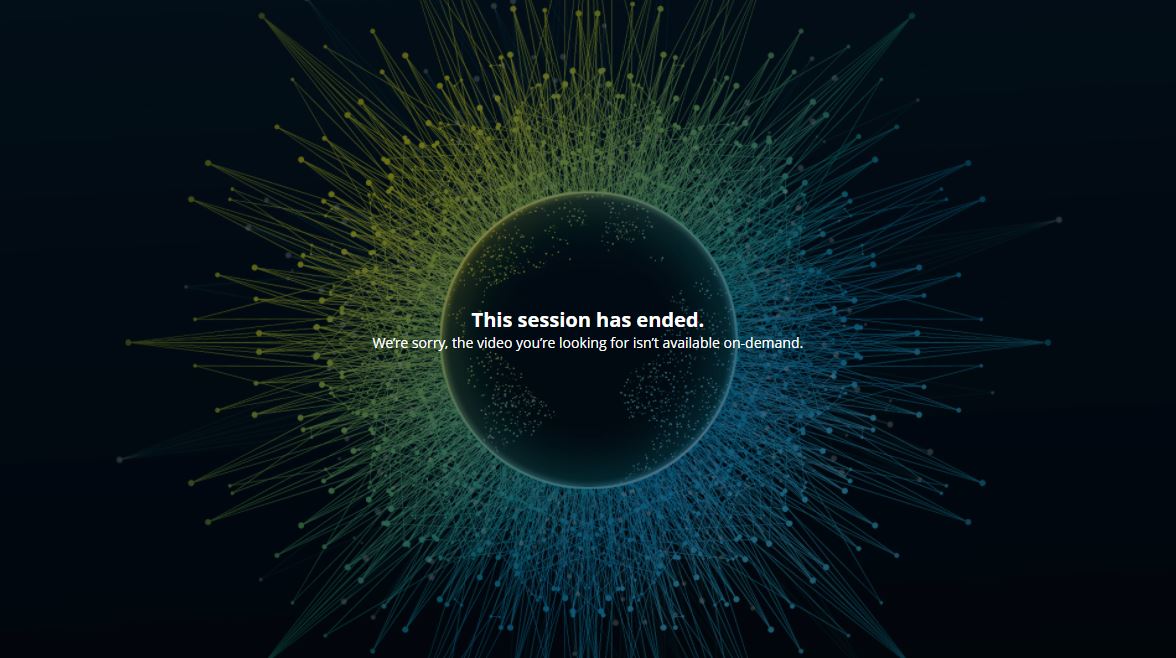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1'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CES가 1967년 시작된 이후 55년만에 처음이다.
기자는 이번 CES에서 모빌리티 분야를 집중 취재했다. GM, 메르세데스 벤츠,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자들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업들이 선보인 동영상의 경우 적어도 시청각은 만족시켰다. GM은 하늘을 나는 차 '플라잉 카'에 대한 도전을 공식화면서 근사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영상으로 모빌리티의 미래를 제시했다.
BMW가 선보인 동영상은 전기차 'iX'와 구형 BMW 7 시리즈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다. 영화 '트랜스포머'를 보는 것 같이 흥미진진했다. 이미 일부 상용화된 차량간 통신 기술의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셈이기도 했다.
중장비 회사 캐터필러의 자율주행 채굴 트럭, IBM의 자율항해 선박 '메이플라워' 등은 실물을 봤으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였다.
무엇보다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스(FCA)가 자사 차량들을 증강현실(AR)로 보여주는 전시를 진행한 것을 보면서, 올해 CES가 코로나 탓에 온라인으로만 진행된 사실을 더욱 체감할 수 있었다.
자동차는 눈으로 보고 타봐야 느낌을 온전히 알 수 있을 텐데, 그 누구도 진화하는 모빌리티를 직접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온라인 전시회인 까닭에 진입장벽이 낮아지기도 했다. 과거 한국인이 CES를 관람하려면 값비싼 항공권과 숙박비, 시간 등을 부담해야했지만 이번엔 특별한 비용이나 제약 없이 유튜브를 시청하듯 동영상만 보면 됐으니 말이다.
그러나 2년 전 'CES 2019' 출장에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내놓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온몸으로 느끼고, 어설픈 영어와 손짓 발짓으로 세계 곳곳의 기업 관계자에게 묻고 또 물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온라인 개최는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기도 하다.
카카오톡으로, 페이스북으로 수백 번 대화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만나는 게 낫지 않은가. 아직은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웹사이트 곳곳을 누비는 것보다 발로 뛰어다니는 것에 훨씬 익숙하다는 것을 이번에 더욱 느꼈다.
CES 웹사이트의 사용자 환경(UI)에 익숙해지는데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CES는 관심 분야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아직은 공급자 중심으로 웹사이트를 구성했다. 게다가 미국과 시차 때문에 한국에 사는 사람이 실시간 컨퍼런스에 참여하려면 새벽 시간에 봐야 했다. 일부 행사는 생방송을 보지 않으면 다시 시청할 수 없게 구성됐기에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간에 살았다. 잠옷 입고 일하는 '파자마 저널리즘'이 멀리 있지 않았다.


외국어 자막 서비스에서도 아쉬움이 엿보이기도 했다. 독일 벤츠가 자사 차세대 디스플레이 'MBUX 하이퍼스크린'을 소개하는 장면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벤츠의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자드 칸이 이렇게 말했을 때다. 그는 "As a working title we call it Mercedes Travel Knowledge"라고 말했는데, 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우리는 이 서비스를 '여행지식'이라고 부릅니다"라고 하면 얼추 비슷하겠다.
그런데 CES 공식 사이트는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여행."이라고 엉뚱하게 번역한 것이다. 독일 회사 이름 메르세데스를 프랑스어 명사 메르시(merci·자비)라고 본 셈이니 상당히 황당하다. CTO가 메르세데스를 '메르시데스'라고 발음한 것을 혹시 프랑스어 메르시와 일본어 조동사 '데스'(です, '~이다'의 공손한 표현)로 엮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일본어로 번역한 언어 데이터가 한국어보다 훨씬 많고 한국어-일본어 번역 정확성이 높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이런 의심까지 해봤다.
이때부터 기자는 한국어 자막을 포기하고 영어 자막만 보면서 동영상 재생과 일시정지를 반복하면서 영어 공부에 돌입해야 했다. 영어가 부족한 것에 대한 토로를 내놓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하지만(영어능력과 무관하게 전문분야 새로운 용어는 생소할 수밖에 없다고 변명해본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인이 주목하는 전시회도 온라인으로 열어야 하는 시대라면 곰곰 생각해볼 대목이기도 하다.
한국은 CES 2021에 미국(570개) 다음으로 많은 340여개 기업이 참가한 핵심 고객이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지점이다.
코로나가 촉진시켰지만 동영상과 같은 비대면 서비스는 이제 필수가 됐다. 그렇다면 CES뿐만 아니라 앞으로 열릴 MWC, IFA 등 다른 가전 및 IT 전시회도 세계적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 넷플릭스의 사례를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전세계 가입자가 2억명이 넘는 넷플릭스는 사용자 취향에 맞춘 콘텐츠 추천 시스템으로도 유명하지만, 자막과 번역을 위한 테스트 및 색인 시스템 '헤르메스'(HERMES)을 선보였을 정도로 번역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전령, 여행, 상업의 신이다.
넷플릭스는 무려 4년 전인 2017년에 이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영어로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회원이 더 이상 주류를 이루지 않게 될 날이 머지않은 상황에서, 전세계 회원에게 현지 언어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은 창작자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문화적 차이를 세심하게 살리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콘텐츠 품질 관리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넷플릭스는 세계 곳곳에서 번역 고수를 찾아나서기도 했다. 미국에서 시작한 사업자이지만 세계 곳곳에서 현지화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다. 비대면 시대에 직면한 글로벌 전시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도 거듭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