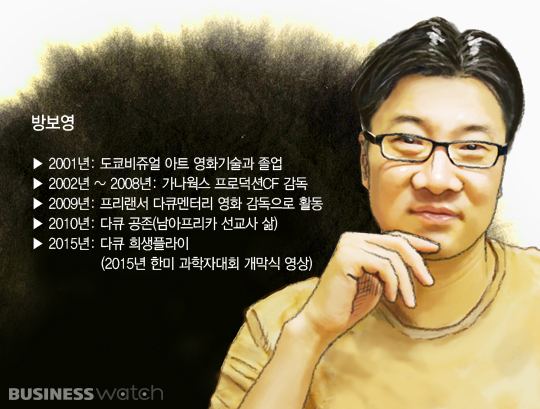| ▲ 사진: 교동사랑회 임충식 |
강화도 교동은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이다.
그래서 출입증을 받아야 통행할 수 있다.
교동은 원래 강화도에서 뱃길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2014년 교동대교가 놓였다.
교동대교는 서해 최북단의 다리로
대교를 지날 때면 북한 땅도 볼 수 있다.

| ▲ 사진: 교동사랑회 임충식 |
임충식 씨는 교동사랑회 회원이다.
교동사랑회 회원답게 교동을 사랑한다.
교동사랑회 회원답게 교동을 사랑한다.
주말엔 교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내지도를 제공하고 종종 해설도 한다.
안내지도를 제공하고 종종 해설도 한다.

| ▲ 사진: 교동사랑회 임충식 |
고향이 서울인 임 씨에게
교동을 사랑하는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한다.
"작지만 큰 섬
볼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섬
볼 것도 보여줄 것도 없는 섬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촌티 나는 마을과 사라져가는 역사의 흔적뿐"
촌티 나는 마을과 사라져가는 역사의 흔적뿐"
임 씨에게 교동은 '아름답고도 슬픈 섬'이다.

| ▲ 사진: 교동사랑회 임충식 |
교동은 과거 왕족의 유배지였다.
고려 희종을 비롯해 조선 광해군과 연산군 등
많은 왕족에게 영어(囹圄)의 섬이자
또한 절치부심의 섬이었다.
많은 왕족에게 영어(囹圄)의 섬이자
또한 절치부심의 섬이었다.
지금도 섬의 3분의 2가
민통선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민통선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여전히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아픔과 슬픔의 섬이다.
아픔과 슬픔의 섬이다.

| ▲ 사진: 교동사랑회 임충식 |
교동 북쪽 해안 율두산 언덕배기엔
망향대가 자리 잡고 있다.
실향민들이 고향을 그리며 세운 비석이다.
망향대에 서면 바다 건너 황해도 연백이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보인다.

6.25 전까지만 해도 연백과 교류가 활발했다.
그 때문에 6.25가 터지자 연백 피난민들이
전쟁을 피해 하나둘씩 교동으로 몰려들었다.
전쟁을 피해 하나둘씩 교동으로 몰려들었다.
전쟁만 끝나면 돌아가겠지라는 기다림과 함께
어느덧 시간은 70년 가까이 흘렀다.
어느덧 시간은 70년 가까이 흘렀다.

피난 1세대는 대부분 돌아가셨다.
그분들의 등에 업혀 38선을 넘던 어린아이들이
실향민 2세로 교동을 터전 삼아 살아가고 있다.

올해 아흔인 양응종 어르신은
이곳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28년 간 우체부로 일했고
교동에 처음 전선을 설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어르신 댁엔 아직도 그 시절 입간판이 걸려있다.

교동은 여전히 1960~70년대
옛 동네 풍경을 간직하고 있다.
촌티 나고 딱히 볼거리도 없지만
역사가 있고 또 이야기가 있다.
역사가 있고 또 이야기가 있다.
멈춰있는 기다림의 섬 교동에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 잊힌
너를 기다리던 기억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