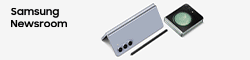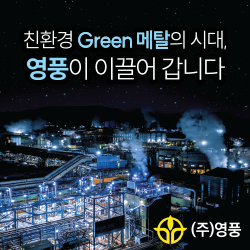[생활의 발견]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재들을 다룹니다. 먹고 입고 거주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곁에 늘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 그 뒷이야기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 합니다. [생활의 발견]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새 인싸가 돼 있으실 겁니다. 재미있게 봐주세요. [편집자]
K알코올, 쏘-주
2000년대 중반 정부가 앞장서서 한창 K푸드를 띄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김치나 불고기 같은 '당연한' 음식이 아닌, 요즘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논의가 많았죠. 이 때 많이 거론된 음식 중 하나가 '떡볶이'였습니다. 실제로 2008년엔 정부 주도로 추진된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에서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떡볶이를 개발하려는 노력도 있었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떡의 식감이 너무나도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떡의 쫀득함과 찰기, 오래 씹어야 하는 질감이 영 맞지 않았나 봅니다. 떡볶이 소스가 꽤나 맵다는 점도 이유가 됐을 겁니다. 이래저래 한식 세계화엔 어울리지 않아 보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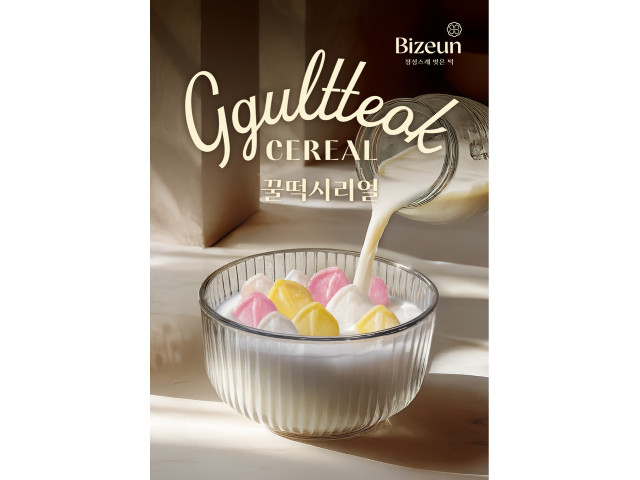
하지만 이게 웬 걸, 지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상위권에는 늘 떡볶이가 있습니다. 식감을 바꿨을까요, 맵기를 줄인 걸까요? 아닙니다. 떡볶이는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는데(굳이 말하자면 15년 전보다 더 매워졌죠) 외국인들이 떡볶이에 적응해버렸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최애 음식'으로 떡볶이를 꼽고, K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매일 떡볶이를 먹은 결과입니다. 떡의 식감이 어떻고, 맵기가 어떻고 하는 건 사실 진짜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떡볶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희석식 소주'입니다. 희석식 소주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주류입니다. 연간 수입억병이 팔리며 매출이 2조원을 훌쩍 넘습니다. 이 중 절반인 유흥시장에선 출고가의 4~5배에 달하는 가격에 팔립니다. 실제 소비자들이 소주에 쓰는 돈은 4조원 이상이란 얘깁니다. 그야말로 '국가대표 술'입니다.

사실 소주는 우리에게 늘 '내놓기 부끄러운 자식'이었습니다. "취하기 위해 억지로 마시는 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죠. 일각에선 아직도 '화학식 소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뭔가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소주도 이제는 K컬처 열풍을 타고 불고기와 삼겹살, 떡볶이 옆에 나란히 섭니다. 한국 여행을 온 외국인들도 "쏘주 주세요"를 외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한국 소주를 베낀 제품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소주에 대한 편견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소주에 대한 기사를 쓰면 늘 달리는 댓글들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싸구려 술' 취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생활의 발견]에서는 우리가 늘 마시는 참이슬과 진로, 처음처럼, 새로 등 희석식 소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학식 아니고 희석식
왜 희석식 소주를 화학식 소주라고들 부르는 걸까요. 제조 과정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도수 주류들은 보리나 포도 등 원재료를 발효시킨 후 증류해 만듭니다. 보통 40~60도 안팎의 도수가 되도록 증류를 하죠. 하지만 희석식 소주의 경우 원재료를 발효시키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연속증류를 통해 순도 95% 이상의 알코올을 뽑아낸 뒤 물을 넣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마시는 20도 안팎으로 조절합니다.
알코올에 물을 넣어 희석하니 '희석식 소주'고요. 순수한 알코올에 가까운 고순도의 알코올을 뽑아낸다는 점 때문에 화학적인 방법으로 알코올을 만들었다는 오해 탓에 '화학식 소주'라는 표현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발효와 증류도 화학반응'이라는 입장이라면, 전세계의 모든 술을 화학주라고 불러야겠죠.

희석식 소주엔 풍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도 이 연속증류 방식을 통한 고순도 알코올 때문입니다. 위스키나 브랜디 등을 만들 때처럼 40~60도 사이에서 증류를 멈추면 원재료의 풍미가 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겉보기엔 거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위스키와 브랜디가 마셔 보면 분명히 다른 맛을 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알코올 도수를 90도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원재료의 풍미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알코올의 역한 냄새만 남죠. 이 때문에 소주의 경우 원재료를 카사바나 타피오카, 고구마 등을 섞어 사용합니다. 어차피 풍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싼 탄수화물'을 쓰는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술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러시아에서도 저가 보드카를 구매해 물을 타 마시면 희석식 소주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보드카는 연속증류를 통해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생성하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여과한 뒤 물을 타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사실상 희석식 소주와 제조법이 거의 같은 셈입니다. 얼마나 여과를 잘 해서 냄새를 잘 없앴느냐가 고급 보드카와 저가 보드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스피리츠인 '진(Gin)' 역시 알코올 도수 90%가 넘는 주정을 물로 희석한 뒤 주니퍼베리 등을 넣어 향을 내는 술입니다. 요즘은 프리미엄 진이 많이 팔리지만 원래 영국에서 진은 희석식 소주처럼 싼 값에 취할 수 있는 저가 주류의 대명사였죠.

'해적의 술' 럼도 비슷합니다. 애초에 럼은 설탕을 만들고 난 부산물인 당밀로 만든 술인 만큼 고급스러울 수도 없죠. 럼 역시 저가 화이트럼의 경우 연속증류를 통해 90도 이상의 알코올을 만들고 여기에 이런저런 부산물을 넣어 만듭니다. 이 역시 구조적으로 희석식 소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희석식 소주가 낮은 단가로 대량생산할 수 있고, 술 자체의 특색이 거의 없는 저가 주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문화엔 맥락이 있습니다. 부대찌개가 한반도의 전후 역사를 상징하는 음식인 것처럼, 소주 역시 우리의 가난하던 시절을 상징합니다.
쌀이 모자라니 고구마나 감자로 술을 만들고, 6·25 이후의 가난한 나라에서 저렴하게 술을 마시려니 이런 희석식 소주가 인기있을 수밖에 없었죠. 산업혁명 당시 가난한 노동자가 마시던 진, 하급 선원이나 해적들이 즐기던 럼 역시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술을 마시려는 애환이 담긴 '서민의 술'입니다.

20년 전 외국인들은 떡볶이에 질색을 했습니다. 2025년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가장 즐기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떡볶이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습니다. 떡볶이를 둘러싼 문화와 환경이 바뀐 겁니다.
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술의 완성도로만 보면 증류식 소주나 위스키, 와인에 비해 떨어지겠지만,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나 완성도가 아니라 '문화', 혹은 '추억'일 수 있습니다. 고급 위스키와 와인이 넘쳐나는 이 시점에도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술이 소주인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