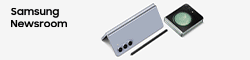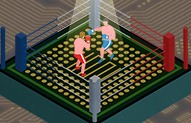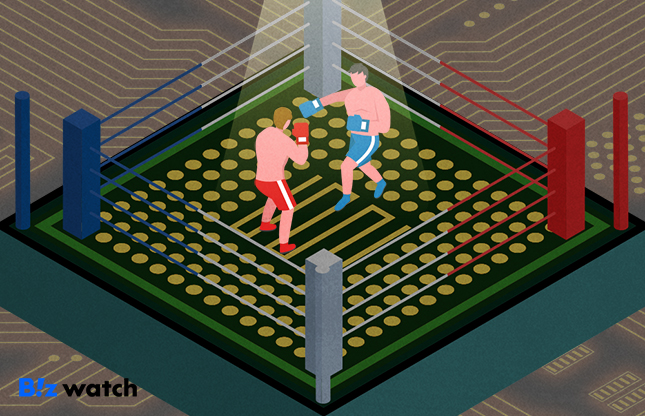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재 중 하나가 '웨이퍼'다. 반도체 생산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고품질 여부가 중요하다. 그간 웨이퍼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주름 잡아왔고 반백년에 걸쳐 비슷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며 이들을 위협하고 있는 국내 유일무이 기업이 SK실트론이다. SK실트론은 삼성전자 등 탄탄한 고객사 기반에 SK그룹의 든든한 지원까지 등에 업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웨이퍼?
미디어에서 소개 되는 반도체 관련 영상을 보면 얇은 둥근 판 형태의 무언가가 가장 흔하게 눈에 띈다. 이것이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웨이퍼다.
웨이퍼는 실리콘, 탄화규소, 질화갈륨 등으로 만든다. 이 소재를 고온으로 녹여 둥근 원통형으로 만든다. 이를 얇게 '판' 형태로 자른 후 이 표면을 매끈하게 가공한다. 끝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면 반도체를 그리는 도화지 역할을 하는 웨이퍼가 완성된다.
이후 반도체 공정에 웨이퍼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면 이 웨이퍼 위에 수십, 수만개의 반도체 칩 회로가 새겨지게 된다. 이후 이를 자르면 우리가 아는 칩 형태의 '반도체'가 완성된다.
반도체 생산의 기초가 되는 만큼 얼마나 '고품질'이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 평가 기준이 된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 웨이퍼에는 눈으로 볼 수 도 없는 나노미터(nm)단위의 회로가 새겨진다. 이 과정에서 먼지보다도 작은 결점이 있다면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순수무결한 웨이퍼'가 있어야 고품질의 반도체가 생산되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동일한 특성'을 지니느냐다. 생산되는 웨이퍼들이 티끌만큼의 오차 없이 같은 규격을 유지해야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생산됐을 때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웨이퍼 품질에 따라 최종 생산되는 반도체의 수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웨이퍼는 반도체 소재 중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웨이퍼 50년 강자 일본
글로벌 시장에서 웨이퍼 '강자'는 일본이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신에츠화학과 섬코가 각각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 30%와 25%를 차지하면서 전세계 물량의 50%를 책임지고 있다. 대만의 글로벌웨이퍼스와 독일의 실트로닉이 뒤를 이어 30% 가량의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세계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 일본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반도체 분야와 달리 웨이퍼 생산 기술을 꾸준히 갈고 닦아오면서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했던 국가는 일본이다. 도시바, NEC, 히타치, 후지쓰 등 기업들을 필두로 D램 시장, 반도체 소재·장비·부품 등 모든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멀찍이 앞서갔다.
1980년대엔 일본 기업들의 D램 점유율이 80%를 넘어섰을 정도다. 1985년 인텔이 일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D램 사업에서 철수했고 1986년 미국과 일본 간 반도체 협정을 체결한 것은 당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과 일본 간의 반도체 협정 이후 삼성전자 등이 반도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는 '과거의 영광'이 됐지만 여전히 웨이퍼 분야에서만큼은 경쟁력이 가장 우수하다.
이는 당시 반도체의 기본이자 핵심인 웨이퍼의 중요성을 깨닫고 꾸준히 투자는 이어온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추면서 공급망 내에서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고 기초 소재 공급의 안정성까지 확보한 것이다.
SK실트론, 일본 아성 넘을 수 있을까
국내에서 웨이퍼를 생산하는 곳은 SK실트론이 유일하다. SK그룹이 SK하이닉스를 인수 한 이후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의 수직화 구조를 갖추기 위해 1980년대부터 웨이퍼를 생산하던 '실트론'을 2017년 인수했다.
SK실트론이 전체 반도체 웨이퍼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0% 가량으로 일본 기업 등에 비해서는 시장 장악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SK실트론의 시장 점유율이 근 시일내에 급격하게 반등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300mm 실리콘 웨이퍼 시장만 두고 봤을 때 SK실트론의 점유율은 일본의 신에츠화학, 섬코에 이어 글로벌 3위다. 반도체 표준 공정에 사용되는 웨이퍼로 시선을 더욱 좁히면 대만의 글로벌웨이퍼스와 독일의 실트로닉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전세계 반도체 시장의 강자들과 손잡으면서 기술력과 공급능력에 대한 검증을 지속해온 것이 300mm 웨이퍼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며 "대선 이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 더욱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SK실트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고객사를 확보한 데다 SK그룹 차원에서 반도체 분야가 핵심 먹거리로 자리잡아 지속적인 투자 등이 가능해 글로벌 경쟁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이미 실리콘 웨이퍼가 워낙 오랜 기간 산업 소재로 사용되면서 기술이 매우 고도화해 더이상 발전할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리콘 웨이퍼 시장으로 한정 하면 3위 이상 치고 나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전기차 등에 주로 사용되는 SIC웨이퍼 등 최근 주목받는 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는 갓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