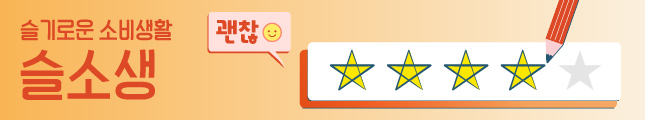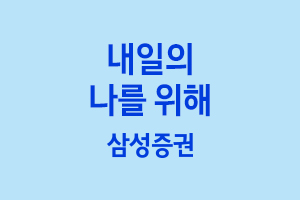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제품이 쏟아지는 소비의 시대. 뭐부터 만나볼지 고민되시죠. [슬기로운 소비생활]이 신제품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제품들을 직접 만나보고 가감없는 평가로 소비생활 가이드를 자처합니다. 아직 제품을 만나보기 전이시라면 [슬소생] '추천'을 참고 삼아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세요.[편집자]
*본 리뷰는 기자가 제품을 대상으로부터 제공받아 시식한 후 작성했습니다. 기자의 취향에 따른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두 유 노 김치?
요즘에는 불닭볶음면도 있고 닭갈비도 있고 삼계탕도 있고 심지어 만두에 떡볶이까지 핫한 'K푸드'가 돼 있지만,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한국 하면 생각하는 음식은 딱 두 개였다. 바로 불고기와 김치다. "Do you know kimchi?"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 스타에게 묻는 필수 질문 중 하나였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외국의 유명한 음식을 소개할 때 '○○○의 김치'라고 소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사워크라우트는 독일식 김치, 코울슬로는 미국식 김치, 쏨땀은 태국의 김치라는 식이다. 그만큼 김치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보는 외국인에게도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었다.

'김치 냄새'는 약소국인 대한민국의 설움을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의 스타 박찬호는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김치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는 동료들 때문에 성공할 때까지 김치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치즈를 입에 욱여넣었다. 그들의 치즈 냄새나 김치 냄새나 고약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강대국과 변방 약소국의 차이는 냄새에서도 서열을 만들었다.
하지만 K푸드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우리는 더이상 김치에 집착하지 않게 됐다. 김치 냄새가 차별의 함의를 담는 일도 줄어들었다. 역설적이게도 김치를 놓아주자 김치가 '글로벌 푸드'로 떠올랐다. 서양인들이 김치를 담그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맛있다며 칭찬하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올린다.
"한국인들은 김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김치만 넣는 냉장고가 있다던데 사실이야?"
"모든 한국인들의 집에 김치냉장고가 있는 건 아니야. 우리 집에는 있지만."
"내가 이걸 물어본 한국인이 10명째인데, 모두 너와 똑같이 대답했어."
(정보 : 한국의 김치냉장고 보급률은 90%에 달한다.)
예전같았으면 외국인에게 조롱의 대상이 됐을 김치냉장고는 이제 하나의 밈이 됐다.
미쉐린 3스타의 김치
K푸드가 서양 문화권에서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김치를 먹는 외국인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게 됐다. 관세청 수출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김치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억6360만달러를 기록했다. 우리가 김치를 수출하는 나라는 95개국에 달한다. 알 만한 나라엔 대부분 우리 김치가 팔리고 있다는 의미다.

김치 수출의 최전선에는 대상의 김치 브랜드 '종가'가 있다. 종가의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939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7.4%에 달한다. 수출국도 80개국이 넘는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당연하고 코트디부아르, 케냐 등 아프리카나 칠레, 페루 등 남미까지 종가의 손이 뻗어 있다. 2022년엔 미국 LA에 김치 공장을 세웠고 폴란드에도 김치 공장을 만들고 있다.
이런 종가가 이번에는 미쉐린 3스타 셰프 코리 리와 손잡았다. 코리 리가 운영하는 미쉐린 1스타 한식당 '산호원'의 이름을 딴 김치를 출시했다. 코리 리는 산호원과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 '베누'를 운영하는 스타 셰프다. 지난해 흑백요리사로 블루칩이 된 안성재 셰프도 코리 리의 눈에 띄어 프렌치 다이닝의 길을 걷게 됐다. 자타공인 '스타 셰프'다.
엄마 김치VS미쉐린 3스타 김치
영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고유의 레시피로 만드는 잼이 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도 토마토 수확철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1년간 먹을 토마토 소스를 만든다. 한국에선 단연 김치다. 지역마다 레시피가 다른 것은 물론 집마다도 맛이 다르다. '우리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이유다. 그래도 스타 셰프의 김치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미쉐린 3스타 셰프의 비법이 담긴 산호원 김치 2종을 맛봤다.
산호원 김치는 오리지널 김치와 백김치 2종으로 출시됐다. 국내에서 제조하지만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 '미국향 김치'다. 오리지널 김치는 청각과 야채 육수를 넣어 자연스러운 감칠맛을 끌어올렸다. 백김치는 저발효 공정을 통해 천천히 숙성해 시원한 국물 맛과 재료의 아삭함을 오래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가장 눈에 띈 건 색이다. 한국에서 주로 먹는 배추김치보다 연한 붉은색으로, 고춧가루의 양이 적다는 걸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익은 정도는 갓 담근 김장김치에 가깝다. 실제로 산호원 김치는 주문 직후 만든다. 배추의 식감도 아삭한 겉절이에 가깝다. 서양에서는 김치를 '배추 샐러드'로 부르곤 하는데 실제로 '샐러드'에 가까운 느낌이다.
국물이 자작한 백김치는 맑은 국물의 동치미라기보다는 고춧가루가 들어 있어 살짝 칼칼한 나박김치에 가까운 맛이다. 다만 수저로 떠서 국물을 마시거나 면에 말아먹어도 되는 정도의 염도인 한국 김치에 비해 더 짠 편이다. 이 점은 배추도 마찬가지로, 한국 김치보다 배추 자체의 염도가 높다. 더 높은 염도에서 절였다는 느낌이다.

실제로 산호원 김치의 나트륨 함량은 1온스(28g)당 170~230㎎으로 종가 포기김치(100g당 600㎎)보다 12~37% 높다. 여기에 배추의 산뜻한 맛을 내기 위해 젓갈이 덜 들어가 염도가 더 높게 느껴진다. 반면 단맛은 거의 없다. 한국 김치가 젓갈과 과일, 채소류로 복합적인 맛을 낸다면 산호원 김치는 '절인 배추'의 맛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미국인의 취향에 맞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한국식 김치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짜고 덜 익은 김치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다. 절인 배추를 김칫국물에 적셔 바로 먹는 느낌이랄까. 맛있다는 말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애초에 이 제품은 미국인이 타깃인 제품이다. 인도 커리가 일본을 거쳐 한국에서 오뚜기 카레가 된 것처럼 종갓집 김치도 '종가'로 거듭나고 미국인의 입맛에 맞는 '샐러드 김치'가 될 수도 있다. 맛과 형태가 좀 다르면 어떤가. 그 안에는 '우리 엄마 김치'와 같은 정체성이 담겨 있다. 그거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