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랬듯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이번에도 '하이 리스크(Hige Risk, 고위험)'를 택했다. 그리고 사고가 터졌다. 지난 4일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내식 대란의 배경으로 그가 꺼낸 평창 올림픽 얘기를 보면, 박 회장의 '감행' 성향은 이번 사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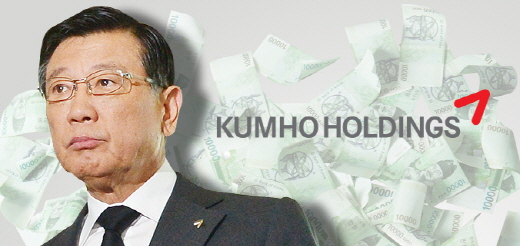
그는 사과 와중에도 "만약 잘 해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겨울 평창올림픽 케이터링(급식) 성공 사례를 꺼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이 자신과 식사를 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걱정한 현장 케이터링을 아시아나 출신 팀장이 이끌어 큰 탈 없이 치렀다"며 칭찬하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해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박 회장이 내놓은 변명이다. 국내 케이터링 업체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일을 해내는 것을 보고 이번 기내식 업체 교체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단다. 사고가 터진 뒤 '예견된 기내식 사태'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박 회장만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뿐인가. 박 회장에게 이런 고위험 선택은 어색한 일이 아니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과 관련한 굵직한 사안에서 그는 '무리 아니겠냐'는 세간의 우려를 뒤집는 결정을 감행한 전력이 한두 번 아니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지분 72%, 6조4255억원), 이어 2008년 대한통운 인수(지분 60%, 4조1040억원)부터 그랬다. 자금력을 과시하는 듯한 인수합병으로 당시 금호아시아나는 재계 8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고 금호아시아나는 두 기업을 헐값에 토해낸 것은 물론 그룹 해체 수순까지 갔다.

| ▲ 지난 7월4일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사옥에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인수에 돈을 태웠던 금호산업, 금호타이어는 채권단 재무구조개선절차(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사라는 특징(워크아웃 시 영업차질과 항공기 리스 자금조달 장애) 덕분에 '자율협약'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채권단 관리를 받는 신세가 됐다.
무리라며 인수를 말렸던 박 회장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아예 등을 돌렸다. 배임 혐의로 형을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형제는 등졌고 그룹도 둘로 쪼개졌다.
박 회장은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될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금융위기가 올 줄 알았겠냐"고 했다. 하지만 박 회장이 내세운 인수금융 방식은 애초부터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았다. 금세 '승자의 저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적지 않았다.
박 회장의 고위험 경영 뒤에는 아시아나항공이나 금호타이어 등 당시만 해도 견실했던 기업이 볼모로 잡혀있었다. 박 회장이 워크아웃에서 빠져나온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도, 금호타이어 재인수를 시도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 때 금호기업이란 개인기업을 세워 금호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박 회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아시아나항공이 이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있던 금호터미널을 2700억원에 금호기업으로 넘겼는데 이 가격이 너무 낮았다는 것이다. 이 때도 아시아나항공 2대주 주인 박찬구 회장 측 금호석유화학 측 반발을 샀다.
지금은 중국 더블스타로 넘어갔지만 금호타이어 재인수 시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 교체하려던 기내식 업체는 금호아시아나 지배구조의 핵심인 금호홀딩스에 '무이자 30년 만기' 조건으로 1600억원을 투자한 중국하이난항공그룹과의 합자사였다. 박 회장은 금호홀딩스 투자와 기내식 합작이 '별개 사안'이라고 강변하지만 아시아나 기내식 사업권을 내주고 금호타이어 인수자금을 유치했다는 시각을 지우기 어렵다.
회사 위기 와중에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경영진을 규탄하며 거리로까지 나선 것은 이런 배경때문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승객들에게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먹은 게 억울해서가 아니다. 자신이,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가 그룹 총수의 경영권을 위해, 이를 위해 끌어모은 빚 갚기에 동원돼 피폐해지고 있다는 걸 견디기 어려워서다.

| ▲ 지난 7월6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이 경영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사실 항공산업의 본질은 박 회장 스타일의 '고위험 경영'과 거리가 멀다. 하늘길로 수백 명을 싣고 국경을 넘나드는 항공사가 위험을 감행하는 상황이 잦다면 승객 안전은 물론 국가안보도 보장하기 어렵다. 올 초 국토교통부가 항공사 면허에 재무안정성 기준을 강화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항공사는 안전과 안정이 우선인 탓에 승무원 등 직원들이 노동자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제한을 받는다.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서다.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은 남기게끔 돼있다. 모든 게 '위험'이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룹 뒷바라지 때문에 갚아야할 빚에 쪼들리는 항공사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위험 감행에 익숙한 총수, 이런 불안한 조합을 그대로 둬도 괜찮을지 정말 의문이다. 박 회장이 지금은 "모든 일은 내 책임"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나중엔 정말 누구도 책임 못질 사태가 벌어질까 두렵다.
이번 기내식 대란이 더 큰 비극을 예고한 경고음이었다는 말이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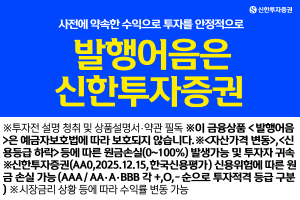






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