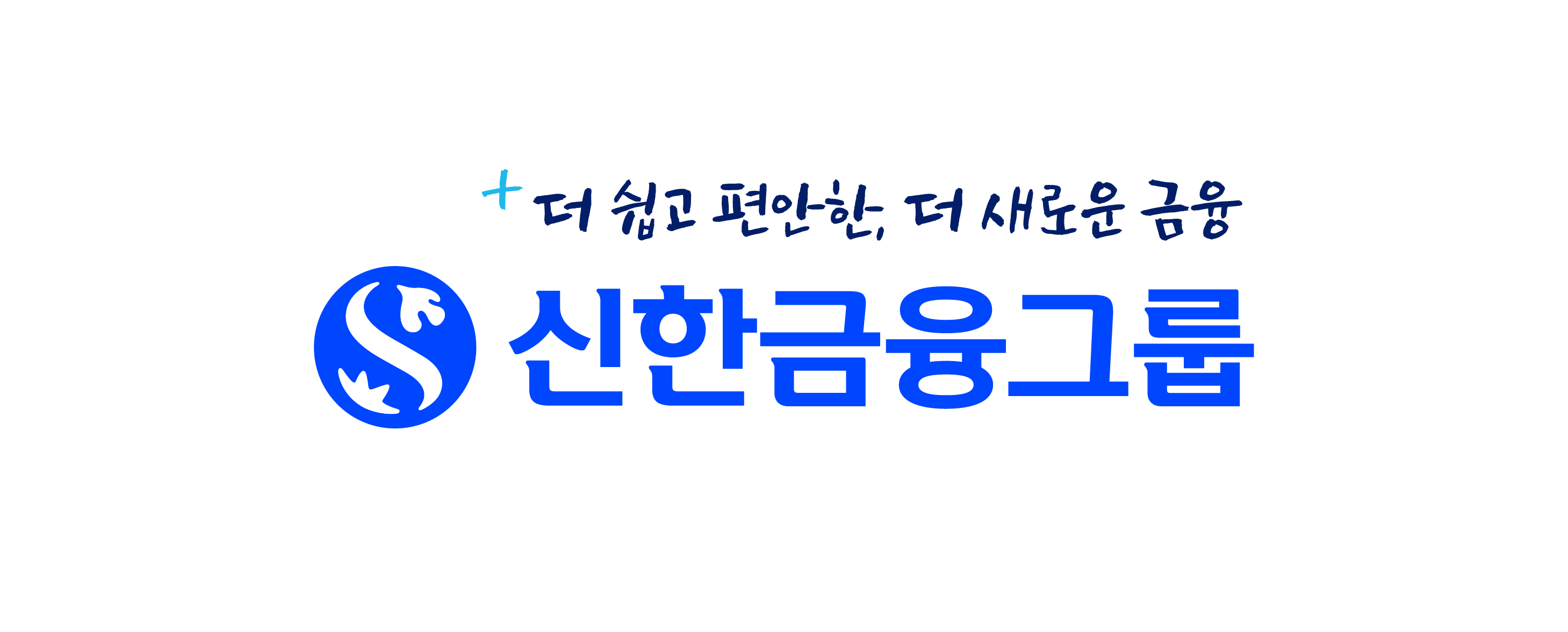구글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 허락을 받지 않고 위치 정보를 몰래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드로이드폰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4분의 3 가량이 사용할 정도로 많이 쓰고 있다. 구글은 3년 전에도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22일 미국 온라인매체 쿼츠(QUARTZ)는 구글이 올해 초부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구글 서버로 자동 전송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사용자가 위치 서비스를 끄고 관련 앱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정보가 전송됐으며 이동통신사의 가입자식별모듈(SIM) 카드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글측은 안드로이드폰의 메시지 수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위치정보를 사용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1월 메시지 수신 속도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신호로 Cell ID(기지국) 코드를 사용하는 옵션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ell ID 코드란 스마트폰과 통신하는 기지국 정보를 말한다. 이를 이용하면 휴대폰 이용자가 속한 기지국 정보를 통해 이용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휴대폰이 교신한 기지국 정보로 이용자 위치를 추적하는 것이다. 경찰이 구조신청 등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발신자를 찾을 때 이 방법을 사용한다.
구글은 이 기지국 정보를 모아 본사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지국 정보는 하나로는 정확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다수의 기지국 정보를 모은다면 더욱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고 쿼츠는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은 수집된 정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모아진 Cell ID는 구글 네트워크 동기화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았다"라며 "해당 데이터는 도착하는 즉시 매번 폐기되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스템 업데이트를 통해 더 이상 Cell ID를 요청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쿼츠는 위치정보와 메시지 기능 개선이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구글의 해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글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보면 위치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이렇게 모아놓은 정보가 미국 정보기관에 넘어가거나 타깃형 광고 마케팅에 활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문제는 구글이 지난 2014년에도 국내에서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만들면서 무선인터넷(와이파이)망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것이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구글 본사에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관련 행정처분을 이행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가 직접 미국 본사를 찾아가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 60만여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 안드로이드 이용자 비중이 높은 만큼 위치정보 무단수집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인터넷진흥원이 올해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폰 점유율은 74%에 달해 애플의 iOS(25.6%)보다 3배에 달한다.